'PUBG: 배틀그라운드', 단일 게임 넘어 문화 콘텐츠로 진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크래프톤이 'PUBG(펍지):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한국 게임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단일 게임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팬덤과 콘텐츠 생태계를 아우르는 IP로 진화한 '배틀그라운드'는 한국 게임 산업이 대형 프랜차이즈 IP를 바탕으로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17년 출시 이후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 13억 다운로드, 누적 매출 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인기 게임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사용자와 문화를 연결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크래프톤은 올해 1분기 매출 8,742억 원(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영업이익 4,573억 원(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이라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며, '배틀그라운드'의 IP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인도 시장에 맞춰 개발된 'BGMI(Battlegrounds Mobile India)'는 누적 다운로드 2억 건을 넘고, e스포츠 결승전 시청자 수가 2,4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지역 밀착형 글로벌 전략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크래프톤은 인도 내 개발사 인수, 맞춤형 마케팅, 스포츠 IP 확장 등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이 단순 오락을 넘어 세계적 커뮤니티와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된 지금, 게임 산업은 국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국내 정책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조기 대선을 앞둔 현재, 주요 후보들은 게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AI, 반도체 등 여타 산업에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 산업에 대해 전략 산업으로서의 시각보다 규제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WHO의 '게임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이후 보건복지부가 이를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반영하려 한 움직임이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게임의 문화적·산업적 가치에 대한 공론화 없이 규제 일변도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임은 이미 한국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 산업이다. 문화예술법상 '문화예술의 한 갈래'로 인정받으며 창작 자산으로서의 위상도 갖췄다. 크래프톤은 e스포츠 리그 운영, 글로벌 IP 협업, 아트워크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서의 실험도 지속하고 있다.
크래프톤이 구축 중인 'PUBG 유니버스'는 그 대표적 사례다. 배틀로얄을 넘어 콘솔 전용 '프로젝트 발러', 전술 슈팅 '블라인드스팟', 익스트랙션 슈터 '블랙버짓' 등 장르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유저층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 웹툰, 숏필름, 뮤직비디오 등 미디어 믹스 확장도 활발하다. 이는 게임이 단일 작품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 '오버워치'가 북미에서 브랜드와 문화가 된 것처럼, '배틀그라운드'도 K-게임의 글로벌 대표작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공이 개별 기업의 역량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게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게임 산업이야말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다. 이제 '게임은 문화다'라는 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사회 인식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할 때다.
dconnect@newsp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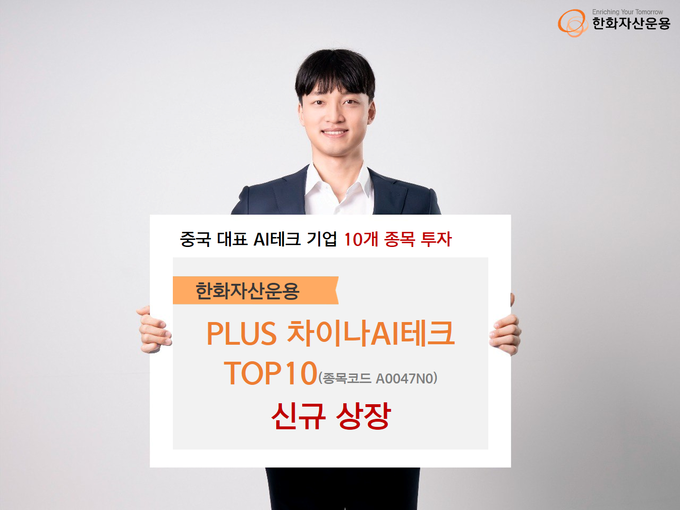

![게임과 가상화폐의 조합은 왜 실패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346_148091_5320.jpg)


![미중 무역협상 '상당한 진전'…글로벌 기술전쟁에 韓 반도체소부장株 몸값 '쑥'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QDGOX_1.jpg)

!["中 벗어나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개발 '맞손'…“약값 59% 인하” 트럼프에 신약은 ‘부담’ 시밀러는 ‘기회’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5F7NR8_1.jpg)
![로킷헬스케어 코스닥 상장…달바글로벌 청약 진행 [이번주 증시 캘린더]](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818FY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