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찾아간 도쿄대 이학부 3호관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학 캠퍼스 건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건물 3층에는 도쿄대와 소프크뱅크가 2019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욘드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전환(DX)에서 뒤졌던 일본의 AI 전환(AX)을 꿈꾸는 괴물 두뇌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도쿄에서 만난 AI 스타트업 파인디의 야마다 유이치로 대표는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과 일본 정부가 함께 일본의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최근 글로벌 AI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배후에 있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규제 완화 덕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창업 1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한 사카나AI다. 이 기업은 구글의 일본연구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두 명이 창업했지만 일본의 소버린(국가 주권) AI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초기 구축에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 현지에서 만난 스타트업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만으로 AI 킬러 기업을 키워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1호 구매자(buyer)’로 나서야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AI 전담 부처인 디지털청이 재원을 투입해 기업들에 일감을 공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기업들이 생존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구조가 이미 조성돼 있다. 과거 김대중(DJ) 정부 시절 우리나라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육성했던 전략을 일본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AI 활용 채용 관리 시스템 스타트업 헤르프(HERP)의 쇼다 이치로 대표는 “디지털청이 우리 프로그램을 먼저 구입해 사용하면서 다른 부처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의 협업은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카나AI 역시 초창기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AI 정부 전환에 있어 아직 속도가 더딘 편이다. 디지털청과 같은 통합적 주무 부처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민간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도입해 사용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국내의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는 말로만 AI 육성을 말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다”면서 “AI 스타트업은 판로가 없고,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는 경우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AI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선구매자로서 책임 있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정부의 본질은 단지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술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AI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제한’ 지원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AX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두뇌라면 반도체는 팔다리에 해당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반드시 경쟁력을 되찾아온다는 게 일본 정부의 각오다.
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런 사례다. 라피더스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세운 기업이다. 이 기업들이 댄 출자액은 73억 엔 정도인데 막상 일본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9200억 엔(약 9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라피더스를 겨냥한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 별도의 기구를 통해 라피더스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게 핵심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라피더스가 IBM과 손잡고 2㎚(나노미터·1㎚은 10억분의 1m)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업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정부가 10조 엔, 20조 엔을 계속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한국이나 대만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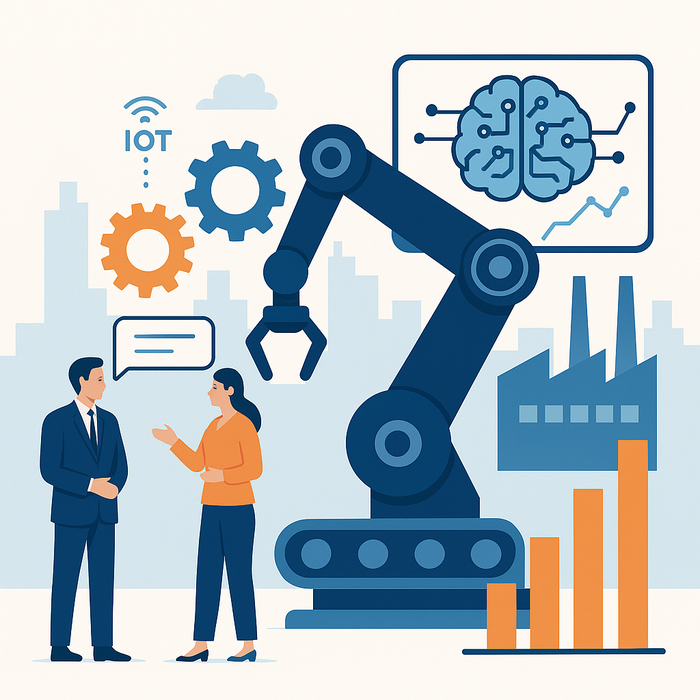
![英, 첫 성장구역 지정…"AI 도입효과 865조원"[다시, KOREA 미러클]](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ZGB25W_2.jpg)




![[에듀플러스]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 “한국 경제·산업 발전하려면, 교육 혁신 선행돼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2/news-p.v1.20250502.ff6786ba54e74e33ae10cb17e1793b21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