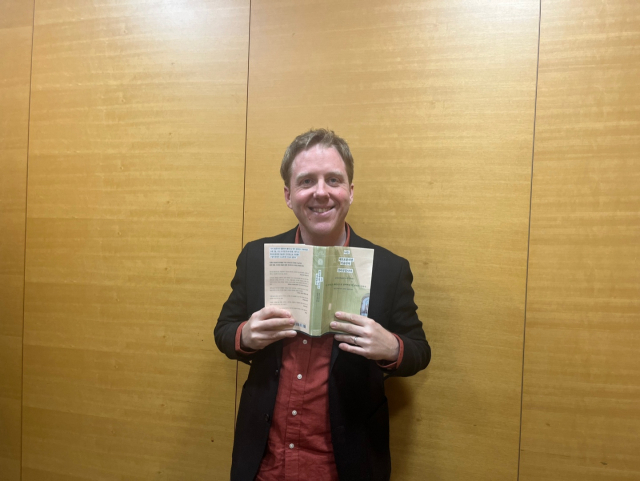역경과 시련은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만, 역설적으로 예술은 힘든 삶을 견디며 내적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혼란과 분열로 시국이 어수선한 이즈음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미술가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과 사회에 저항하고, 모순을 표현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 속에 탄생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화가 이중섭(1916~1956)을 다시 소환하고 싶은 이유이다. 근대의 많은 작가가 고난의 시기를 살다 갔지만 이중섭만큼 우리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작가도 드물다.
이별·생활고의 유일한 탈출구
한민족 상징 ‘소’ 연작에 투영
숨겨진 역작 ‘소와 새와 게’
황폐한 정신 냉소 코드로 표출

식민지 조선, 한국전쟁과 분단, 이산(離散)과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는 온몸으로 자신의 삶과 시대정신을 증언했다. 대향(아호)은 어머니를 북에 두고 피난 내려와서 생활고로 인하여 아내(야마모토 마사코)와 자식을 친정이 있는 일본으로 보내고, 동료 예술인들 거처를 전전하게 된다. 은지화·엽서화·편지화는 물론이고 합판에 그린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유화도 ‘휴대하기 편한 종이’ 위에 안료로 그려진 그림들이다. 기구했던 삶 자체가 예술이었다. 그에게 예술은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유일한 안식처였다.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중섭의 예술적 역량과 시대정신은 ‘소’ 시리즈에서 무엇보다 강렬하게 발휘된다. 어렸을 적부터 소도둑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중섭은 소에 대한 집착과 탐구심이 유독 강했다. 그의 예술에서 소는 한민족의 상징이자 자아 정체성이 반영된 분신(分身)과도 같다. ‘싸우는 소’, ‘울부짖는 소’, ‘고꾸라지는 소’, ‘성난 황소’ 등은 작가 내면의 투영이자 동족상쟁의 비극, 이산의 설움, 그리고 부조리한 삶에 대한 절규와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소 그림이야말로 시대적 저항과 울분, 내면의 심리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겠다.
‘소와 새와 게’를 이번 기회에 소개하는 것은 ‘핵심을 포착하는 역량(骨法用筆)’과 심리묘사가 탁월한 ‘숨겨진 역작’이기 때문이다. 강렬한 채색과 붓질의 소 그림들과 비교해 보면, 장판지 같은 바탕색에 드로잉 기법으로 제작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이다. 1952년 부인과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낸 이후 부산에서 통영·마산·서울·대구 등을 오가며 방랑자 같은 삶을 살던 시절에 제작(1952~54년 추정)되었다. 1955년 중반 이후 신경쇠약, 극심한 불안과 우울, 거식증 등 정신질환으로 지인들의 도움을 받다가 1956년 9월, 40세의 나이에 결국 간질환으로 외롭게(무연고자) 사망했다.
당시 궁핍하고 황폐한 이중섭의 정신 상태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저앉은 황소의 눈은 공허하며, 이빨은 듬성듬성하고 털 빠진 몰골은 앙상하기만 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소의 앞과 뒤로 새와 게의 배치는 절묘하다. 도상학에서 새는 전통적으로 꿈, 비상, 해방과 자유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황소 뿔 위에 당당하게 올라선 새는 날개를 펴고 위풍당당한 반면에 황소의 표정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망함이 가득하다. 뒤편에 있는 게는 황소의 유일한 자존감이자 남성성의 상징인 불알을 날카로운 집게발로 위협하고 있다. 꿈과 희망도 잃고 노쇠한 탓에 새와 게의 조롱에 더 이상 반응하거나 저항할 기력도 없어 보인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절체절명의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은 황소의 꼬리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회오리치는 모양에서 잘 드러난다. ‘회오리친다’는 표현은 통상 감정이나 생각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태 혹은 거대한 자연의 힘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비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주저앉은 소와 새와 게, 회오리치는 꼬리는 ‘무의식의 상징체계(라캉)’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위기와 불안의 심리를 다루면서도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묘사가 아이러니하다. 좌절된 가족과의 재회, 삶의 비애와 고독, 허망함이 이러한 코드 안에 녹아 있는 것이다.
‘예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내겐 오랜 화두였다. 인류세(人類世) 대신 자본세(資本世)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대 미술은 점차 자본시장에 잠식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는 미술시장이 번성하고 확장하지만, 영혼을 움직이는 예술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이중섭은 식민 지배, 전쟁과 분단이라는 다분히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시대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의 예술적 태도는 인간의 고통과 회복력을 증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준 전 리움미술관 부관장·미술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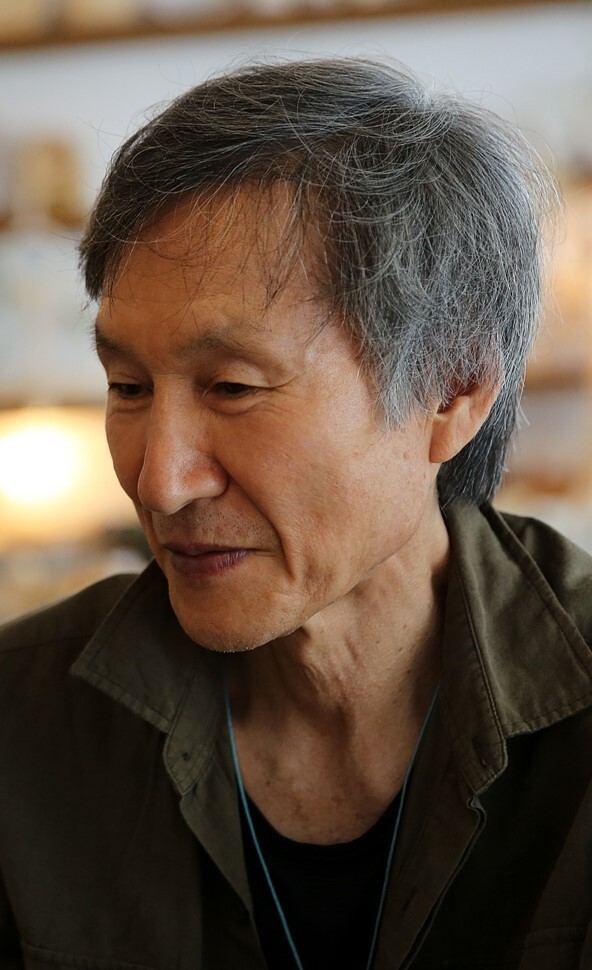
!['퇴마록',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필요한 이유 [D:영화 뷰]](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99720_1459595_m_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