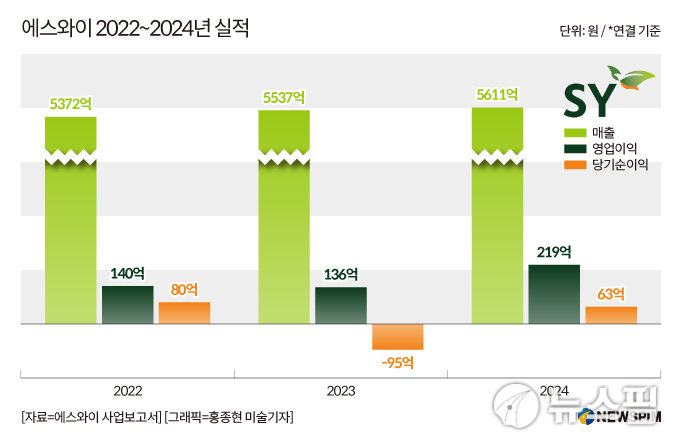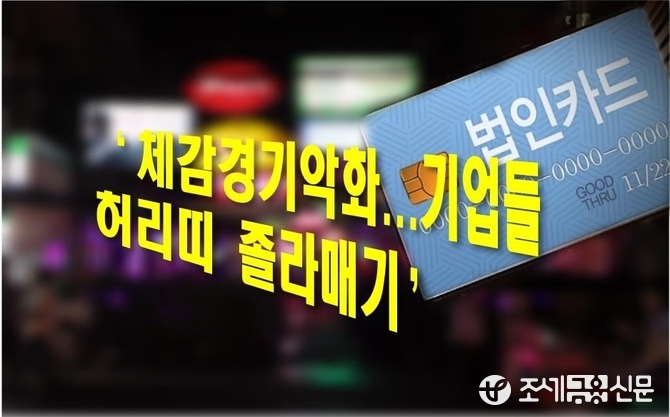신동빈 회장이 직접 이끄는 롯데그룹의 인도네시아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부터 석유화학까지 입체적으로 진출하며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외형은 크게 불었지만, 수익성과 시장 내 실질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따라붙는다.
21일 산업 경제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한국경제인협회가 파견하는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 단장으로 현지를 찾는다.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등 주요 그룹 CEO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롯데가 선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신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동남아 전략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롯데의 현지 사업은 유통에서 시작됐다. 2008년, 대형 도매체인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하며 진출한 롯데쇼핑은 현재까지 50개 롯데마트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 해외 할인점 부문 매출은 약 1조 3,480억 원. 이 중 인도네시아는 약 2억3000만 달러(3100억 원) 규모로, 동남아 전체에서 약 73%를 차지한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시장 침투력은 낮다. 미국 농무부(USDA) 해외 농업서비스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료품 소매시장 규모는 1032억 달러에 이르지만, 롯데마트 점유율은 0.22%에 불과하다. 매장을 늘렸지만 소비자 접점이나 브랜드 충성도 확보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2024년 전체 해외 할인점 부문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 수익성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더욱 거대한 투자가 진행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찔레곤(Cilegon)에 총 5조5000억 원(39억 달러)을 투입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른바 'LC타이탄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단지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추고, 동남아 생산기지의 핵심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역시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4년까지는 상업 생산이 시작되지 않아 매출은 '제로'에 가깝고, 국제 유가 변동성과 전방 산업 침체로 석유화학 시장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전환 지연도 구조적 약점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 7000만 명 인구와 세계 4위 수준의 모바일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디지털 커머스 격전지'로 평가된다. 현지 플랫폼인 토코피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부깔라팍(Bukalapak)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가운데, 롯데는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룹 전반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동남아 시장에서도 똑같은 약점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롯데는 인도네시아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그룹의 동남아 복합 거점으로 키우려는 구상을 이어가고 있다. 유통·물류·화학을 연결한 수직 계열화 모델을 현지에 이식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경제사절단 활동도 단기 성과보다는 정부 관계자와의 정책 협력, 공급망 조율 등 장기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은 동남아를 '제2 성장축'으로 직접 챙기고 있다"며 "확장보다 체질, 외형보다 실속이라는 본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