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륨(Ga)은 30℃에서 액체금속의 상태이다. 알루미늄(Al)과 같은 금속을 만나면 녹이면서 침투해 마법과 같이 신비한 현상을 선보이는 물질이다. 이러한 Ga 원자가 질소(N) 원자와 결합해 형성되는 질화갈륨(GaN)은 화합물반도체로서 인류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과 함께 주목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GaN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직접천이형이며 큰 밴드갭이라는 물리적 특징을 지닌다. 보다 높은 고전압과 고온의 동작에서 성능이 우수하고 전기를 광(빛)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높아 이젠 삼색광(적, 초록, 청)을 온전히 동작하는 발광다이오드(LED)와 레이저소자(LD)를 제조하는 데 널리, 유일하다 할 정도로 사용된다. 즉, GaN은 광 응용에 LED 디스플레이 및 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제어, 고주파(RF) 통신, 레이더와 같은 응용에 있어서도 타 반도체에 월등한 성능으로 대체불가인 핵심 반도체로 부상했다.
GaN 반도체의 위상에 대한 배경의 사례로 2023년 8월 이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생산량 94% 차지) 정부는 Ga 소재의 수출통제에 들어갔고 그 후 미국 수출금지를 공식 발표했다. 현재로서 GaN 반도체를 이용하는 LED 조명 및 디스플레이, 고효율 전력소자, 라이다(LiDAR), 레이더(군방 및 민간)의 제조와 공급체인에 미국조차 경고 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시장조사 기관(P&S Intelligence, Precedence Research) 발표에 따르면, 2030년 세계반도체 시장규모는 “미화 9290억 달러 (연평균성장률(CAGR)=7.54%)이고, 그 중 GaN 반도체가 미화 728억 달러(CAGR=18.2%)으로 전반도체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기술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실리콘 반도체를 이어서 두 번째 반도체 자리를 GaN가 차지하는 것은 확고하다.
과거 1997년도에 GaN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시작되던 시기에 삼색광(적, 초록, 청) 가운데 2종(초록, 청)이 가능해 GaN이 가시광 제품 산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예상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28여년이 흐른 지금은 R(적)까지 구현되고 있으니 가시광의 99%를 차지할 날도 올 수도 있겠다 싶다. 과학기술이란 실로 장시간에 걸쳐 꾸준하고 무한하게 진화한다는 평소의 소신이 새삼 확인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GaN은 고효율, 고전압, 고주파, 고온 성능이 탁월해 전력 및 RF 소자로 응용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력 소자는 수 십 V에서 1.2 킬로볼트(㎸)대까지 제품이 실현됐고 RF 소자는 X-band에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의 핵심 부품으로 이용됨은 물론 서브(Sub)-기가헤르쯔(㎓)에서 100㎓까지 광대역으로 파급되고 있다. 아직은 결정결함이나 미지의 트랩 등으로 인한 저주파 잡음, 누설전류, 절연파괴와 같은 현상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와 결부해 신뢰성이 다소 미진한 점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직도 GaN 반도체는 완벽함을 향한 연구개발 투자를 더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GaN 광(LED)업체 순위는 니치아, 서울반도체, 오스람으로 국내업체의 의미 있는 분투로 일정 지분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다 싶다. 하지만 파워(Power)와 RF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 GaN Power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독일, 대만의 EPC, 도시바(트랜스폼), 인피니언(GaN 시스템, 나비타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icron), 티에스엠씨(TSMC)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중국의 이노사이언스 또한 상당한 수준의 제품화에 진입하고 있다.
GaN RF의 경우 역시 상기와 마찬가지로 울프스피드(크리), 텔레다인, 마콤, 엔엑스피, 코르보, 미쓰비시, 유엠에스, 윈세미와 같은 강자들이 점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GaN Power 및 RF 분야에 삼성전자, DB하이텍, 시지트로닉스, 웨이비스 등이 개발에 이은 양산화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핵심소재인 GaN 에피웨이퍼를 엘앤디전자, 웨이브로드, 에이프로 등의 벤처기업과 한국나노기술원(KANC),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다.
GaN 반도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우주-국방의 핵심부품이 됐음에도 불구, 유감스럽게도 Power와 RF 분야의 국내 사업화 수준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첫째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국가의 R&D 전략과 예산의 배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상당한 연구비를 투자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일부 기관이나 기업에 한정되고 크지 않은 재원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신기술의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인식 능력, 즉 전문가 영역만이 가질 수 있는 영감의 부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Power와 RF 산업의 뿌리를 확고히 하는데 얼마 정도의 금액이 투자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6인치 이상의 팹(FAB)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염두에 둔다면 파운드리 및 소규모 생산까지 포함해 1조원 정도는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국가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지원책중의 하나로 인력양성을 위해 수 백 억원대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프로그램을 다수 대학에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 산업의 25%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위상과 경제산업적 지분과 세계적 기술경쟁이 유도할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도 심하게 부족하다.
특히 실리콘에 이어 GaN 반도체는 핵심 미래산업이며 K-국방 산업까지 파급효과가 막대한데 비해 국가적 관심이 너무 적었다. 더 늦기 전에 전문 IDM, 파운드리, 팹리스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덕호 시지트로닉스 전무·연구소장 dhcho@sigetronics.com
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Tech 스토리] 생성형 AI가 바꾼 인프라 전쟁…AIDC가 주목받는 이유](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723040600.jpg)
![[ET시론]데이터의 힘: 바이오 빅데이터, 혁신을 이끄는 새 원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9/news-p.v1.20250519.8d267147cd5741c083b0c3015f5cd954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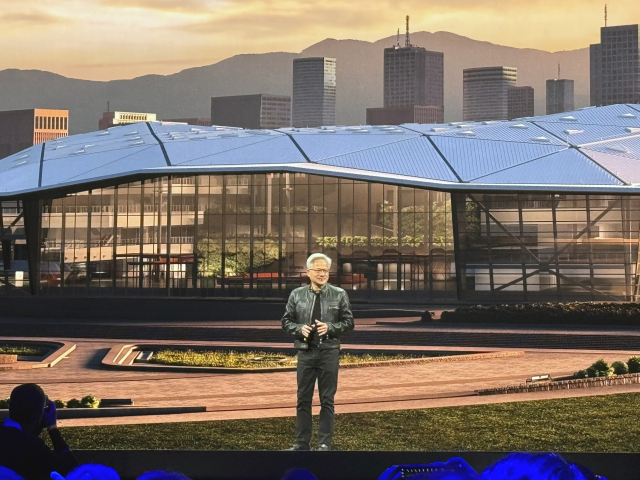
!['생체현미경' 토모큐브, 美FDA 동물실험 폐지 수혜주로 기대감 '쑥' [Why 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FCEPXE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