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낸 10쪽 분량 보도자료에는 ‘인공지능(AI)’이란 단어가 16번 등장한다. ‘경제’ 15번, ‘혁신’ 14번, ‘산업’ 11번. 빈출 단어만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의 얼굴은 화려하다. 정부가 밝힌 5년 투자 규모는 210조 원. AI와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가겠다는 청사진이다. 기술과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작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국가의 미래’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보도자료에 ‘인구’는 총 네 번 사용됐다. 5대 국정 목표에 인구 위기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담기지도 않았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이란 항목이 있긴 하다.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계획이 없다.

우리 현실은 절박하다.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세계 최저다. 비교적 인구가 많은 1990년대생이 출산 세대에 진입하면서 향후 몇 년간 출산율이 반등하고 출생아 수가 늘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50년 뒤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16만 명 선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과거 정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다.
그런데도 정부 인구 정책은 과거 해오던 걸 계속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 확대, 세제 혜택, 육아 휴직 확대 등은 이미 앞선 정부에서 시도했던 카드다.
지금 필요한 건 전환이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성평등 돌봄 체계 같은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없이는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시야의 협소함이다. 현재 정책은 출산에만 매달려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출산율 회복만으로는 정해진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 다수가 이미 이민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과감한 이민 수용으로 노동력 부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한국도 이제 교육·정착·통합을 포함한 종합적 이민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과제 어디에도 뚜렷한 이민 정책 비전은 없다.
컨트롤타워도 없다. 인구부 신설 논의는 사라졌고, 부처별 분산 대응만 남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꿔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지만, 결국 보건복지부가 주무를 맡고 여러 부처 파견자를 받는 권한 없는 위원회라는 점은 변함없다. 인구 위기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이 이끄는 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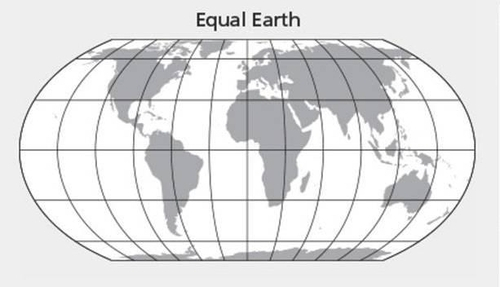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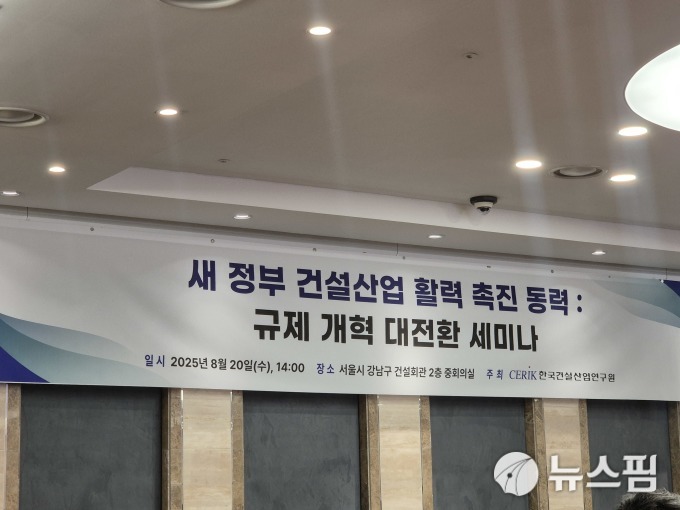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 듣다.](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6173026939_0f8989.jpg?iqs=0.503047981374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