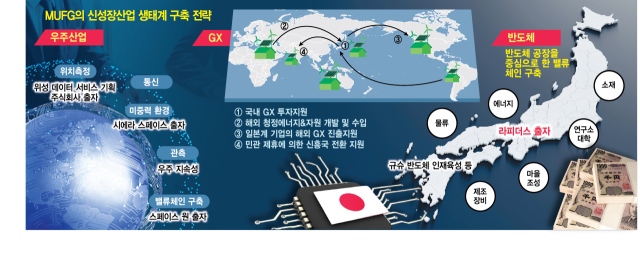경제성 이유로 김제공항 무산, 군산공항 국제선 추진도 미군 반대로 불발
청주(1997)·양양(2002)·무안(2007) 개항…전북만 여전히 국제공항 ‘빈칸’
새만금국제공항도 법원에 제동…전북의 해묵은 지역 과제로 현재진행형

전북 국제공항의 꿈은 반세기 동안 번번이 무산돼 왔다. 김포를 시작으로 제주,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전국 곳곳이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을 열었지만, 전북은 외딴섬처럼 남아 있다. 경제성 논리와 정치적 뒷받침의 부재 속, 도민들의 오랜 숙원은 여전히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북 국제공항 미건설은 전북소외, 낙후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성장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항공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역이 국제공항 유치에 뛰어들었다. 앞서 1958년 개항한 김포와 제주 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공항은 '지역 발전의 교두보'라는 기대를 모았고, 1976년 영남권 거점인 김해국제공항이 문을 열었다. 이 무렵부터 전북도 국제공항 건설의 꿈을 품었지만 현실은 번번이 좌절의 연속이었다.
첫 시도는 김제공항이었다.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8년 개발계획이 확정됐고, 2002년에는 480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착공까지 이뤄졌다. 당시 전북 사회는 “드디어 국제공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들떴다.
그러나 감사원이 “항공 수요를 과대 예측했다”며 경제성 부족을 지적했고, 2003년 사업은 최종 불발됐다. 반면 같은 시기 충북 청주(1997년)와 강원 양양(2002년)은 국제공항을 개항하며 대비를 이뤘다.
김제공항 무산 뒤 전북은 군산공항 확장으로 눈을 돌렸다. 2006년부터 군산 미군 비행장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0년에는 정부와 미군이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체결 문제를 소파(SOFA) 협의 의제로 올렸다.
그러나 미군 측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은 끝내 무산됐다. 2011년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계획에서도 군산공항은 제외됐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을 개항해 서남권 거점을 굳혔고, 전북 도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 같은 역사를 거쳐온 만큼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은 어느 때보다 컸다. 2016년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어 2021년에는 도내 200여 개 단체가 ‘건설추진연합’을 꾸려 조기 착공을 촉구했고, 지난해 SOC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2029년 개항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아 깨졌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착공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내렸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전북이 이처럼 번번이 국제공항 유치에 실패한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웠고, 지역 정치권은 이를 돌파할 힘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이 국제공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정치력의 차이였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부재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의 제약으로 이어져 왔다. 기업 투자와 관광 유치에서 뒤처지고, 지역경제의 붕괴,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해묵은 지역 과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만금 #새만금국제공항 #군산공항 #전북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다른기사보기
![[오목대] 국가예산과 피지컬 AI](https://cdn.jjan.kr/data2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