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일정 영향력 이상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는 법 개정안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지난해 바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시행령을 손봐 오는 10월 하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요즘 게임서비스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국경에 상관없이 2대 메이저 앱 장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즐기는 식이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때문에 만일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위법으로 규정된 것을 게임에 담거나, 이용자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손쓰기가 어려웠다.
당연히,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우리 국민 이용자 보호나 불법적 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벌써부터 도입됐어야 맞다. 그러면서도 국내외 사업자간 차등 요소나 제도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과다행정 요소를 미연에 막기 위해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같은 신중 절차를 거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가 가닥을 잡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도 좀더 명확화·세분화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상 게임 출시 초기 마케팅을 집중하며 다운로드를 높이는 방법이 쓰이지만, 이후 수개월내 아니 며칠내에도 급격히 다운로드 수는 줄수 있다.
그 반대로 초기에는 시들하다가도 요즘 표현으로 '역주행'하는 게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6개월 또는 1년간 월평균 다운로드 횟수 기준처럼 좀 더 시장 영향력을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함께 제도 시행 주목적을 해외 게임의 국내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책임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제도 불이행시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재입법예고 안대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는 제재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음달 18일까지로 예정된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과태료 현실화 같은 부분도 정부가 꼼꼼히 챙겨보길 바란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에 있어서도 법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게임처럼 정부 규제가 최소화돼야하는 산업도 없다. 그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산 게임이든, 국산 게임이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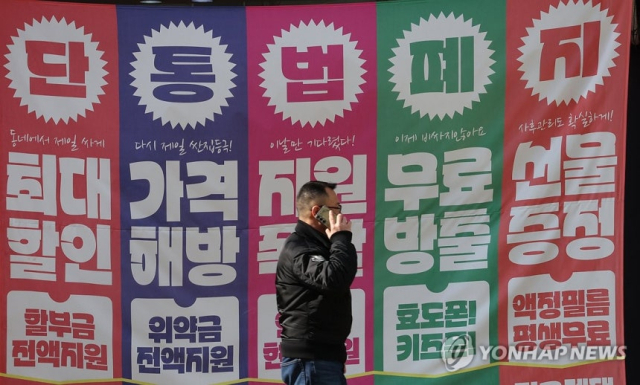
![셈법 복잡해진 IPO…기관 의무 보유 강화하자 신고서 제출 '0'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13/2GVC1MWQFK_2.jpg)
![[법 앞에서] 더 높은 문화의 힘을 위해](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3776923894_2e0618.jpg)

![[1년전 오늘] HD한국조선·STX중공업 기업결합 승인](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5294_873854_2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