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은 여러가지 이슈와 결합돼 있습니다.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수익 사업의 세금 이슈, 국내법에 따른 규제 회피 이슈, 보안 시설의 노출 이슈 등을 주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애플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세금으로 구축한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 때에는 다양한 사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고정밀 디지털 지도를 무료로 일반에 제공하는 이유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이득이 국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그런 지도를 외국의 기업이 반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고 세제 혜택을 누린다면 이는 정책적 지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공간정보공학의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공직과 학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1988년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이어가다 2000년부터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18~2019년에는 국토지리정보원 제27대 원장을 역임했다. 공간정보(GIS), 위치기반서비스(LBS), 스마트시티, 디지털 지도 수정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지식 서비스 등 연구를 주도했다. 특히 공간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에 매진해왔다.
유 교수는 최근에는 기존에 활용되던 공간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같은 공간 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음성만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이다.
유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서비스 중인 수많은 공간정보시스템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기능 구조 때문에 일반인의 활용도가 낮다”면서 “만일 음성만으로 모든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I가 직접 시스템의 기능들을 이리저리 활용해 필요한 답을 정확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결국 기존 시스템의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져 투자 대비 효과가 상승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유 교수는 최근 AI로 일어날 산업적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향후 LLM은 신경기호식 방식으로 현재의 딥러닝 기술과 기호 논리 추론 기술과 융합해 진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때문에 새롭게 출한 이재명 정부에도 AI로 인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에이전트가 상당 부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앞서서 실직 등에 대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수십억개의 AI 에이전트가 나타나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제하고 활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에이전트에게 음성으로 요구만 던지고 모든 일은 클라우드 영역에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수행해 결과물을 주며, 육체 노동은 로봇이 규칙적인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세상이 즉 새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 도래한다”면서 “새 정부는 다가올 새롭고 놀라운 변화의 세상에서 많은 국민이 혼란과 실직에 빠지지 않고 대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특별 좌담회]이재명 정부, 'AI 선도병원' 지정 시급…디지털혁신 마중물 절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2/news-p.v1.20250712.c6ee415d0b0c491d9a2d5a65e7c95952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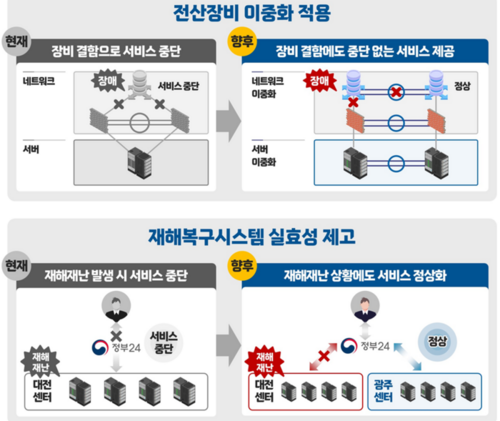
!["우리회사는 챗GPT 금지하는데"… 'AI활용 의무화'한 이 기업[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7/13/2GVC2EHTD6_1.jpg)
![[단독] 삼성전자 ‘소버린 AI 정예팀’ 꾸린다…서울대·KAIST와 협업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7/13/2GVC23JXBB_2.jpg)
![[프로필] 박인규 과기부 혁신본부장…R&D 예산 조정 '중책' 맡은 물리학자](https://img.newspim.com/news/2025/07/13/25071315555666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