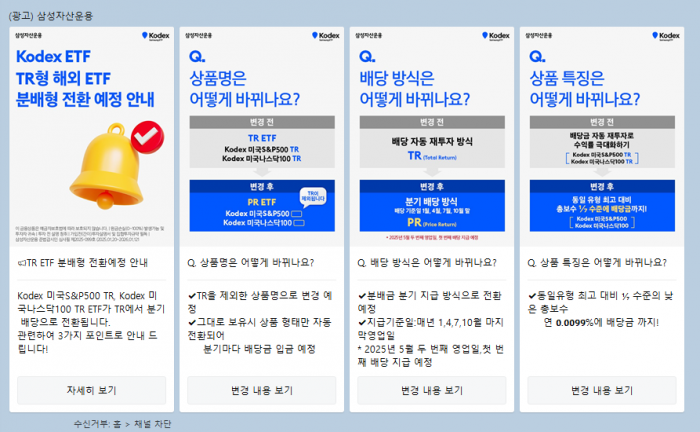한국 자본시장하면 제일 먼저 따라붙는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휴전 상태 분단국가란 지정학적 리스크는 너무 낡은 구실이라 차치하더라도, 가장 큰 직접 원인은 내재적 흠결이다. 바로 부실덩어리 기업들을 무작정 끌어 안고 있음으로써 오는 합병증이다. 2015년 이후 코스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매출액·시가총액 기준 퇴출 상장사가 단 한 곳도 없었음이 이를 웅변한다.
기업을 자본의 가치척도에 놓고 첨예한 비교경쟁을 펼치는 국내외 자본시장의 시가총액(시총) 퇴출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느슨하고, 관대한지 확연해진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는 시총 100억엔(약 930억원)을 넘어야 살아 남고, 미국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마켓과 글로벌마켓은 시총 5000만달러(약 730억원)를 웃돌아야 상장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시총기준 각각 50억원, 40억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엄격하다.
상장사는 상장심사와 투자자들의 공모로 잔존·미래가치 평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 상장된 뒤 매일 주가로 평가 받고 분기, 반기, 연간 기준 실적과 재무제표로서 기업 활동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끊임없이 평가 받는다. 기업 지속성이 저하되고, 매출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어느 시점에선 과감히 도려냄으로써 다른 상장사 또는 시장 전체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없애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총기준을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많이 늦은감이 있으나 분명 옳은 조치다. 당장 내년부터 코스피는 현재의 4배인 200억원, 코스닥은 3.75배인 150억원 시총을 넘어서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된다. 금융위는 이 퇴출기준 적용으로 오는 2028년까지 200개에 육박하는 상장사가 시장에서 쫓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감사 의견을 2년 연속 받는 경우,이의신청없이 즉각 상장폐지키로 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코스피에선 50개, 코스닥에선 270여개 기업이 하루 1억원도 안되는 거래액으로 상장기업 명패를 내건채 전체 시장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투자자에겐 한없이 엄격하면서, 기진맥진한 상장사에겐 한없이 관대한 자본시장 퇴출기준은 이제 퇴출돼야 한다. 그래야 '코리아 밸류 업'이 빨라 다가온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GAM]중국 본토 A주 상장사의 홍콩 이중상장, 그 배경은?②](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0753532722.jpg)

![[GAM]20개 기관 진단 '2025년 A주', '4대테마, 20개 유망주'①](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0742594520.jpg)

![[AI PRISM*주식 투자자 뉴스] 160조 중동자본 한국 진출…中ETF 급락 속 증시 변동성 주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LJX1DM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