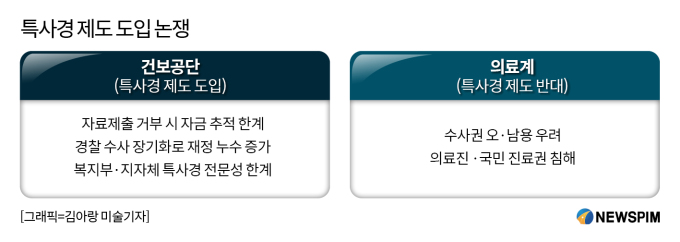박정희정부 시절인 1975년 3월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급행료(急行料)라고 불리는 종류의 부조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금년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일은 이 같은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각부 장관이 세칭 급행료와 같은 부조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갖고 임한다면 그 자체로 벌써 시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는 덕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대통령의 호된 질책에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을 법하다.

급행료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이다. 여기서 담당자란 주로 민원 접수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비공식적’이란 말로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상 뇌물이나 다름없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수사 기록 복사, 억울한 구속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한 보석 신청 등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 및 검찰 직원이 서류를 붙들고 앉아 하염없이 시간만 끌면 애꿎은 민원인만 속이 타지 않겠는가. 박 대통령이 ‘급행료 발본색원’을 지시한 것이 1975년의 일이지만,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한 관공서의 급행료 악습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다. 심지어 2000년대 초에도 공무원들의 급행료 수수를 꼬집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급행료 때문에 곤란을 겪는 한국인이 많은 듯하다. 공무원의 권한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 부정부패가 심한 개발도상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일을 빨리 처리해줄 테니 웃돈을 얹어 달라’는 현지인의 부당한 요구에 직면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얼마 건네고 대충 넘어갔을 지도 모르겠다. 201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한국계 기업의 경우 일본·중국·대만·싱가포르 등 타국 기업보다 급행료 등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빠른 통관을 선호해 오히려 현지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한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기업이)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를 피하고 싶거든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상품을 만들라는 얘기다.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10억달러 넘게 투자하는 기업은 각종 심사에 걸리는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 적용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돈을 많이 내면 그만큼 일도 빨리 처리해준다’는 급행료의 원리가 떠오른다. 아무리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하지만 패스트트랙 명목으로 1조4000억원을 요구하는 행태는 지나치다는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다.
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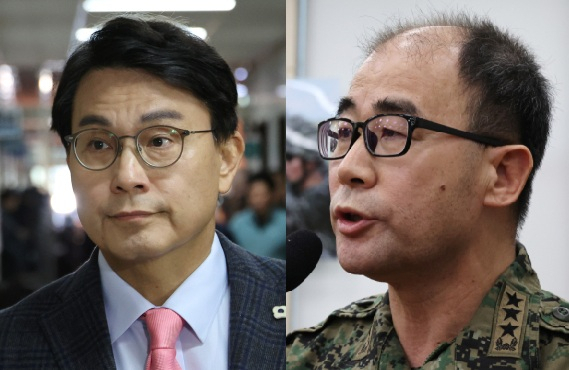
![[속보] 권성동 "공수처 '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났다…오동운 사퇴해야"](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287767_1465052_m_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