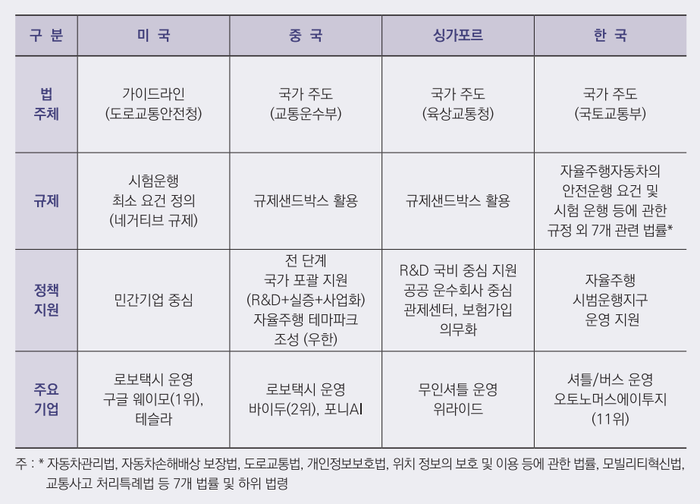애플이 연내 차세대 메시지 규격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를 도입한다. 고화질 이미지 전송, 수신 확인, 입력 상태 표시, 그룹 채팅 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기본 제공된 기능이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미국, 캐나다 등 주요 7개국과 중국 일부 지역에 RCS를 적용했지만, 한국은 제외했다. 올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연동 테스트를 위한 iOS 베타 버전 제공을 요청한 뒤에야, 애플은 뒤늦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도입한 '나의 찾기' 서비스도 늦장 대응 사례다. 애플 기기의 분실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이 기능은 사용자에게 필수 기능으로 꼽혀왔다.
국내에서는 정식 출시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위치 공유'는 국내 출시 아이폰에서만 차단됐고, 액세서리도 블루투스 범위 내 탐색에 머물렀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시 초기부터 제공된 기능이, 한국에서는 수년이 지나서야 정상화됐다.
애플은 주요 기능을 한국 시장에서 늦게 도입하거나 제한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는 주요국 중 가장 늦었고, '수리권 보장'이나 보안 업데이트도 북미·유럽에 먼저 적용했다. 제품은 동시 출시되지만,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한 박자씩 늦다. 같은 가격을 내면서도 불완전한 기능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애플은 이를 '완성도'와 '프라이버시'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보안, 통신, 위치 공유처럼 사용자 권익과 직결된 기능조차 장기간 배제한 사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동일한 기기가 해외에서는 정상 작동하고, 국내 모델에만 제한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애플은 다음달 공개할 신작 아이폰17 1차 출시국에 한국을 포함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기타 출시국'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아이폰16부터 1차 출시국에 올랐다. 출시 일정은 글로벌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기능과 서비스에서는 차별이 남아 있다. 애플이 사용자 중심 기업이 되려면, 기능과 서비스에서도 차별 없는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 시장에도 더 이상 늦장 대응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르포] KT “보빈(케이블 운반틀) 절반 친환경으로 교체…탄소 45톤 줄인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5/news-p.v1.20250815.47870bc646074aae9d6e185bb3b2fa2a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