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출 등 보안에 대한 우려로 정부 부처에 이어 민간 기업에서도 중국산 생성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딥시크의 일간 사용자 수는 출시 초기에 비해 3분의 1로 급감했다.
무슨 일이야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사를 비롯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등 다수의 기업들이 사내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고객들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KB·하나·우리·신한 등 은행권과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하나증권·IBK투자증권·LS증권 등 증권사들도 일찌감치 직원들의 딥시크 접속을 막아둔 상태다.

이게 왜 중요해
기업들의 사내 생성 AI 사용 금지 조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AI 모델이 기업 자료를 학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직원들의 AI 활용 수요를 고려해 챗GPT 엔터프라이즈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는 기업형 구독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삼성그룹(가우스), LG그룹(엑사원) 등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딥시크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부처를 시작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딥시크는 기업용 구독 요금제거 따로 없고,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등은 AI 서비스 중 딥시크만 사용을 차단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이노베이트에서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통해 기술 점검을 마친 AI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접속은 불가하다. 신세계그룹·현대차그룹·쿠팡 등 다른 유통사들 역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제3자와의 공유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개보위 관계자는 7일 열린 브리핑에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보안 우려로 딥시크의 국내 사용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모바일앱 통계 분석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딥시크 앱의 일간 사용자 수는 지난달 28일 19만1556명에서 지난 6일 6만1184명으로 일주일만에 70% 가까이 줄었다.

더 알면 좋은 것
딥시크는 오픈소스(코드 등 AI 모델의 개발 정보를 공개하는 것) 모델로, 이를 다운로드 받아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경우 데이터가 별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어진다. AI 스타트업 뤼튼은 지난 4일 이 방법을 사용해 딥시크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딥시크를 개인정보 유출 위협 없이 활용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 컴퓨터에서 ‘온디바이스’(서버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작동하는 방식)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개인 기기에서 망이 분리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부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없어서다. 온라인에서는 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해 임의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생성하거나 계정 생성 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팁 등도 확산되고 있다.
![[사설] 기업계 '사이버보험' 인식 전환 필요하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09/news-p.v1.20250209.84d03721de56404ea6de9e3c21d0dd3b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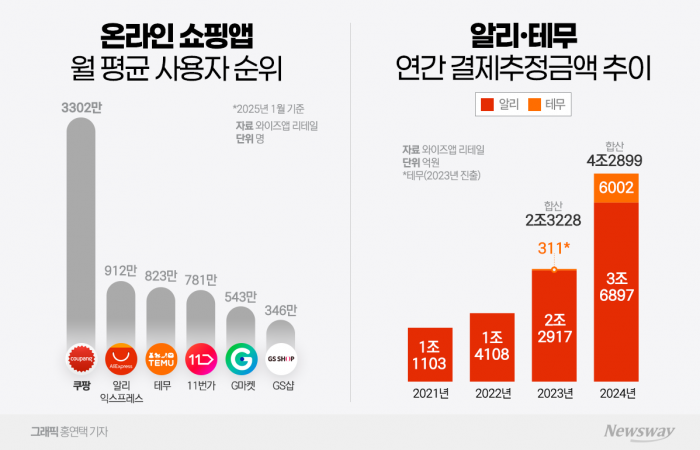
![보안 우려 커지는 딥시크, 챗GPT와 뭐가 다를까 [딥시크 Q&A]](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9/20250209509576.jpg)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디지털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불변경 저장 기술 동향 및 이슈사항](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0/news-p.v1.20250210.16c4c7efd9514d5097f79894392adba1_P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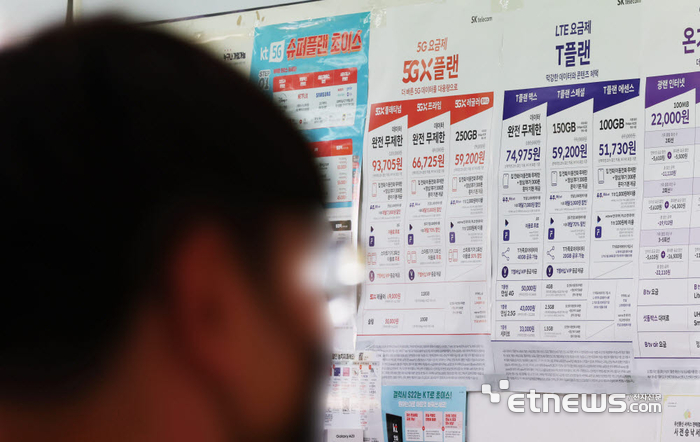

![[심재석의 입장] 카카오와 오픈AI의 제휴가 아쉬운 이유](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2/kakao_openAI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