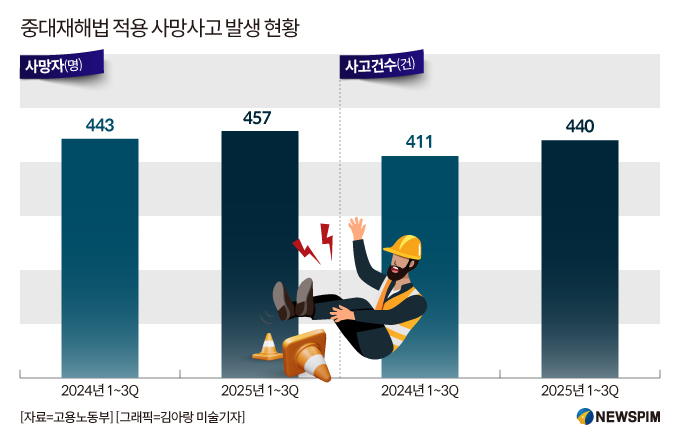1종 시설물 중심서 C·D·E등급 3종 시설물까지 검사 의무 확대
예산·인력 기반 취약…형식적 진단 우려 커져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종전 1종 시설물 중심에서 D·E등급 2종 시설물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내달 4일부터 준공 30년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까지 의무 대상이 추가되는데 노후 시설물 상당수가 정밀진단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셈이다. 시설물 등급체계를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안전관리 체계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표면상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을 전면 강화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가 확대됐지만, 현장은 강화된 기준에 상응하는 제도·예산·인력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우선 업계는 현장의 대응 능력이 제도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5년 이내’였던 D·E등급 시설물의 보수·보강 기한을 ‘3년 이내’로 조정했는데 이런 보수·보강 기한 단축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유는 지자체의 연 단위 예산 편성 구조다. 수십억 원 규모의 보수 사업을 기한 내 설계부터 발주·시공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기한 단축이 오히려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시키는 형식적 진단’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기관과 기술자 부족도 안전관리 체계의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시설안전협회에 따르면 등록된 안전진단 업체는 지난 2023년 기준 1415곳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곳은 760개 사로 집계됐다.
정밀진단은 고도의 구조 해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기술사급 인력이 주도해야 한다. 정밀진단 대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이로 인한 진단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밀진단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평가 항목은 광범위하고 항목별 정량화 수준도 낮아 담당 기관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 기준이 모호하면 진단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문제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행되기 어렵다. 특히 C등급 시설물의 경우 ‘추가 진단 필요’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실상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정밀진단 절차가 실질적 위험을 찾아내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 기준의 정량화와 해석의 통일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역량평가나 등급제 도입을 통해 기관 간 편차를 줄이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 지원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밀진단 강화는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력 확보, 재정 지원 등 기반 조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강화된 진단 체계가 ‘법적 의무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안전 강화’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C-ITS 멈춘 한국(상)] '지능형 도로망' 첫발도 못 떼…10년째 제자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5/news-g.v1.20251125.e76e8797789d42038ffed38cc81a46c4_Z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