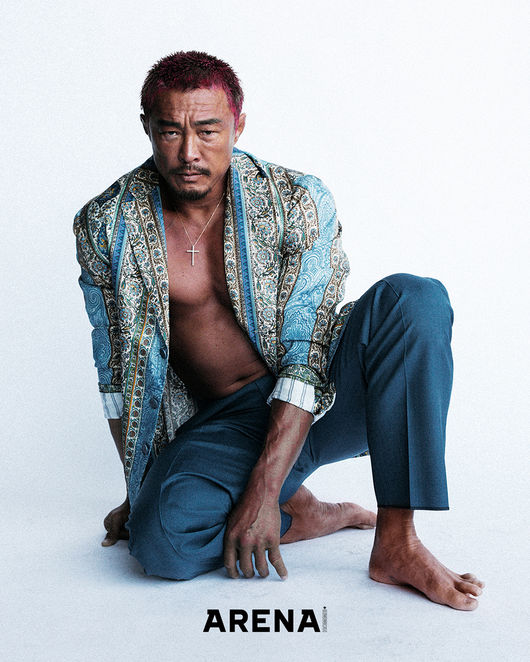몇주 전 세계 대중음악계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제67회 그래미 어워드가 열렸다. 올해 그래미 어워드의 주인공은 무려 여섯 번째 도전 만에 ‘올해의 앨범’ 트로피를 거머쥔 비욘세와 그래미 역사상 최초로 ‘디스(diss) 트랙’으로 주요 부문 두 개를 휩쓴 켄드릭 라마였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로컬 음악상에 불과한 그래미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1940년대 이래 대중음악 트렌드의 본거지이자 산업의 중심으로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그래미 어워드에 쏟아진 다양한 불만, 시상식의 주체인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보수성과 경직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문가와 대중들이 이 결과를 기다리고 주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내에서 영미권 팝음악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최근 몇년간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관심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세계적인 산업으로 거듭난 K팝의 ‘그래미 도전기’에 시선이 모이면서 평소 해외 음악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K팝 팬덤까지도 시상식의 결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방탄소년단이 있었다. K팝 중 최초로 3년 연속 후보에 지명되면서 수상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그래미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게다가 그 이후 2년간 K팝이 후보 자체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음악 장르로서 K팝의 위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으로도 이어졌다. K팝이 그래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나 변화가 있어야 할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K팝에서 방탄소년단 이상의 지명도를 가진 팀이 또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K팝 산업은 꾸준히 확장하고 있고, 이제 그 무대는 아시아권을 넘어 북미·남미·유럽권을 쉽게 아우르고 있다. 글로벌한 히트곡이나 아티스트가 나올 확률 자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미는 어디까지나 미국 주류 산업의 현재를 반영한다.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K팝이 틈새시장 전략에서 탈피해 미국 대중음악 산업의 중심부에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외국 음악’으로 인식되는 K팝이 현실적 한계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팝의 상징과도 같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 ‘아파트’(APT.)를 만들어낸 로제의 성공은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K팝 가수의 곡이지만 미국 팬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로컬’의 음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친화력과 산업적인 일체감의 유무는 그래미를 향한 K팝의 도전에서 추상적 개념인 ‘음악성’보다 더 현실적인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소위 ‘코리안 시네마’는 지난 30여년간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명도를 넓히며 현지 영화인과 애호가들을 충실한 아군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그 시대정신이 무르익으면서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으로 꽃을 피웠다. 아직 K팝에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저변의 인식이다. ‘팬덤’과 ‘화제성’을 넘어 미국 주류 음악계 인사이더들이 기꺼이 인정하고 표를 던질 수 있는 K팝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그 돌파구는 ‘아이돌’을 넘어선 다양한 장르 음악에의 도전과 정상급 현지 아티스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비롯될 것이라 확신한다. 인기에 그치지 않고 평판과 명분을 확보하는 K팝의 미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