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던 건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최저임금 1만원’과 ‘주 52시간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양 날개였다. 시급 1만원은 돼야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줄여줘야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정책이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자 정권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획일화된 주 52시간제가 초래한 경제적 결과는 무엇일까. 엄격한 근로시간 제한은 한국의 근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지금 한국에서 ‘칼퇴근’은 당연한 문화가 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식당도 오후 10시 넘어 불 켜진 곳은 찾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기업들 밤낮 없이 연구·개발
한국은 투자 의욕 꺾는 제도 속출
규제 족쇄 풀어 경제 활력 살려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다. 근로시간 규제가 본격화한 뒤 지난 6~7년 사이 중국 기업은 로봇청소기부터 전기버스까지 한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중국은 알리바바가 차세대 AI칩을 개발할 만큼 반도체 기술도 약진했다.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는 흔들리고 있다. 주 52시간제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해도 끝없는 반(反)기업 규제, 이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위축, 제조업의 연쇄 해외 이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한국 기업은 밤만 되면 불이 꺼지고 중국 기업은 밤늦게 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중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44시간이고, 월 36시간의 초과 근무가 가능한데 명목상 제한일 뿐이다. 현실은 ‘996’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007’도 있다. 연구진과 경영진은 365일 0시부터 24시간 근무체제라는 뜻이다.
근로시간 제한은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필요하다. 과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장시간 근무를 원하더라도 제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과 중심의 연구직 근로자는 생각의 흐름이 끊기면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 분야의 근로를 제한하면 국가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대기업이 되면 최대 343개의 규제 족쇄가 채워진다. 규제가 넘치면서 한국은 어느새 사회주의 국가보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다. 올해 둘러본 중국·베트남에서 이런 우려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였다. 그 속에서 기업들은 무한 경쟁을 벌인다. 여기에 국가 주도 경제개발이 시행되면서 과거 1960~70년대 한국처럼 정부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이 올림픽처럼 국가 대항전이 되면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중국이 사회주의 잠에서 깨어나 1978년 자본과 경쟁 원리를 도입한 개혁·개방에 나선 뒤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달리면서 국가 역량을 첨단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여기에 나선 기업들은 최고의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인다. 반면 한국에선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상법개정안 같은 규제로 기업의 손발이 묶인다. 중국이 경쟁주의라면 한국은 규제주의의 전형을 보인다. 어느 쪽이 승리할 수 있을까.
반기업 규제가 넘친다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노동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에 없던 추투(秋鬪)까지 등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여서 제도 자체는 좋은 법이다. 다만 ‘좋은 사용자’와 ‘좋은 노동조합’이 만났을 때 얘기다.
그러나 현실에선 ‘나쁜 노조’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회사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거듭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데도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중국 기업의 위협적인 시장 확장 속에 노동쟁의까지 늘어난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기업을 규제의 덫에서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드는 길에서 한국 경제를 구해낼 수 있다.
![[2025 국감] 중국 초저가 공세에 K-브랜드 '붕괴 위기'…中企 피해 97%](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954075480.jpg)

![美관세 탓 대중 무역구조 깨져…"아세안·EU 대체시장 잡아야" [관세후폭풍]](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e9cafa7f-9ae6-4cd9-8c5d-d480275e31e0.jpg)
!["넉 달째 미국으로 수출 0"…중소∙중견기업 죽어난다 [관세후폭풍]](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02d85c06-e9e5-405a-8a0f-9b79faa8bef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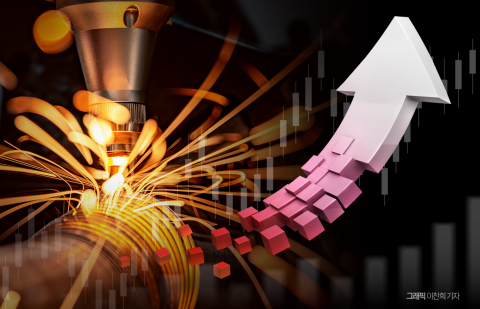
![[2025 국정감사]中企 수출 급감·플랫폼 수수료 지적···'벤처대책'엔 한목소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4/rcv.YNA.20251014.PYH2025101410480001300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