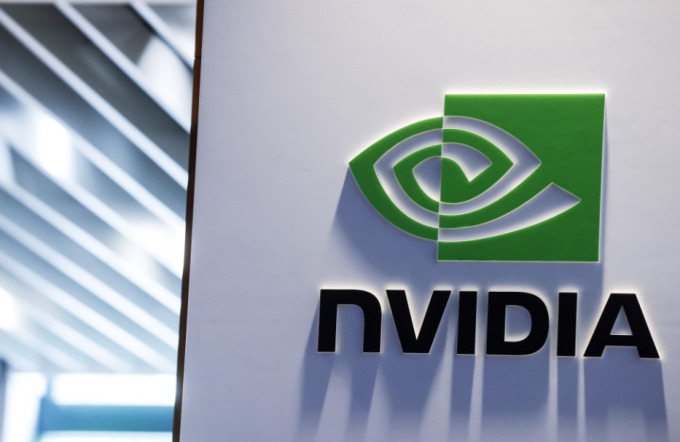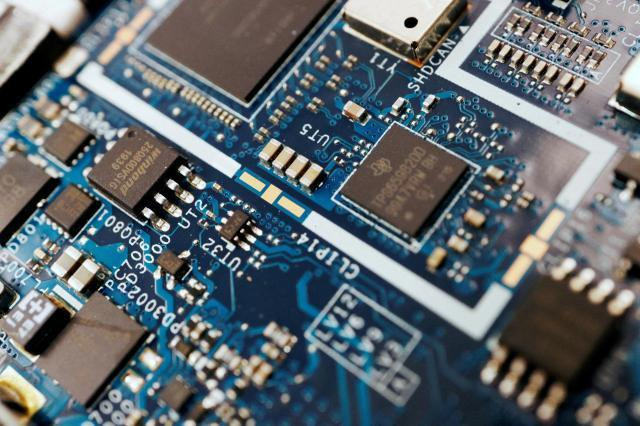'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는 등 한치의 물러섬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에 20%의 관세를 적용해온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호관세 34%를 추가해 관세를 54%로 높였어요. 이에 질세라 중국 역시 미국에 34% 상호관세 부과로 맞불을 놓았죠.
관세전쟁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번에는 다시 미국이 추가관셰 50%를 9일(미국 현지시간) 자정부터 중국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총 관셰율은 104%로 껑충 뛰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에 1000원에 팔던 상품 가격을 2000원 이상으로 올려 받아야 적자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이에 비해 미국 상품은 여전히 1000원에 팔릴테니 중국의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마련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관세정첵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도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대책이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희토류 수출제한'입니다.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직전의 1기 트럼프의 집권 말기였던 2021년 1월에도 꺼내든 적이 있어요.
도대체 희토류가 무엇이길래 중국이 내놓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걸까요?
희토류, 넌 정체가 뭐니?
희토류(稀土類)의 사전적 의미는 희귀한 흙의 종류를 뜻하지만, 달리 말하면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로 이해하면 돼요. 자연상태에서 모든 광물은 흙이나 모래, 돌, 바위에 섞여있으니 한자로 흙 토(土)자를 사용하게 된거죠.
희토류는 화학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면서 열 전도율이 높은 물질이예요. 전기적·자성적·발광적 특성이 뛰어난 물질이죠. 희토류에 해당하는 물질은 총 17개나 돼요. 란타넘(La), 세륨(Ca),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테르븀(Yb), 루테튬(Lu) 등 란타넘족 원소(원자번호 57~71) 15개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스칸듐(Sc), 이트륨(Y) 등 2개 원소가 해당되죠.
하지만 희토류라는 이름과 달리 반전이 있어요. 이름 만큼 희귀하지는 않아요. 중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브라질, 호주, 대만, 인도 등 전세계 여러나라에 풍부하게 묻혀 있죠. 우리나라에도 충청북도와 강원도 일대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중국이 희토류 강국일까?
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는 전세계 희토류의 38%(4400만톤)로 추산돼요. 비율상으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매장량이 중국의 두배 가까이 되는데 왜 중국을 희토류 강국이라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희토류를 생산하기 때문이예요.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연간 27만톤으로 세계 시장의 69.2%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은 17종의 희토류 모두를 국내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국토가 넓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왜 희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는 걸까요?
1980년대만 해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가는 미국이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광산이 새계 최대 산지로 손꼽혔죠. 하지만 희토류의 가치에 눈을 뜬 중국 정부가 희토류 채굴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한때 전세계 희토류의 90% 가량을 생산할 정도로 급성장했어요.
자연에서 희토류를 캔 후 산업용도에 맞게 가공해야 하는데 추출과 정제가 어려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거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도 많이 발생해 물과 토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희토류 생산을 억제했어요. 미국의 마운틴패스광산도 환경규제와 심각한 오염 문제로 2002년에 문을 닫았죠.
이에 반해 환경오염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중국은 희토류 생산에 적극적이었어요. 풍부한 노동력 덕에 생산비도 다른나라보다 월등히 싼 중국은 가격경쟁력면에서 경쟁국가를 압도하면서 세계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수출물량을 줄이고, 공급가격 인상, 세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희토류가 없으면 안되는 걸까?
희토류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해요. 첨단산업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테르븀을 섞어만든 금속은 열을 가하면 자성을 잃지만 식히면 다시 자성을 회복하는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광자기디스크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기록하는 매체에는 필수 원소예요.
광섬유에 가돌리늄을 조금만 넣어도 빛의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인터넷 속도를 높이거나 먼거리에서도 손실율을 줄이려면 이 역시 필수예요.
네오디뮴과 사마륨은 가장 강력한 영구자석 재료에 쓰이고, 유로퓸은 TV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에 중요한 형광체로 사용되죠. 이 외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터빈, 태양광발전, 항공우주산업, 의료산업 등 모든 첨단분야에서 대단한 활약상을 보이고 있어요.
희토류 중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중국의 결심에 따라 세계 첨단산업의 흥망성쇠까지 연결되자 세계 각국은 희토류 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물질로 대채하는 방안을 찾고 있어요.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미국 테슬라가 희토류 없는 모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죠.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희토류 대체의 꿈이 실현되려면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

!['희토류 무기화' 중국에 미국 속수무책…“15년간 안일한 대응 결과”[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9CMOW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