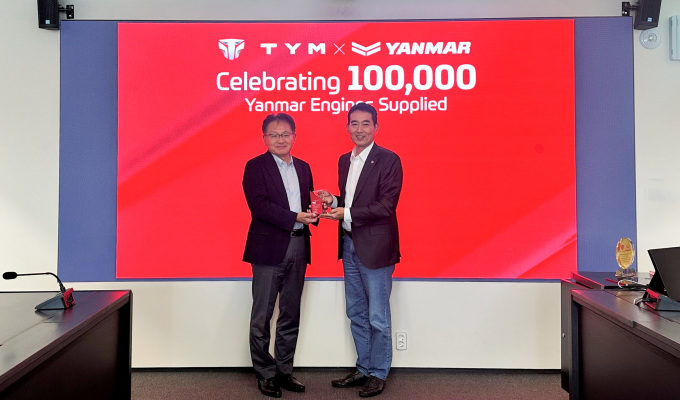[전남인터넷신문]신문 기사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0월 29일 도청 VIP실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팜 농산물 글로벌 수출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세비아(Sevia)와 영농회사법인 탐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세비아는 일본 내 유통망을 활용해 전남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탐진들은 AI 스마트농업 기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주식회사 세비아(株式会社セビア)는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 있는 회사로, 연매출은 2024년 기준 약 644억 원(환율 ¥1=₩9.34 기준) 규모이다. 일본 농협, 농업 생산 법인, 개인 농가, 생산 조합 등과 직계약을 통해 청과류, 가공품(주로 퓌레), 절단 채소 등을 주로 업체에 공급하는 유통 기업이다. 한국산 과채류를 수입한 사례는 있으나, 취급 품목이 전남에서 생산되는 것은 물론 ‘AI 스마트팜 농산물’과의 직접적 연계성은 비교적 낮다.
영농회사법인 탐진들은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이 모여 만든 유통 법인으로, 1994년 자동화 유리온실 4,000평·조합원 5명으로 출발했다. ‘공동 생산·공동 판매’ 체계를 구축하며 수출형 농업 법인으로 성장했고, 현재는 연간 1,250톤의 파프리카를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며 2024년 수출 실적 49억 원을 기록했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이미 안정적 수출 기반을 가진 법인이다.
즉, 탐진들은 애초부터 자동화 시설원예와 수출을 결합해 온 기업이며, 이번 협약이 새로운 AI 기반 수출 모델의 출발점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AI 스마트팜 농산물 글로벌 수출’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했다. 실제 내용보다 ‘AI’라는 단어를 강조한 홍보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협약의 핵심 문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수출 구조에 ‘AI’라는 용어를 덧입혀 새로운 성과처럼 재포장했다는 점이다. 최근 농업 행정은 ‘스마트팜·AI·빅데이터와 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책의 미래성을 보여주려 하지만, 이들 개념이 실체보다 수사(修辭)로 먼저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이 정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정책을 이끄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런 홍보식 행정은 세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현장을 ‘새로운 혁신 사례’처럼 왜곡한다. 탐진들의 오랜 수출 역사는 ‘AI 기반 수출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포장되었다. 둘째, 과잉 수사(修辭)가 반복될수록 진짜 AI 농업의 가능성마저 신뢰를 잃는다. ‘간판용 AI’가 농업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 셋째, 정책은 실천보다 표현 경쟁으로 흐르게 된다. 홍보 문구가 혁신을 대신하는 순간, 기술 개발은 늦어지고 현장은 소외된다.
정책과 보도는 정확해야 한다.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포장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농업 현장은 행정 언어의 소비자에 머무르고 혁신은 구호로만 존재한다. 진정한 성과는 ‘AI’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현장에서 작동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그 결과가 수출로 연결되는 과정을 입증하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AI 스마트팜을 ‘표어’로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스마트팜의 ‘육성 과정과 그것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과 수출 성과’를 증거로 보여주는 행정 전환이다. “AI를 붙이면 미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설명과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점을 정책 담당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허북구. 2025. 전남 농업, 스마트할 수록 가난해지는 구조 개선해야.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5-11-03).
허북구. 2022. 전남농업, 후방산업 육성해 시너지효과 내야.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킬럼(2022.6.9.).
허북구. 2020. 전남도, 스마트팜 R&D와 장비업체 집적화 선점해야.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0.8.18.).



![[AI의 종목 이야기] 中 거린메이, 전자폐기물 손 떼고 금속자원 회수 집중](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