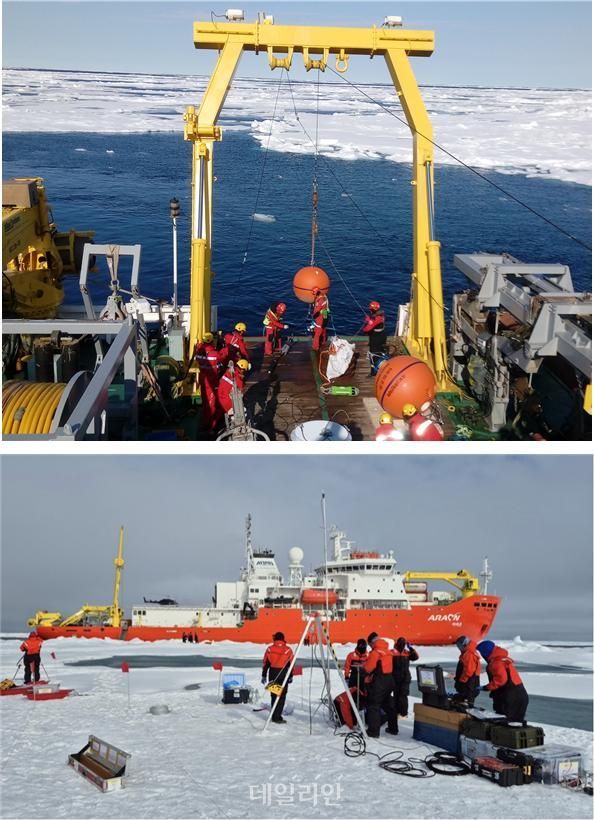‘아~ 아프다. 나도 아프다.’ 1월 13일 월요일 새벽 일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오른쪽 팔꿈치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었다. 주말 내내 아무런 징후를 느끼지 못해 더 놀랐다. 순간 생각이 스쳐 갔다. ‘아~ 그렇구나, 지난 금요일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지난 1월 10일 금요일 새벽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추운 날씨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만 영하 20도에 달할 정도로 무척 추웠다. 전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고 온종일 영하의 날씨였다.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있는 음식물은 얼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이 더 무거웠다. 얼어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음식물을 식칼과 나무 막대기로 쑤시면서 온 힘을 다해 용을 썼다. 1m 70cm 정도를 들어 올려 포터에 실린 120ℓ 통에 음식물을 털어 넣는데, 평소에는 그냥 쉽게 떨어지던 음식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일하면서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느껴졌지만, 지금까지는 후유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월요일 새벽은 전혀 달랐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아팠다. 덕분에 처음으로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포터를 타고 다니며 하루에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최소 1t이 넘는다. 오늘과 같은 월요일 새벽은 수거하는 양이 적어도 2~3t은 된다. 수치로 생각하니 일주일에 최소 6t 이상을 들어 올리며 지구 중력에, 자연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자연계에서 쓰레기를 생산해내는 집단은 인간이 유일하다). 매일 수백 개에 달하는 5ℓ와 20ℓ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므로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도 하루에 수백 번 당긴다. 이것 또한 오른쪽 팔꿈치에 무리를 줬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차에 수백 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역시도 만만찮은 힘이 든다. 종량제 쓰레기 2년, 음식물쓰레기 8년, 합해서 10년 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가 이제 나에게도 나타났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이것이 늙는다는 것, 나이 드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소위 말하는 ‘골병’이 드디어 내게도 찾아온 것이다. 지인분에게 자문하니 웃으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힘든 육체노동을 해도 아픈 데 없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더는 자랑 못 하겠네! 오른팔에 힘을 덜 주려 하다가 다른 쪽도 아파질걸세! 그게 나이 드는 거지.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거라네.” 맞는 말이다. 처음으로 내 몸에 관해 관심을 가졌고, 내 몸이 고마웠다.
한동안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나는 이 의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세월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이었다. 꺾였다가 다시 마음먹는 것이 내 삶에서는 더 중요했다. 이제는 ‘중꺾몸’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는 몸, 평생을 건강한 몸으로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삶이 유한하기에 아프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그것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만 남는 것 같다. 남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 상한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면서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1만 시간 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각종 쓰레기를 수거한 지 10년, 1만 시간을 넘게 일했다.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일하면서 옷을 거의 버리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통 역시도 웬만하면 깨질 않는다. 지난 세월의 경험이 나에게 온몸으로 입혀졌다. 하지만 ‘골병’ 즉 육체적 아픔도 함께 찾아왔다. 아픔(고통)과 함께 찾아온 ‘철학적 사색’, 이 둘은 음양의 조화처럼 함께 오는가 보다.
이 글을 쓰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20대 중반 이웃집 아저씨를 따라서 방수 노가다를 2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쉬는 날이 없이 일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손이 자동으로 떨렸다.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할 정도였기에 두려웠다. 방수 작업 전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이물질을 진동이 있는 기계로 쉴 틈 없이 제거하는 일이었기에 손에 무리가 많이 갔다. 손이 아팠고, 실시간으로 떨렸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술을 진통제로 먹는다는 것이 이해되었다. 나는 체질적으로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기에 내게 진통제는 이렇게 글을 쓰며 표현하는 것이다.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의 나처럼 말이다. 팔꿈치가 아픈 덕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나의 노력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지난 1월 15일 월급날은 모든 노력과 아픔을 잊을 수 있는 날이었다. 매년 1월은 쓰지 않은 연차 수당에, 미집행금을 합해 약 두 달 치 월급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꽤 큰 금액으로 내게는 최고의 진통제이다. 마지막으로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가 떠오른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바꿔서 써 본다. 음식물 쓰레기통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걸 밤새 치우는 나는 힘들다.
이형진 환경미화원 작가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넘쳐나는 옷 쓰레기, 국내서 재생원료로 만든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0/20250330509512.jpg)
![[오늘 날씨] '꽃샘추위' 풀리고 큰 일교차 주의...봄맞이 대청소 '꿀팁'](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409043_1479591_m_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