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원을 뽑는 기준은 사랑과 호기심이다.” 지난달,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 회사 ‘딥시크’ 창립자 량원펑의 말이다.
딥시크가 지난달에 출시한 인공지능 모델 ‘R1’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그 충격으로 그 다음날 미국 엔비디아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날 하루 주식 가치 총액이 5600억달러, 약 815조원이 사라졌다.
만 40세인 량원펑은 그의 말대로, 연구·개발 경력이 1~2년밖에 되지 않은 젊고 창의적인 공학도들을 선택했다. 모두 중국대학 출신이다. 량원펑 또한 광둥성의 수학천재였고 저장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
량원펑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학습 개발을 통하여 미국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개발 비용의 3%밖에 들이지 않고 그에 버금가는 성능을 만들었다. 더욱 파괴적인 변화는 인공지능 메커니즘 소스를 대중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누구나 딥시크 누리집에서 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초거대기업 인공지능 모델들이 지배하는 비밀주의와 독점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 도전이다.
딥시크는 에너지 사용 또한 획기적으로 줄였다. 미국의 인공지능 모델 데이터 센터가 네덜란드의 국가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전력 에너지와 막대한 냉각수를 소모하는 구조인 점에서, 딥시크 모델은 기후 위기 시대의 혁신적 인공지능 모델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나는 묻고 싶다. 왜 딥시크의 혁신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못했는가? 아시아 IT 강국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딥시크를 낳은 중국의 산업통상정책과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주목한다. 그러면서 2006년 협상 시작 이래 20년간 한국 산업통상정책을 지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그저 단순한 FTA가 아니다. 그 체제에는 국가가 추진해도 되는 경제정책을 열거한 ‘유보목록’ 구조가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미국인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심지어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민간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영역이라고 판단되면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부인하는 국제법 장치이다. 나는 이것이 지난 20년간 한국의 산업정책을 실종시킨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본다. 한·미 FTA는 지난 20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였다.
딥시크는 중국의 일관된 산업정책의 성공이다. 리커창 전 총리는 2014년에 26조원의 1차 반도체 빅 펀드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2015년, 10년 국가 계획으로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였다. 중국을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었다. 2021년에는 중국에 1만명의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만인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창진 교수가 2015년, SBS 방송 인터뷰에서 주장하였듯이 이미 중국은 모방의 나라를 넘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나라로 진화해 가고 있었다. 마침내 리커창 전 총리는 2017년에, 중국에서 매일 4000개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제 중국 경제는 국가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경제가 아니다.
개방은 필요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무능한 개방이 IMF 사태를 불러왔듯 개방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한·미 FTA 체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외 개방의 통상정책은 산업정책이 국경 바깥으로 나가면서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딥시크에서 알 수 있듯이, 뛰어난 인재가 의대가 아닌 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산업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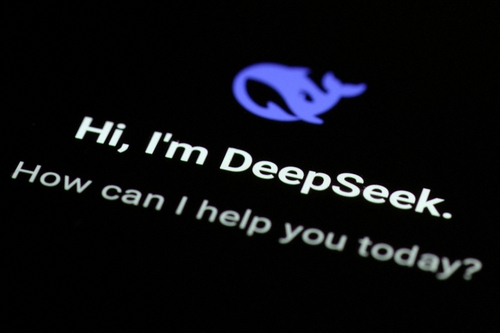
![[기고] 중국 휴머노이드 정책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0829105660.jpg)
![[에듀플러스]<기고>사이버대 글로벌 추진,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시작](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0/news-p.v1.20250210.e690b07ce33b48e19e82eab60d523258_P3.jpg)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 28개…오픈소스 AI 바람 확산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2QGRK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