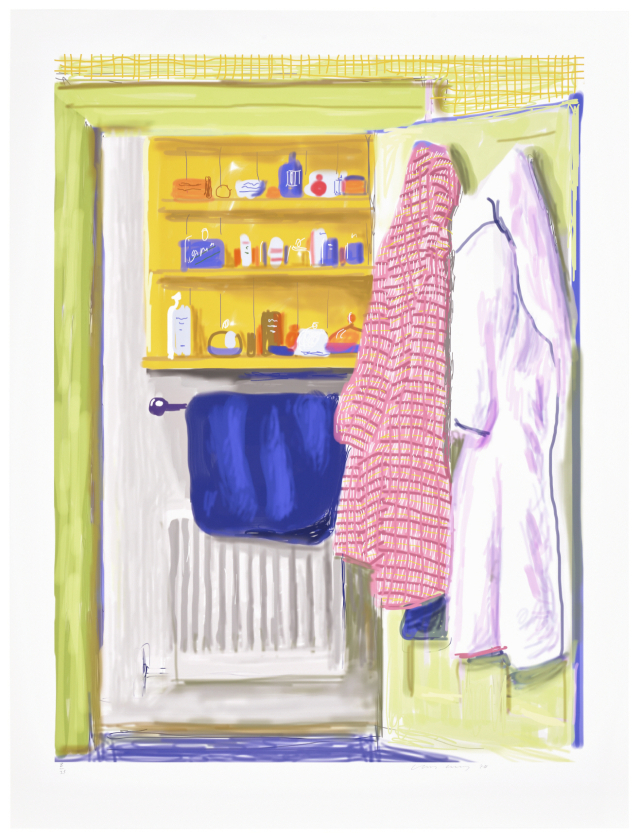예술과 자본의 알고리즘이 가장 극명하게 작용하는 예술 동네는 어디일까? 바로 미술계가 아닐까. 흔히들 미술을 ‘자본의 꽃’이라 미화하는데, 냉·온탕을 넘나들기는 다른 영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유난히 돈의 논리가 많이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는 대중의 기호와 작품의 가격에 따라 그 층위가 결정되곤 한다. 셀럽처럼 대중이 열광하는 작가와 작품이 있는가 하면, 혼을 담아 만들어도 돈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작품도 있다. 그 자본의 신화가 가장 들끓는 곳이 바로 아트페어이다.
사회축제가 돼버린 아트페어
미술의 확장은 기쁜 일이지만
돈·유행 좇는 세태 우려스러워

지난주는 ‘서울아트위크(Seoul Art Week)’라는 말대로, 도시 곳곳의 전시와 프리즈 및 키아프 등 국제아트페어가 열려, 한바탕 ‘축제의 열병’을 치른 듯하다. 미술관·갤러리뿐 아니라 대중이 대거 몰려든 이 현장에서, 미술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이 깨진 것을 실감했다. 현장 집계된 7만(프리즈), 8만(키아프) 단위의 관람객 숫자는 아트페어가 하나의 사회적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변화를 갖는 게 우리 사회의 속성이라지만, 페어와 전시에 대한 최근 고조된 대중의 열기는 놀랍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에 따를 때, 미술의 자본에는 경제자본뿐 아니라 문화자본 및 상징자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예컨대 아트페어에서 환영받는 이들은 당연히 경제자본의 주역인 부유층이지만, 중요하게 개입하는 기획자나 이론가는 문화자본을, 또 셀럽이나 파워블로거의 경우 대중적 명성으로 인한 상징자본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자본들끼리 상호 전환되기도 한다.
VIP 초대를 받아 전시 오픈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미술작품의 관람뿐 아니라 전시의 경험 자체를 즐긴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SNS에 올리려 ‘엣지 있는’ 사진을 뽑아낸다. 아트페어에서는 화려한 차림의 블로거들이 환한 빛을 쏴대는 카메라맨과 함께 이 ‘핫한’ 기회에 발 빠르게 움직인다. 언론도 한몫을 한다. 이번 페어의 최고가가 무려 얼마라는 소식과 함께, 상종가의 작품들이 속한 메가급 갤러리들은 SNS에 회자되며 명성과 권위를 누린다. 또 어느 셀럽이 와서 뭘 구입했는데 그 작가의 작업은 없어서 못 판다는 등 유명세로 가득한 정보와 머니게임의 자극적 뉴스는 대중을 부추기고, 유명인이 찜한 작품 앞에는 핸드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몰려 지나가기도 힘들다. 한마디로 롤랑 바르트가 비꼰 온갖 ‘신화(myth)’로 가득한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부르디외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작품을 감상·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미적 취향의 소비가 아니라, 세련된 삶의 양식과 예술적 교양을 드러내는 자본의 축적 방식이다. 나아가 VIP 프리뷰, SNS 인증, 셀럽의 흔적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상징자본으로 전화(轉化)되어 개인의 계급적 입지를 재구성하게 만든다. 이는 왜 사람들이 최근에 물적 소유뿐 아니라 경험의 향유에 쏠리는가를 설명해 준다. 이는 개인의 경험이 상품화되는 것인데, 경험 자체가 물적 자산을 대치하는 셈이고, 문화자본이 빠르게 경제자본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사회적 위신과 네트워크 등 상징자본을 획득하여 계급 상승에 성공한다.
미술의 위계와 권력 구조가 개방되며 미술이 더 넓은 사회로 확장되는 현상은 환영할 일이다. 이는 문화자본의 개방적 유통 구조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변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적 요소도 뚜렷하다. 특권층의 초대나 전시의 오픈 현장처럼 예술 경험이 사회적 위신과 직결된 경우, 바로 셀럽 팔로잉이나 트렌드 좇기 등 ‘모방 취향(imitative taste)’과 연결되어 미술작품의 본질이 상품화 및 피상화되는 현상이다.
오늘날 도시 전체가 갤러리가 되고, 누구나 미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경험’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 없이는 미술의 공론장이 자칫 돈과 유행을 좇는 저급한 자본주의로 격하되는 위험도 크다. 미적 체험의 진정성 저하, 주체성 상실 및 내적 성찰의 결핍, 과시욕의 과잉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아트페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상징자본의 계급적 변동을 긍정적 변화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이다.
전영백 홍익대 교수 미술사·시각철학

![[사진 한 잔] 발레니스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9/13/0b2c893e-fbce-447b-af70-ab372a40205e.jpg)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 '렛뎀 이론' 2위](https://newsimg.sedaily.com/2025/09/12/2GXVHZQ675_1.jpg)
![[李대통령 취임 100일] "K문화 역량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박진영 역할 기대"](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0184384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