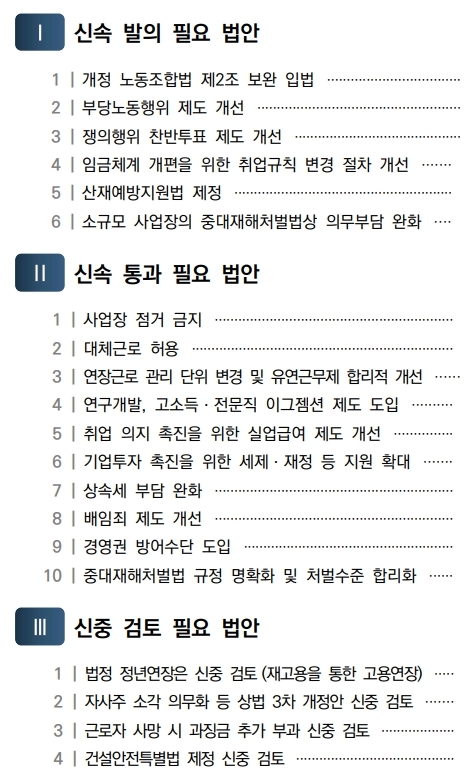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8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로 했다가 논의가 지연되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악화일로에 있는 노인빈곤 문제,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금처럼 2033년이 되면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5년으로 벌어져 ‘소득 공백’ 기간도 늘어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 은퇴자의 고용 안정과 숙련된 노동력 활용, 연금 운용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종합적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부담도 증가시켜 세대·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또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겐 정년 연장 혜택이 ‘그림의 떡’이 되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 체계를 재편하는 ‘직무급제’ 도입도 주요 쟁점이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자의 은퇴 시기를 늦출지 말지 결정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와 노사를 아울러 일자리·복지·노동 개혁이 뒷받침된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공론 과정에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구조도 확대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성숙한 합의·설계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렸다가는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년연장, 노사 분쟁 불씨 안되려면…임금피크제 개편이 관건"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TRYK0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