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 차별

가난이 서러울까, 차별이 서러울까? 절대 빈곤을 경험한 세대는 가난이 서럽다고 하겠지만, 긴 역사 속에서는 차별이 더 서럽다. 따지고 보면 가난이란 것도 반대편에 부자가 있기에 생겨나는 것이고, 배고픔도 실은 가난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겠는가. 아주 오래전, 신석기시대에는 모두가 가난했지만 누구도 가난을 서럽게 여기지 않았을 터이다. 우리 역사에서 차별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청동기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경제력이 상승함에 따라 잉여가 생기고, 사유 재산이 생기고, 빈부 차이가 생기고, 그로부터 신분이 발생했다. 이후의 역사는 신분 차별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의 궤적이기도 하다.
공주 명학소 망이·망소이 봉기
현으로 승격시켜 주자 진정
신라 골품제 대체 새로운 차별
의무 많고 결혼·이주 자유 없어
신분 차별 적은 군현 500개뿐
조선의 부곡 폐지는 역사 발전

신분은 귀속적(歸屬的)인 속성이 있다고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양반이면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고, 천민이면 천민이 된다. 나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정해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굴레가 된다. 억지로 굴레에 갇힌 마소가 살아서는 빠져나올 수 없듯이 여간해서는 자기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어나 눈떠 보니 천민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를 그렇게 만났을 뿐인데 말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 억울함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진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
신분은 크게 자유민인 양인(良人)과 비자유민인 천민(賤民)으로 나뉜다. 양·천의 구분은 신분제도가 소멸하는 19세기 말까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양인 내부의 구성은 시대마다 달랐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 골품제는 서울 사는 양인만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였다. 천민은 물론 서울 이외 지역에 사는 양인은 어떤 골품에도 속하지 못했다. 골품 안에서는 진골·6두품·5두품·4두품 사이의 차별이 엄격했다. 제2신분인 6두품조차 관리가 되어서는 승진에 제한이 있었고, 중앙 관청의 장관은 될 수 없었다. 집을 지어도 방의 크기가 사방 21척을 넘지 못하고, 담장 높이가 8척을 넘지 못했으며, 집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사용하면 안 되었다. 6두품이 그랬으니 5두품 이하는 더 차별받았고, 골품 밖에 있던 지방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신라는 진골의 나라였다.
골품 들지 못한 지방민이 세운 나라

고려는 골품에 들지 못하던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다. 이들은 건국하자마자 골품제를 없애버렸다. 골품제 폐지는 고려 건국의 역사적 의미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중대 사건이었다. 이로써 지배층 내의 촘촘한 차별이 사라졌다. 하지만 신분제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신분제가 만들어졌다.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가담한 지방의 세력가들은 모두 지배층으로서 ‘정호(丁戶)’라는 이름을 받았고,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지배층은 ‘백정(白丁)’이라고 불렸다. 정호와 백정은 모두 양인이고, 그 아래에 천민이 있었다. 정호 가운데는 고향에 남아 향리가 된 사람도 있고, 서울로 올라가 관리가 된 사람도 있었다. 관리가 된 뒤 자손 대대로 고위 관직에 올라 문벌귀족이 되기도 했다. 향리에서 출발해서 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향리와 관리·귀족이 모두 정호 신분에 속했던 것이다. 보통 사람은 백정이라고 불렸다. 조선에서는 소나 개, 돼지를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고 천대했지만, 고려에서는 달랐다. 대신, 조선에서 보통 사람을 가리키던 백성(百姓)은 고려에서는 정호의 다른 이름이었다. 고려는 확실히 조선과 다른 500년이었다.
고려의 신분제는 정호-백정-천민의 차별로 끝나지 않았다. 고려에는 부곡(部曲)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고, 부곡의 정호는 정호대로, 백정은 백정대로 일반 군현의 정호·백정에 비해 차별받았다. 전에는 부곡 주민을 집단천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부곡에도 정호와 백정이 있고 천민도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모두가 천민일 수 없다. 또 부곡에 살아도 세금 내고 군대에 가는 의무를 졌다. 일반 군현 사람들보다 낮은 대우를 받으면 천민이라는 상대적 정의가 아니라, 국가에 의무를 지면 양인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따르면 부곡의 정호·백정은 엄연한 양인이었다. 다만 차별받은 양인이었다.
부곡 출신 유청신 특혜 거듭 정승 올라

고려시대에 부곡 출신의 유명인으로 유청신(柳淸臣)이 있다. 원 간섭기에 몽골어를 잘해서 역관으로 출세한 사람이다. 그의 고향은 고이부곡(高伊部曲)으로, 조상들은 대대로 그곳의 부곡리(部曲吏·부곡의 향리)를 지냈다. 부곡리는 관리가 되어도 5품 이상 승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유청신은 3품까지 승진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뒤에 또 한 번 승진 제한이 풀려 정승까지 올랐고, 부곡 출신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그의 출세는 거꾸로 부곡 정호에 대한 차별의 존재를 증명한다. 두 번씩이나 예외적인 특혜를 받아야만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부곡의 정호는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다. 그럼 부곡의 백정은 어땠을까?

부곡과 동급의 행정구역으로 향(鄕)·소(所)·진(津)·역(驛)·장(莊)·처(處)가 있었다. 이 가운데 ‘처’가 행정구역 이름으로는 다소 생소하지만, 지금의 서울 용산이 고려시대에 용산처(龍山處)였다. 1284년(충렬왕 10년) 과주(지금 과천)에 딸려 있던 용산처를 부원현으로 승격시켰다는 『고려사』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부곡 등에 사는 백정은 일반 군현의 백정보다 더 많은 의무를 졌다. 한 예로 ‘소’는 특정 물품의 생산지에 설치되었는데, 철소(鐵所) 주민은 철 생산, 염소(鹽所)는 소금 생산, 도자소(陶磁所)는 도자기 만들기, 탄소(炭所)는 숯 만들기에 동원되었다. 향과 부곡 주민은 국유지를 경작했고, 진과 역은 주요 교통로 상의 나루와 역을 관리했으며, 장과 처에서는 왕실과 사원의 토지를 경작했다. 모두 백정 신분으로서 세금 내고 군대 가는 의무를 다하면서 추가로 이 일을 했으니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부르는 이름조차 백정과 차별해서 잡척(雜尺)이라고 했다.
고려에는 약 1400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다. 조선의 군현(郡縣)이 330개 정도이고, 그 후신이랄 수 있는 현재의 시·군·구가 남한에만 226개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수였다. 그 1400개 가운데 500개 정도가 군현이고 900개는 부곡·향·소·진·역·장·처였다. 이쯤 되면 부곡에 대한 차별은 일부 소수에 국한되지 않고 백정 신분 내부의 광범한 차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거주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면 이사를 하면 되지 않나? 고려는 이주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였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부곡에서 일반 군현으로의 상승 이주는 불가능했다.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도 금지되었다. 군현민과 부곡민의 결혼을 막지는 못하지만 혼인 후 부곡에 살게 하고 자식들을 부곡민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금지했다.
정도전 부곡으로 유배, 위민정치가로
고려 초에 부곡이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같은 정호, 같은 백정인데 200년 넘게 차별을 받는다면 마냥 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침 무신정변이 일어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민란이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부곡민들의 불만도 폭발했다.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봉기가 대표 사례이다.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자 민란이 잦아든 것을 보면 소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음이 분명하다. 12세기 후반 민란의 시대를 거치면서 부곡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려 말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서 1375년 정도전이 유배 간 곳도 전라도 나주에 속한 거평부곡이었다. 그곳에서 부곡민들과 어울리면서 ‘위민(爲民)’의 정치사상가로 거듭났다. 부곡이 급격히 준 것은 조선이 건국된 뒤였다. 조선 왕조는 행정제도를 개편해서 부곡을 없애 갔고, 15세기가 되면 13개 정도만 남았다. 한창때 900개나 되던 부곡의 소멸은 부곡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골품제 폐지에 이어 차별을 없앤 또 하나의 발전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그러나 반드시 발전한다. 짧은 사람의 생애로는 목격할 수 없지만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이익주 역사학자·서울시립대 교수

![[3/31(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정국 기상대] 등](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77963_1479099_m_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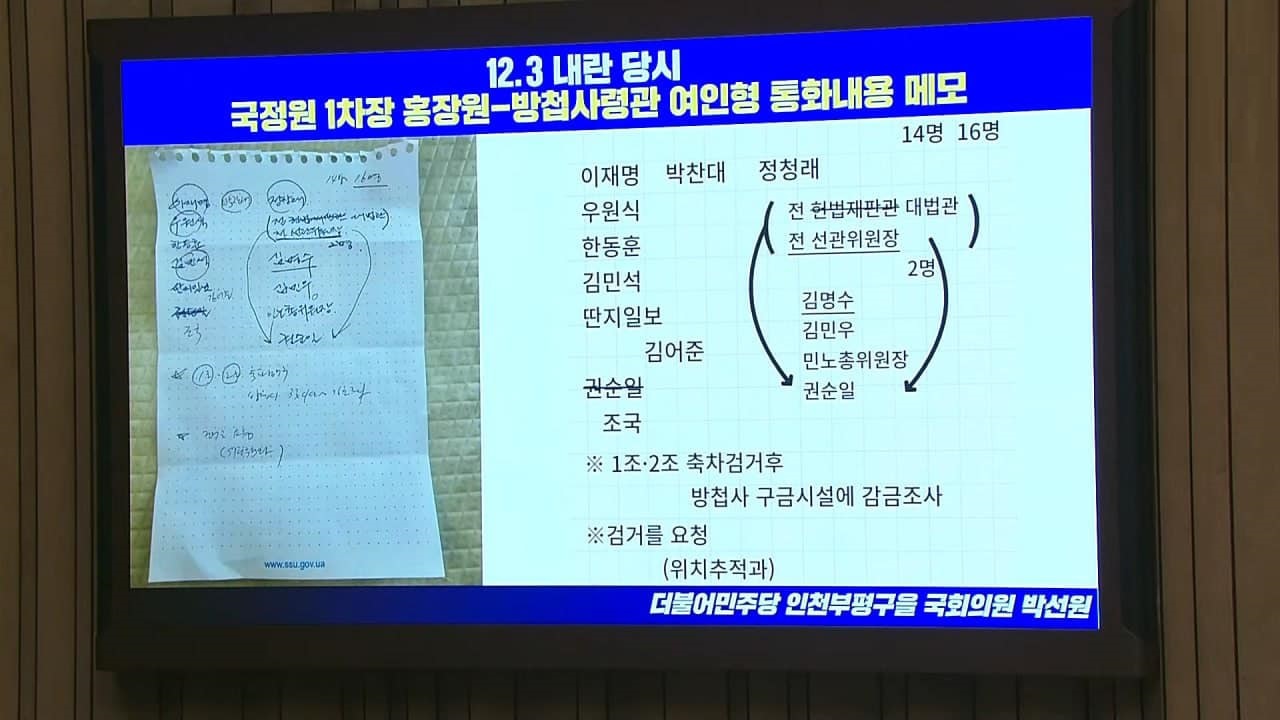
![[우리말 바루기] ‘이 자리를 빌려’, 자연스러운 표현?](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기고]케이블TV 도입 30주년,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4/news-p.v1.20250324.d8f3773e57ee4968998de0521abcfb39_P3.jpg)
![이재명 무죄가 소환한 ‘파기자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9/2025032950497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