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는 유럽의 경제 강국이었다. 20년전인 2005년만 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470달러로 독일(3만5730달러)과 어깨를 견줬다. 하지만 최근엔 독일 5만4800달러(2023년 기준), 이탈리아 3만7920달러로 양국의 격차는 약 1만7000달러로 벌어졌다. 2007년 4만 달러, 2021년 5만 달러의 벽을 넘은 독일과 달리 이탈리아는 약 20년간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과잉 복지에 따른 재정 악화, 유럽 최고의 고령화,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이 얽히면서 이탈리아의 구조적 저성장을 만들어냈다. 1960~70년대 성장기에 설계된 복지 혜택은 고령층에 집중됐고,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카르텔을 쌓아 독점했다. 노후·실업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이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5.1%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30%를 넘는다.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인프라 및 산업 지원에 쓰일 돈이 복지로 나가면서 투자는 위축됐고 일자리는 감소했다. 4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견디다 못한 청년들은 해마다 4만 명씩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
양국 격차 지금은 1.7만 달러
포퓰리즘과 국가부채의 폐해
규제 혁파, 구조개혁 서둘러야
경제 성장률은 0~1%대를 맴돌았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을 졌다.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권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렸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2008년 106.1%에서 2023년 137.3%까지 치솟았다. 유로 지역에선 그리스(160.3%) 다음으로 높다. 돈 풀기 정책이 부채를 키우고 이는 성장을 낮추면서 다시 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독일은 다른 길을 걸었다. 사실 일본에 이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가 이탈리아와 독일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에 대비해 청년과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부채비율이 82.4%까지 높아졌지만, 메르켈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도로 20%포인트 이상 줄였다. 독일에선 좌·우 정권을 불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한국은 1인당 GNI가 2017년 이후 8년째 3만 달러대에서 맴돌고 있다. 올해도 1%대 저성장으로 4만 달러대 진입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한국은 독일이 아닌, 이탈리아가 발을 디딘 곳으로 향하고 있어 안타깝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여야 정치권은 선심성 감세·복지 공약 경쟁을 펼친다. 대선 경쟁을 대비한 표심 잡기가 목적이다. 여야가 공식화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액만 연간 10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은 없다.
가뜩이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복지비용을 감당하려면 더 늦기 전에 GNI를 키워야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제 1%대로 떨어졌다. 모자라는 복지 예산은 나랏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책평가연구원(PERI)의 분석에 따르면 세금 등 수입의 변화 없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지금보다 20% 증가하는 경우 30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이 202%까지 상승한다.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 고용까지, 이탈리아의 ‘데자뷔’다.
이탈리아·독일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3만 달러 대에 오른 영국·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 등은 2~3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어 고도경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췄거나, 신생기업의 도전을 장려하거나, 과감한 구조개혁·혁신에 나선 국가들이다. 2017년 한국과 함께 3만 달러대였던 이스라엘의 1인당 GNI는 이제 5만5000달러에 육박한다.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세계 1위다. 반면 한때 우리를 앞섰던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 등의 1인당 GNI는 이제 한국에 못 미친다. 높은 국가 부채비율, 낮은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직성, 불안한 정치·사회 등이 공통분모로 꼽힌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없애고,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0.4%포인트 내리면서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과 정부를 겨냥한 말로 들린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제 득표나 지지율이 아닌 한국의 미래 생존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기고]케이블TV 도입 30주년,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4/news-p.v1.20250324.d8f3773e57ee4968998de0521abcfb39_P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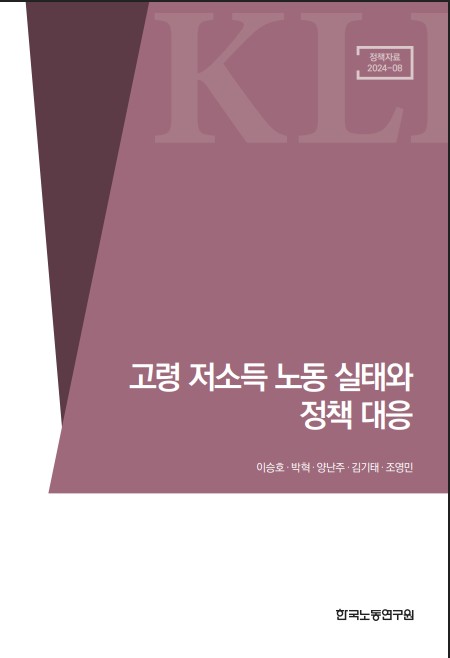
![[해외칼럼]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국판 문화혁명](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5R07KP_1.jpg)

![트럼프 관세 美 물가 끌어올리나… BofA CEO “올해 금리 인하 없을 듯” [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MM825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