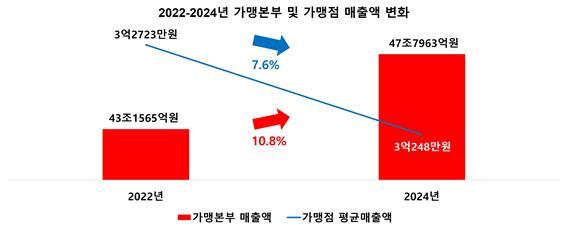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1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은 강남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약세가 이어지며 부동산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수도권이 152.0, 지방이 105.2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100)을 기준으로 비교해 산출한 수치다. 수도권 지수는 지방 대비 1.445배로, 2008년 8월(1.455배) 이후 가장 높다. 수도권 집값이 지방보다 45% 넘게 비싸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서울 지역 실거래가격지수는 183.8로, 지방의 1.7배가 넘는다.
이같은 격차는 2008~2009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확대됐다가, 경기 침체와 조정기를 겪으며 완화됐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강화한 2018년을 기점으로 집값은 다시 벌어졌다. 코로나19 유행 후반부인 2020년부터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다시 1.2배 이상 차이가 났고, 올해 들어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지 수요와 맞물리며 수도권 집값은 지방의 1.4배를 넘어섰다.

앞서 KB부동산 조사에도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ㆍ하위 20% 격차(5분위 배율)는 12.1배로 나타났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한 채 값으로, 경북 김천 ‘신한양’ 아파트를 100채 넘게 살 수 있는 셈이다.
집값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ㆍ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 규제가 본격화됐다. 한국경제학회에 발표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연구(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평균 0.912% 상승했지만, 지방은 0.075% 떨어졌다. 이 교수는 “주택 경기의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여건과 각종 정책의 변화에 기인하지만, 어느 변수보다도 다주택자 규제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인구 집중 등 구조적 요인과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질렀고, 최근 53%까지 확대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7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핵심지와 지방 거점을 동시에 육성하는 다핵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여건에 맞게 도시를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별로 다른 금융·세제·규제 설계를 담은 종합 패키지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청약 당첨자 5명 중 4명은 40대 이하[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L21WJ_1.jpg)
![[기자수첩] 지금 '영끌'로 집 사면 안되나요](https://img.newspim.com/news/2025/07/14/2507141431473460_w.jpg)
![[GAM] 미국 주택건설주 나흘 10% 급락…트럼프 '건설 독촉' 압박](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