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빠지기 쉬운 유형은
정체성 확인하고 소속감 느끼려 수용
직관 맹신·지적 겸손 부족한 경향 보여
4·16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 사건이 터지면 갖가지 음모론이 확산했다. 음모론은 특정 이슈에 대해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과 갈등이 음모론의 자양분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음모론에 더 쉽게 빠지는 것일까.
15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믿는 경향이 있다”면서 “종교와 같이 신념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봤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음모론을 수용한다는 설명이다.

조화순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와 이병재 연대 연구교수가 지난해 현대정치연구에 게재한 ‘음모론 신뢰의 결정 요인’ 논문은 정치 양극화, 인터넷 미디어 소비, 정부에 대한 신뢰 등 3가지 요소가 음모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부정선거론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튜브, 팟캐스트 등 인터넷 매체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는 저서 ‘미스빌리프’에서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일수록 음모론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사안에서 음모론은 비교적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르시시즘(자기애) 성향도 음모론 수용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을 맹신하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지적 겸손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음모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식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자정 능력이 생긴다”며 “비판적 사고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양 교육이 음모론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사안과 인물을 분리하고, 말과 감정을 분리하는 ‘분리의 연습’을 통해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예림·안승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코로나 백신 바꿔치기’ 주장처럼… 적 만들어 집단결속 강화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676.jpg)
![[중앙칼럼] ‘극우’ 남발, 언론이 문제다](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5/40c78e44-40b4-465b-82e2-0896ce787334.jpg)
![[단독] 3만여 디시 게시물 분석…“과학적 주제가 정치 영역과 결합하며 ‘그럴법한 이야기’ 만들어”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48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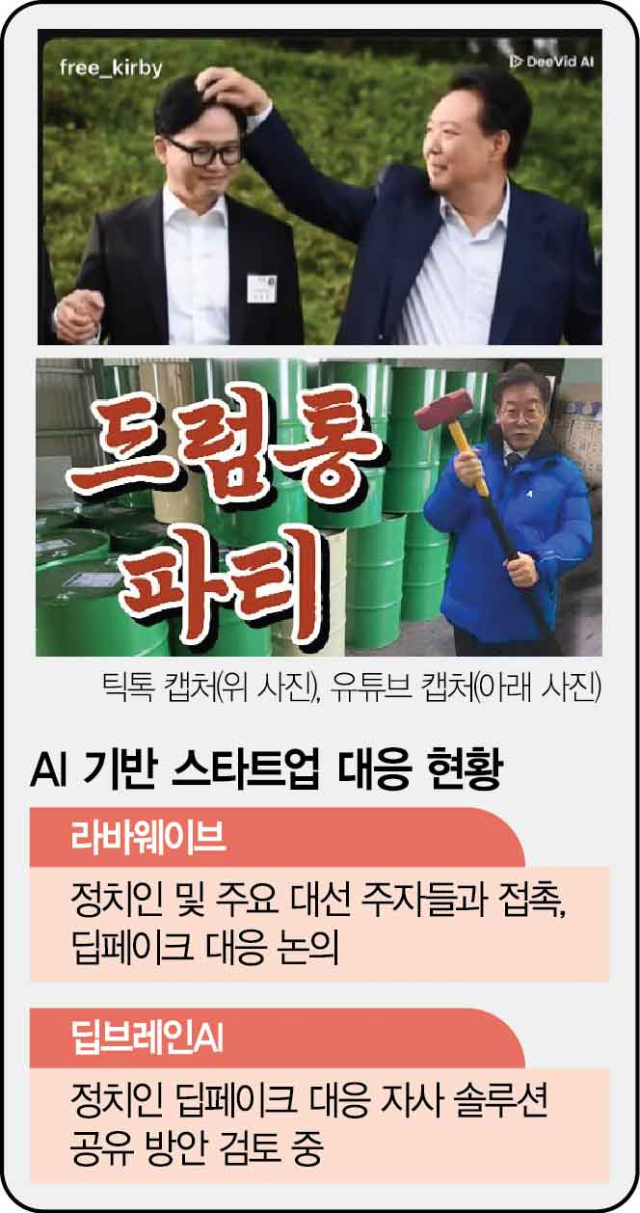
![“난 이기고 온 거니 걱정말라” 尹, 파면당하고도 이랬던 내막 [尹의 1060일 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a8031664-4eda-4983-8825-0c1f1725729a.jpg)
![[단독] 음모론 확산지 ‘디시’엔 테러·암살 어휘 빈번 [심층기획-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202504145175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