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릴 적에는 말을 너무 더듬어서 별명이 ‘반벙어리’였어요. 국어 시간이 제일 괴로웠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세계적 구강암 연구자이자 18년간 미국 UCLA 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UCLA 100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학장직을 수행한 박노희 UCLA 명예 학장이 최근 자서전 ‘당신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영어명 Turning Points: Moments That Shaped Me)를 펴냈다. 책에는 성공담보다, 실패와 시련, 이를 딛고 일어선 과정이 세밀히 기록돼 있다.
박 학장은 “삶의 전환점은 언제나 위기에서 시작됐다”며 운을 뗐다. 충북 단양의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던 그는 학창시절 말을 더듬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국어 시간에 책을 읽으라 지명받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 친구들의 웃음은 상처로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대표로 라디오 방송에 나가 노래를 부른 경험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됐다. 박 학장은 “말은 더듬는데 노래할 때만은 안 그랬다. 그날 이후로 약점을 숨기지 말고 극복하자고 마음먹었다”고 회고했다. 훗날 하버드대 시절, 말을 더듬으면서도 당당히 강의하는 예일 의대 교수를 보면서도 그는 약점은 부끄러움이 아닌, 극복의 출발점임을 깨달았다.
어린 딸과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시절은 ‘편견과 의심’과의 사투였다. 박 학장은 “실험이 끝나면 백인 교수가 개똥을 치우라고 시켰다. 너무 치사하고 억울해서 아내에게 ‘내일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썼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연구에 몰두했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이어갔다. UCLA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7000만 달러가 넘는 연구비를 유치하며 손꼽히는 연구자로 성장했다.

UCLA 치대 학장 시절 그의 활약은 더욱 돋보였다. 학장으로 임명될 당시 학교는 150만 달러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1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다. 이후 UCLA 치과대학을 미국 내 가장 재정이 건전한 단과대학으로 만들기도 했다. 또 재정 개혁뿐 아니라 석좌교수 제도와 교수평가 체계 개편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때론 ‘과격한 리더’라는 비판도 따랐지만, 그는 UCLA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다. 박 학장은 “불필요한 인력은 정리하고 수익 구조를 바꿨다. 학장은 학자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매니저여야 한다는 걸 절감했다”며 “한정된 자원을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 인생도 위기 속에서 피어났다. 바이러스와 암의 연관성을 연구하던 시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학회에 하루 늦게 도착한 것이 전환점이었다. 그 영감은 세포주기(cell cycle) 연구로 이어졌고, 다단계 암 발생의 기전을 규명하는 세계적 성과로 발전했다. 최근 그는 GV1001 기반의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박 학장은 “새로운 걸 개척하지 않으면 연구는 멈춘다. 옛 주제만 붙드는 건 퇴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그의 자서전 출판 기념식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해 그의 삶의 여정을 축하했다. 그는 이번 자서전을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헌사’라고 표현했다. 그를 여기까지 이끈 힘은 무엇인가 돌아보니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 박 학장은 “인생의 전환점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인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로 ‘사람과 인연’을 강조한 그는 한국의 치과계 후배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박 학장은 “치과의 본질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경제적 성취보다 진정성 있는 진료가 결국 치과의사의 가치를 결정한다. 연구와 학문적 발전에도 꾸준히 힘써야 한다. 후배들이 경쟁자가 아닌 새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동료 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끝으로 한국 치과계 전체가 협력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적 기여를 바라보며 길을 걷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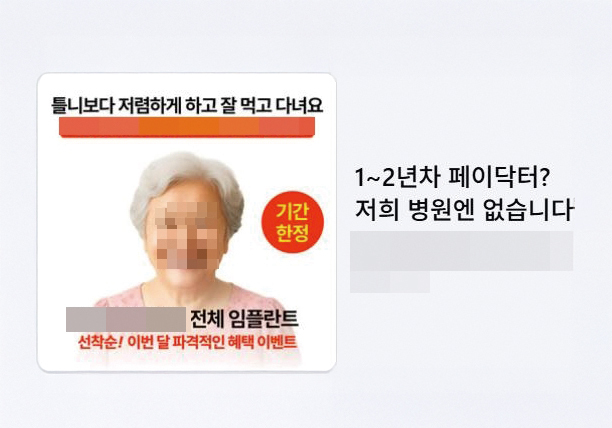



 괜찮은 어른이 된다는 것](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0/1532619_729691_4658.jpg)

![[전문가 칼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099031849_c6802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