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21.4% 증가한 약 3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16.6% 삭감했던 것에 비하면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기초연구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점화, 이공계 인재 양성 등 혁신 R&D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남게 됐다.
홍원화(62)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R&D 현장에서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과제 선정과 성과 측정 등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술 패권 시대 R&D 증가에 맞춰 체계적 성과 관리와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재단에서 연간 약 10조 원의 R&D 자금을 대학 등에 지원한다”며 “하지만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의 지식재산권(IP), 즉 특허와 기술이 기업과 연계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말부터 3년 임기의 연구재단 이사장을 맡아 R&D 성과 관리와 기술 사업화를 강조해왔다.

홍 이사장은 정부가 최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과제 목표의 혁신성, 연구지원시스템(IRIS)과 R&D 기관 간 시스템 연동, 연구 장비 공동 활용 확대 등 정책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효과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현장의 연구원들은 물론 지원기관 실무 책임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리더급 국가과학자(20명)’와 ‘젊은 국가과학자(수백 명)’ 선정을 비롯, 이공계 대학생·석박사·박사후연구원과 정년 이후 석학 지원, 해외 과학자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연연에 대한 족쇄로 꼽혀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와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R&D 과제의 평가 등급 폐지, 일부 과제 기간 연장 및 ‘3책5공(3개 과제 책임, 5개 과제 공동 수행)’ 예외 적용, 연차보고서 간소화 등 행정 부담 완화에도 팔을 걷어붙일 방침이다.

홍 이사장은 이 중 정부가 전체 평가 위원 5만 7000명 중 10% 우수 위원 확보와 평가 실명제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연구재단에 들어오는 연구 과제 희망 건수는 연간 최대 6만여 개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만 2만 5000여 개에 달할 것”이라며 “평가비가 부족해 우수 평가자를 모시기 힘들어 과제 선정에서 질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정부는 지난해 1억 원 이하의 기초연구 과제를 없앴던 것에서 벗어나 내년 기초연구 분야에서만 1만 5000개의 과제 수를 유지하고 신진 연구 과제 수도 3500여 개 규모로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명예교수의 대학 시설 이용과 강의료 수령 지원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젊은 연구자에게 줄 돈도 부족한데 시니어한테 주느냐’는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노장청이 어우러지는 연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에서 우수 시니어 연구자들을 위해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공동실험실을 만들거나 대학별로 확보하고 있는 우수 장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연구의 자율성을 들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맘껏 해보라’고 강조하는데 옳은 말씀이지만 쉬운 과제는 결코 아닙니다. 실패의 기준을 잘 잡아야 해요. 기초연구 같은 보텀업이나 전략적인 톱다운 등 연구 과제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도전·모험형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홍 이사장은 연구 지원금에 대한 편익 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과 인문학 분야에서 각각 지원금 1억 원과 2000만 원당 SCI 논문과 학회지 한 편 게재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논문 임팩트 팩터(IF)는 물론 이제는 특허권과 기술실시권도 성과 지표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이른바 기업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장농특허’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가 매달 연구재단의 8개 본부 책임자들과 함께 ‘공평하게 뿌려준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등 성과 빅데이터 관리를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 이사장은 “연구재단은 기초연구 지원 중심이라 그동안 산업화 개념이 별로 없었다”며 “올 초 NRF TCC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67개 대학의 1만 5000여 개 국가전략 분야 기술을 수요자와 공유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의 기술 이전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올 들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 등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커넥트 데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학의 기술 사업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미 6월과 이달 각각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와 로봇 특구를 지향하는 경기도 화성시와 안산시에서 지방정부 등과 함께 행사를 연 데 이어 내년 중 판교에서 행사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산학연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제조업 등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자는 것이다.
한편 홍 이사장은 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해 “제조 현장에서 풀뿌리 장인을 기르기 위해서는 종합대학교 못지않게 전문대와 한국폴리텍대의 인력을 잘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나금융, 2027년까지 데이터 인재 3000명 양성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7C5VWN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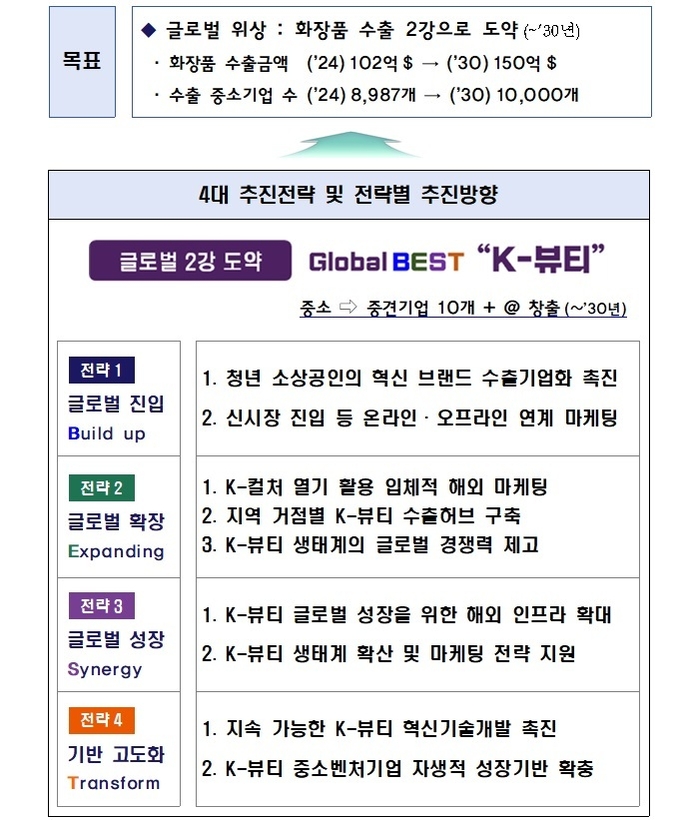

![[단독]기재부, 분야별 AI 선도기관 지정한다…공공기관 AI 모범사례 모은다[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Q0BNCR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