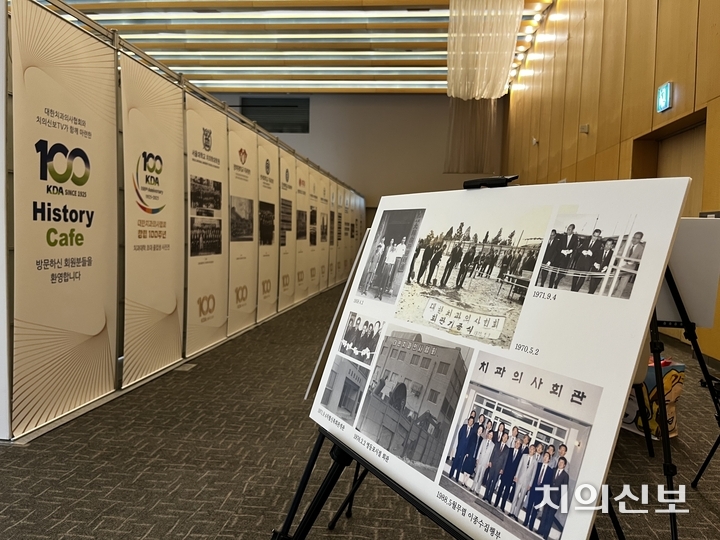사진(photograph)이라는 단어를 1839년 처음 만든 이는 영국의 과학자 ‘존 허셜’이었다. ‘빛(phos)으로 그린 그림(graphe)’이라는 뜻이다.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에서 파란색을 이용한 사진술 청사진 기법을 발명하기도 했다. 시아노타입이라고도 불리며 설계도 제작에 많이 쓰이게 됐다. 당대의 여성 식물학자 ‘안나 앳킨스’는 다양한 해조류의 모습을 청사진에 담았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처럼 파란 종이 위에 새겨진 ‘영국의 해조류(Photographs of British Algae)’(1843) 도감이다. 과학자의 식물도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청사진들이 펼쳐진다.
청사진은 카메라가 필요 없는 사진술이다. 구연산 철 암모늄과 적혈염을 바른 종이는 빛에 노출되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감광 현상을 이용했다. 감광 물질을 바른 종이에 어떤 물체를 놓으면 그 물체가 있던 자리는 빛에 반응하지 않고 하얀 흔적과 형체를 남겨 놓는다. 파란 도화지 위에 하얀 붓으로 그린 그림 같은 사진이다. 감광된 색이 파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인 사진술이 ‘포토그램(photogram)’이다.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가 ‘나즐로 모홀리 나기’가 포토그램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초현실주의자 ‘만 레이’는 포토그램이 자기만의 사진술인 양 ‘레이요그램(rayogram)’이라는 단어를 남겨 놓았다.
미술 평론가 ‘로잘란드 크라우스’에 따르면 포토그램은 “사진적인 것”의 본질만 유지한다. 사물을 크거나 작게 보이게 하는 렌즈를 사용하지 않기에 포토그램의 피사체는 실물 크기 그대로 복사된다. 피사체가 감광지에 직접 닿아야 하기에 촉각적인 느낌도 묻어 있다.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등 시간을 인위적으로 단락시키는 카메라 셔터막이 없기에 아날로그적인 시간의 감수성도 느껴진다.
오는 5월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KF갤러리에서 열리는 ‘로베르토 와르카야’의 <추상적 인식자>는 크기가 제법 큰 포토그램 작품들을 전시했다. 흑백의 포토그램과 청색의 사아노타입 뿐만 아니라 갈색의 ‘반 다이크’ 기법이 사용된 작품들이다.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안데스산맥을 거쳐 아마존의 숲에 이르는 페루의 풍경이 담겼다. 아마존의 숲은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태평양의 물고기는 사각형의 어항에 갇혀 있는 듯하며, 형체를 알 수 없는 빛의 입자와 파동이 반복된다. 무희들의 움직임은 형체가 허물어지고 춤에 대한 감각들이 종이 위에 남겨져 있다.





![[울산저널 TV 지상중계] 인문톡쇼 2화: 감은 눈](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12/p1065569216660378_804_thum.jpg)
![[사진 한 잔] 해마 빌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4/12/f8d45438-0d67-4920-b829-4c157d8772eb.jpg)
![[권오기의 문화기행] 압셍트](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10/p1065622156699578_706_thu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