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이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분기점에 들어섰습니다.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의 구조를 개편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임지와 파이낸셜타임스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AI 설계자들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지금은 AI에 대해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아닌 냉정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인공지능학회의 혁신적 AI 응용상을 네 차례 수상한 이 교수는 국내외 과학 저널에 AI에 관한 논문을 100편 이상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AI 전문가’다.
그는 2025년을 ‘AI 대중화의 원년’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적 진화가 당장 급격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전문가들은 현재 AI의 지능 수준이 아이큐(IQ) 148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굉장한 발전이지만 이 시점에서 정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기업이나 개인 등 사용자들이 AI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AI의 진보를 성능이 아니라 활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올해가 AI를 본격적으로 응용하는 시기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규모언어모델(LLM) 사용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라며 “앞으로 2~3년간 기술 발전이 정체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에 있어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AI의 무게중심이 챗봇과 생성형 서비스에서 ‘행동하는 AI’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는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물건을 사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형태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서는 단계가 될 수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상용화될지는 결국 그에 맞는 모델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기술보다 응용 설계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빅테크 간 AI 기술·서비스 경쟁 구도에 대해 “오픈AI의 챗GPT 이후 빅테크들이 앞다퉈 AI 모델을 내놓았지만 체감 성능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실리콘밸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세운 xAI의 ‘그록’ 최신 버전이 나오면 경쟁 구도는 선명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검색을 하지 않고 AI에 바로 답을 얻는 시대가 왔다”며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기반 기업의 수익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불거진 ‘AI 거품론’에 대해 이 교수는 역사적 비교를 꺼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장비 기업 시스코가 시가총액 1위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것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같은 서비스 기업이었다”며 “AI 역시 아직 ‘AI에 최적화된 기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약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최적화된 기기로 자리 잡기까지 15년 정도 걸렸다”며 “AI에 맞는 하드웨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로봇일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기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AI 경쟁력에 대해 이 교수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규제를 큰 변수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에 강한 나라이며 지금은 분명한 기회의 시기”라면서 “다만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품도, 마법도 아닌 ‘도구’인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이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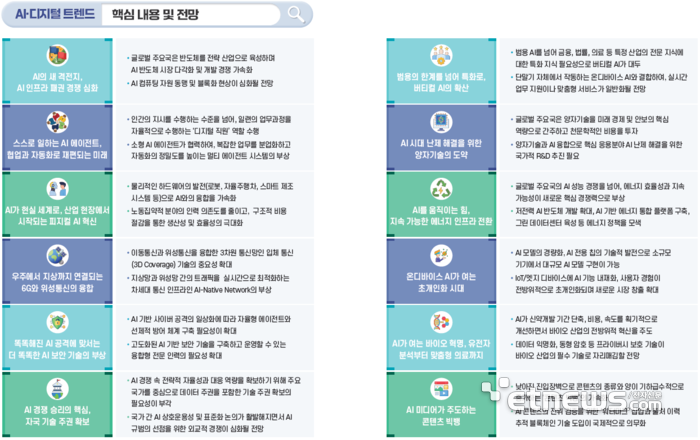



![[outlook] 호모 사피엔스의 종언? 인간과 AI, 공존이냐 종속이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1/ef0cdf43-cead-421d-89c2-8fbf23a154b9.jpg)

![[열린송현] ‘한영 AI 동맹’을 위한 골든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YF7MG0_1.png)
![[2026 키워드] AI 투자 확대한 게임사들…신작서 기술 엿본다](https://img.newspim.com/news/2025/12/15/25121514403692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