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전유성이 별세한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미담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필자 또한 인연이랄 것은 아니지만 남원의 미술관에서 근무할 때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었다. 그는 한여름에 시원한 모시 셔츠를 입고 미술관에 오셨는데 전시를 모두 보시고는 “자네 약주 하나? 언제 한 번 저녁에 만나”라고 하셨다. 전시 도록을 몇 권 챙겨 드렸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이 더위에 뭘 이렇게 무거운 걸…….”이라며 특유의 입담으로 주위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던 기억. 그때 인연을 잇지 못해 아쉽다. 그리고 그는 ‘웃지마. 너도 곧 와’라는 묘비명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사람은 누구나 짧은 인생을 살다 간다. 전유성과 관련된 에피소드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나건만,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인기와 출세를 위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달을 부린다. 매일 SNS 주위를 맴돌거나,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눈도장 받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정치계, 연예계, 미술계는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 오죽하면 ‘무플보다 악플’, ‘자기 부고만 아니라면 어떤 성격의 기사라도 보도되는 것이 좋다’라고 했을까.
올여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스웨덴 출신의 여성 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의 국내 첫 회고전이 생각났다. 그녀는 평생 자신만의 방법으로 영혼, 감정, 우주를 그림이라는 조형적 언어로 표현했다. 이 그림들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그림이라고 폄훼당했다. 당연할 수도 있다. 그녀는 추상회화의 선구자인 칸딘스키나 말레비치보다 앞서 추상화를 그린 화가였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있다. 그녀가 여성화가였다는 점, 유럽 미술의 중심지인 파리나 런던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당장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사후 20년이 지났을 때 그림들을 공개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평생 그림에 몸바친 자신의 인생을 후대 사람들의 평가에 맡긴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추상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로 인정받는다.
자신의 그림을 미래의 세대에게 맡긴 또 다른 화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스스로 ‘그림을 좋아하는 병’이 있다고 말한 관아재 조영석(1686~1761). 그는 조선시대 양반이었다. 그런데 타고난 그림 솜씨로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인물화를 잘 그렸다. 진경산수화로 잘 알려진 겸재 정선에게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정교하게 그리는 것은 그대보다 내가 낫다’라고 자부할 정도였다. 그러나 선비로서 그림 같은 잡기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영조가 어진 제작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으나, ‘한낱 기예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며 거절해 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조영석이 조선시대 미술사에서 특히 주목받는 영역은 ‘속화’이다. 서민들의 삶을 화폭에 담았다. 바느질 하는 여인들, 웃통을 벗고 목기 깎는 남성들, 말에 징 박는 모습, 새참 먹는 농부 등 양반으로서 차마 그리기 어려운 소재들이었다. 오죽했으면 이 그림들이 담긴 화첩 이름을 사제첩(麝臍帖)이라고 했을까. ‘사제’란 사향노루 배꼽이라는 뜻이다. 사향노루가 사냥감이 되는 이유가 배꼽에서 나는 향기 때문인데, 조영석은 자신의 그림 솜씨가 언젠가 큰 화가 될 것을 예감한 비유였다. 그리고 화첩의 표지에는 “(이 화첩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 범하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라는 경고문을 남겼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양반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이 그림으로 남겨져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조영석은 조선시대에 풍속화를 그린 문인화가로서 높이 평가받는다.
어제 도립미술관 주차장 구석에서 쑥스럽게 핀 철쭉꽃을 보았다.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에 시절을 모르고 핀 이 꽃은 철없이 늦게 핀 꽃일까, 아니면 내년 봄보다 몇 달 앞서 핀 꽃일까. 그렇게 전유성, 힐마 아프 클린트, 조영석을 차례로 떠올려 봤다. 물론 우리가 이들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은 아니지만, 혹여 누군가가 나의 삶을 몰라주더라도 너무 비관하지는 말자. 뭐 인싸가 아니면 어떤가.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할 때, 적어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성실했던 삶들이 저절로 드러날 테니까.
유치석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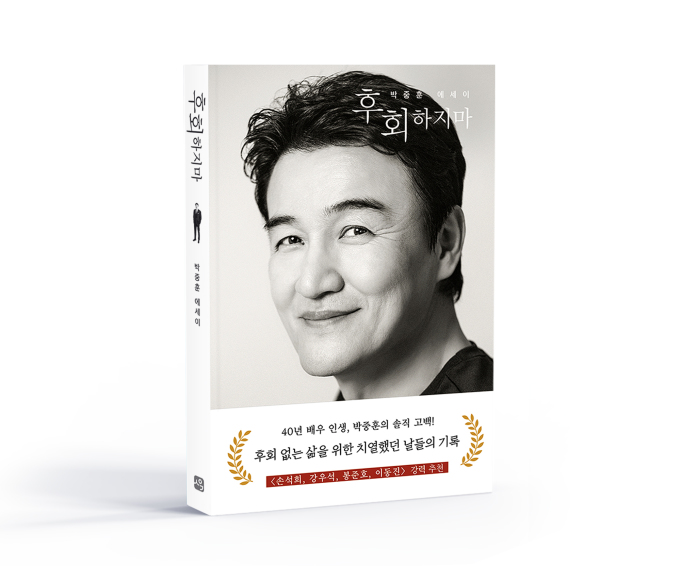

![[클래식&차한잔] 집시의 노래(Carmen-Chanson Bohême)](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092714116_4197a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