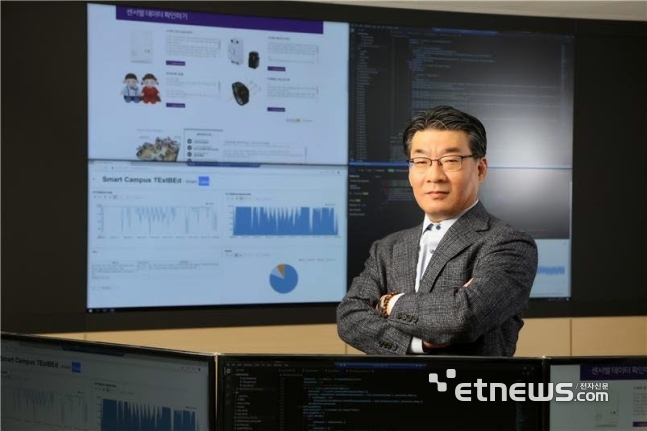
공자(孔子)의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군자구저기 소인구저인(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이라고 나오는데, 그 해석은 군자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는 말이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자신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의 화살을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지가 바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결정한다.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외부(상황이나 다른 사람)가 아닌 내부(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에서 찾을 때 비로소 그 잘못을 고치고 발전할 수 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영원히 발전하지 못한다.
여기서 소인(小人)이란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첫째는 위와 같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이며, 둘째는 재주(才)는 뛰어나지만 덕(德)이 얇고 부족한 사람, 즉, 능력은 있으나 인품이나 도덕성이 부족해 결국 그 재주가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재승박덕(才勝薄德)의 사람이다. 셋째는 겸손함과 올바름이라는 덕을 갖지 못해 힘이 있을 때는 교만(驕慢)하며 힘이 없을 때는 비굴(卑屈)하거나 권모술수(權謀術數)만을 좇는 사람이다. 소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스스로 인격 수양에 게을리해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며, 공적인 영역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기 힘든 사람을 의미하며, 이런 부류의 사람은 타인을 복종하게 만드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덕(德)을 갖추지 못해 지도자로서의 신뢰와 지지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특히, 그 동안 과거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매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발언을 '정당한 비판'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과거에 혐오했던 방식과 태도를 지금의 자신이 스스로 반복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대방의 탓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서(恕)의 정신을 완전히 저버라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이 현직의 자신을 비판하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싫었던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음은 물론 스스로도 반복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 윤리부터 되새겨야 한다.
공자(孔子)의 손자인 자사(子思)는 '중용(中庸)' 제14장에서 군자의 변치 않는 처세 원칙을 설파한다. “재상위 불릉하 재하위 불원상(在上位 不陵下 在下位 不援上)” 이 말은 “윗자리에 있을 때 아랫사람과 상대방을 능멸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을 때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의 높은 지위(上位)에 오르기 전에 낮은 지위(下位)에 있을 때 보여주었던 정의로운 척하던 태도는 과연 진정한 군자의 '절개'였는가, 아니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진정한 군자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신의 인격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과거의 하위(下位)에 재(在)할 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윗사람의 불의에 저항하는 '불원상'의 자세를 보여주는 듯했으나, 현재의 '상위(上位)' 권력을 쥔 후에는 아랫사람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반대 세력을 '능멸(陵)'하는 오만함(不陵下의 위반)을 보인다면, 이는 곧 '지위'에 따라 인격을 바꾸는 소인(小人)의 모습을 자처하는 것이다. “벼슬에 임하지 못했을 때의 생각을 벼슬에 임했을 때까지 유지하라”는 교훈처럼, 권력의 단맛에 취해 과거의 초심과 반대 진영을 비판하던 날카로운 도덕적 잣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는 언제나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는 반구저기(反求諸己)에 있다. 모든 문제의 화살을 국민이나 전임자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정녕 군자는 구저기(求諸己)하고 소인은 구저인(求諸人)한다”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자신의 부족함에서부터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강우 동국대 컴퓨터AI학부 교수 klee@dongguk.edu


![[세상만사] 오늘날 남명 조식 선생의 상소가 필요하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291412062_f95f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