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명이 곧 부채에 따른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이제는, 천문학적 금융투자에 따른 금융과 산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에만 올해 4000억 달러(약 554조 원)를 쏟아붓고 있다. 이들의 2030년까지 총 투자액은 6조7000억 달러(약 9277조4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는 것.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은 자본지출(Capex)을 늘리는 한편, 채권 발행과 사모대출까지 손대고 있다. 여기에 AI 스타트업들도 반도체 구매를 위해 과도한 차입에 나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현재 실리콘밸리식 수익률과 (독일의 부채 위주) 루르밸리식 대차대조표를 결합하고 있다. 10년 전 알파벳, 메타, MS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제외하고도 투자금의 8배 수익을 거뒀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부동산 및 장비)은 현재 자기자본 장부가치의 60% 이상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의 2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이들 세 기업에 아마존과 오라클의 연간 자본지출을 더하면, 미국 상장 제조기업 전체의 자본지출을 뛰어넘는다. 투자사 칼라일의 제이슨 토머스는 이 같은 지출 붐이 최근 분기 미국 경제성장의 1/3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만 해도 기업들은 AI 모델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4000억 달러(약 554조 원)를 쓸 예정이다. 최종 비용에 대한 예측은 모두 천문학적이다. 모건스탠리는 2028년까지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에 2조9000억 달러(약 4015조500억 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6조7000억 달러(약 9276조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어수선한 파티처럼, 아무도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담의 상당 부분은 결국 빅테크 기업의 손익에 반영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2023년 이후 알파벳, 메타, MS는 8000억 달러(약 1107조2000억 원)의 영업현금흐름을, 절반씩 자본지출과 주주환원에 배분했다. 이는 이른바 (이상적인) ‘골디락스 자본배분’. 건설 붐과 현금 배당을 동시에 추진한 셈이다. 이 같은 전략은 이들 내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마존은 막대한 자본지출을 감당하면서도, 주주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수익을 돌려주지 못했다. 애플은 막대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를 만족시켰지만, AI 투자 부족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문제는 현금흐름보다 자본지출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 모건스탠리는 향후 3년간 자본지출과 현금흐름 사이에 1조5000억 달러(약 2076조3000억 원)의 ‘자금 조달 격차(financing gap)’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지출을 유발하고 기존 수익모델을 붕괴시킨다면, 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들이 소비자보다 AI 도입이 느리다면 주주들이 더 많은 수익 환원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 수익을 빨리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자금 격차의 크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격차를 메우고자 하는 투자자의 성격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AI 붐의 중심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외다. 지금까지 주요 기술기업들은 채무에 대해, 독일식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들은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 통신업체들이 의존했던 것처럼, 은행에 의존하지는 않았다. 재무건전성은 중시돼 왔다. 대규모 채권 발행은 항상 더 큰 현금 보유고에 가려졌다. 만약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합쳐 은행을 만든다면, 미국 10위권 은행에 들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그러나 점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술기업의 투자등급 채권 발행은 2024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4월, 알파벳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MS는 현금 보유고를 줄이는 대신 금융리스(대부분 데이터센터 관련 부채)를 2023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시켜 460억 달러(63조6824억 원)로 늘렸다. 930억 달러(약 128조7492억 원)의 관련 부채는 아직 장부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메타는 사모대출 기관인 아폴로, 브룩필드, 칼라일 등으로부터 약 300억 달러(약 41조5320억 원)를 빌리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데이터센터 기반 부채증권 시장도 2018년 거의 무에서 출발해 현재 약 500억 달러(약 69조2100억 원)로 성장했다. 이 부채는 주택저당증권처럼 나뉘고 포장돼 발행된다.
이런 자금 조달 경쟁은 빅테크의 도전자들 사이에서 더 치열하다.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CoreWeave)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구매를 위해 사모펀드와 채권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진행했다. 클라우드 스타트업 플루이드스택(Fluidstack)도 반도체를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고 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챗GPT의 제작사 오픈AI와의 대규모 제휴를 부채로 감당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실제로 돈이 없다”고 비꼬았다.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엑스에이아이(xAI)는 올해 초 50억 달러(약 6조9200억 원)의 부채를 조달한 데 이어, 반도체 구매를 위해 120억 달러(약 16조6080억 원)의 추가 차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처럼 기술혁명은 점점 금융혁명과 밀접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정점에 있는 이들만이, 아이디어 세계에서 물리적 자산의 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모펀드들도 실물경제의 대출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무구조의 변화는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극적이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부채를 만들어내며, 생명보험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사모펀드의 거대한 재무제표에 쉽게 안착한다. 빅테크처럼 사모시장도 점점 집중화되고 있다. 기술기업들은 AI로 인한 수익이 소수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월스트리트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알고 그들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준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이런 공생적 과열은 미국 혁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엔지니어들과 금융 엔지니어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경고등이기도 하다. 대출자들은 이제 전통적인 신용위험이나 금리위험뿐 아니라 기술 리스크도 떠안아야 한다.
과거의 자본 사이클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해야 함을 알려준다. 자본지출 붐은 과잉설비로 이어지고, 수익률이 하락하면 결국 파산을 초래한다.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있지만, ‘안전한’ 고등급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권세인 기자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투자의 창] 민간이 혁신 주체인 이스라엘에게 배우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UVG0QC_1.jpg)
![[GAM]AI 탄력 받은 테라다인 ① 반도체 테스트 고도의 기술력](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0308488981.jpg)
!["너무 일찍 팔아 아쉬워" 후회하더니…손정의, 이 종목 '폭풍 매수' [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CC4XXH_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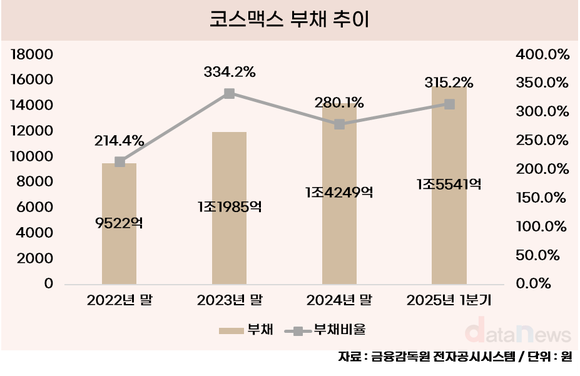
![덕양에너젠, 상장 예심 청구…IPO 돌입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BCPGEM_1.png)
![[단독]민간 AI기술, 정부가 '퍼스트 바이어'로](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B9Z4IE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