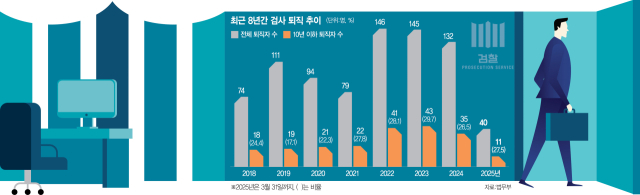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키배’(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용자들 간의 논쟁)를 목격했다. 발단은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밝힌 누군가가 작성한 게시물이었다. 그는 MZ세대의 말투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는 신입사원에게 바깥 날씨가 어떤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는데 “비가 오는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단다. 그는 비가 오면 오는 거지, 오는 것 같다는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며 분개했다. 댓글 창은 난장판이었다.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선배와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게시물에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댓글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창의적인 댓글이 더 많아 실소를 터트렸다.
말 꼬투리 안 잡히려고 흔히 사용
타인의 비난을 피하려는 생존전략
건강한 사회는 말에 책임을 지고
본인 생각 명확히 드러낼 때 가능

나는 ‘키배’를 지켜보며 오래전 신문사 수습기자 시절에 겪은 일을 떠올렸다. 수습기자의 주된 업무는 보고였다. 밤낮없이 경찰서, 법원, 장례식장, 사건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기삿거리를 찾고 정해진 시간에 사수에게 보고하는 일상을 반년 동안 반복했다. 당시 졸음만큼이나 힘들었던 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회피성 말투였다. 내게 보고 시간은 공포였다. 그럴싸한 기삿거리 발굴은커녕 사소한 정보 보고조차 버거웠다. 나는 종종 면피하려고 빈약한 정보 보고에 “~인 것 같다”는 표현을 보태며 말끝을 흐렸다. 그럴 때면 사수는 보고한 정보가 확실하냐며 나를 매섭게 쏘아붙였다.
사수의 질책은 당연했다. “~인 것 같다”는 어미 ‘ㄴ’, 의존명사 ‘것’, 형용사 ‘같다’를 합쳐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기사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의견을 사실처럼 쓴 기사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 사수의 질책은 내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자세를 가르치려는 의도였다. 사수에게 사실만을 보고하는 태도가 익숙해지자 “~인 것 같다” 대신 “~이다”라는 표현이 입에 붙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말끝에 힘이 생겼다. 보고할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추가 취재하는 데 익숙해졌다. 사수는 그런 나를 혼내면서 동시에 다음부터 잘하라고 격려했다. 그 시절의 경험으로 말의 힘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나옴을 배웠다.
회피성 말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많다. 단정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면 그 주장에 책임질 수 있느냐며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물어뜯으면 하나하나 증명하기가 피곤하다고. 뭐 하나 잘못 걸리면 여기저기서 물어뜯기는 세상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 사용은 생존 전략이라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눈치 볼 일이 많은데, 어떻게 소신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이런 의견에도 공감한다. 당장 나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회피성 말투를 썼다 지우며 고민할 때가 많다. 심지어 수습기자 시절 나를 가르쳤던 사수조차도 사석에선 회피성 말투를 자연스럽게 썼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요즘 길가를 살펴보면 하얀 냉이꽃, 파란 큰개불알풀, 노란 꽃다지, 빨간 광대나물 등 다양한 봄꽃이 눈에 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봄에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보이는데, 잡초로 싸잡아서 부르면 하찮게 느껴진다. 무지개 색깔은 사실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의 혼합인데, 우리는 당연히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로 인식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권에서 편을 가르는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잦아지자 국론 분열도 격화했다. 회피성 말투라고 다를까. 쉽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면 쉽게 비겁해지기 마련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여러 지도층 인사처럼.
회피성 말투를 회피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이나 솔직한 자기감정을 표현할 때조차 회피성 말투를 쓰는 사회가 건강한지 의문이다. 그런 사회는 “100퍼센트 확실한 것 같다”는 표현만큼 기괴하다. 나는 “기쁜 것 같다” 대신 “기쁘다”,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대신 “기분이 좋다”, “재미있는 것 같다” 대신 “재미있다”, “맛있는 것 같다” 대신 “맛있다”, “사랑하는 것 같다” 대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 많아지길 희망한다. 자기 말의 무게를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혐오와 비난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정진영 소설가




!["조선사람은 낙천적"이라는 어느 학자에게 보내는 글 [김성칠의 해방일기(17)]](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6/fa3ca278-ac49-4fe0-8e39-97d56e9a9b34.jpg)
![[1년전 오늘] 민희진 "하이브가 나를 배신"](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573_847673_4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