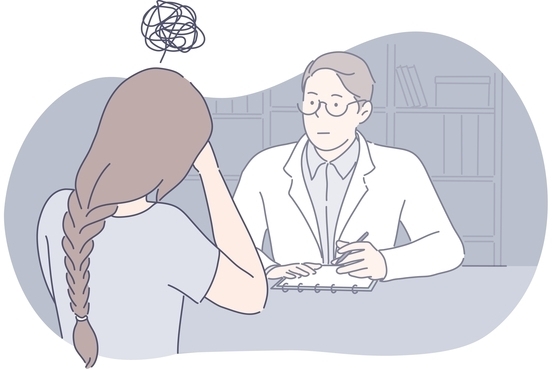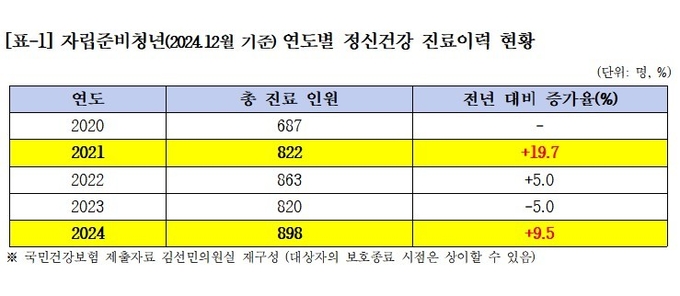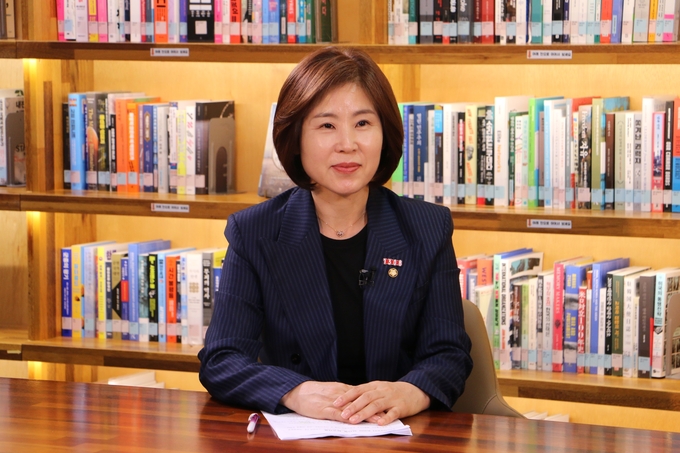1년 8개월 만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제한될 처지에 놓이자 환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평생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호소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 거주지 제한 등이 논의된 데 따른 우려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체제가 의원급 중심으로 되돌아가도 1형 당뇨병 환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범사업 개편안을 운영하고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년 넘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용 경험은 쌓일 만큼 쌓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비대면 진료는 총 88만 1503건 이뤄졌다. 전체 건강보험 청구 건수의 0.16% 수준이다. 비대면 진료 비용은 약 167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0.06%에 그쳤다. 비대면 진료의 99.8%는 개인 의원에서 이뤄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은 일어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는 고혈압·당뇨 등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 분야에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주요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2형 당뇨병(9.0%), 알레르기성 비염(3.9%), 지질대사장애(3.9%) 순이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함께 일상 속 혈압·혈당 모니터링 기술이 접목되면 그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 희소질환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올라케어와 함께 희소질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다. 환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거동이 힘든 중증 질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하는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의사와 화상 통화를 하니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보호자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이 편의성 위주로 부각되다 보니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효용성은 더 많을지 모른다.
사후피임약·비만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개인의료정보 보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의·약사 등 직역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약 배송, 초·재진 여부 등을 논의하느라 정작 비대면 진료 제도의 본질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에 갇힌 의료계의 인식 전환과 정부의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