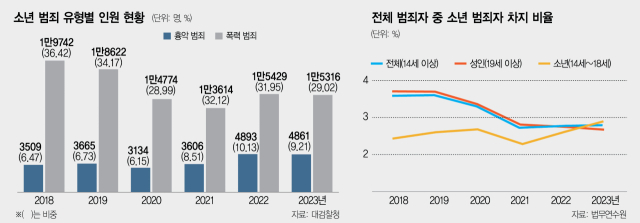(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이름조차 몰랐던 희귀 종양들을 이제는 정밀하게 구분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밀한 분류가 오히려 보험금 지급 문제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인형 과립막세포종’이다.
성인형 과립막세포종은 난소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자궁 출혈, 무월경, 생리 이상과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진단 시점에서는 이미 병리학적으로 ‘악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악성 신생물로 간주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애매하게 처리되는 일이 잦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병리학적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분류번호’와 ‘약관의 문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등장한다. 첫째 병리 결과에 ‘악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요구하는 분류번호 C56(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아니라면 일반암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D39코드가 기재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취급하려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사가 “악성 종양”이라고 설명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경계성이라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종양의 특성이 애매한 탓에, 환자는 큰 혼란과 경제적 불이익을 동시에 겪게 된다.
이 문제를 두고 법원은 종종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한다. 보험 약관이 불명확하다면, 그 책임은 약관을 만든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병리학적으로 악성 소견이 명확하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협소한 기준만으로 암보험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쟁점은 단순히 코드상의 분류를 넘어, 실질적으로 환자가 진단받은 질환이 악성 신생물로 평가될 수 있느냐에 있다. 성인형 과립막세포종은 드물지만, 분명히 환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문구 해석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은 환자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모호한 약관은 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성인형 과립막세포종을 둘러싼 분쟁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암은 암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보험사가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보험제도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최윤근 손해사정사
- 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 前)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 前) ㈜동부화재 사고보상팀
- 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
- 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 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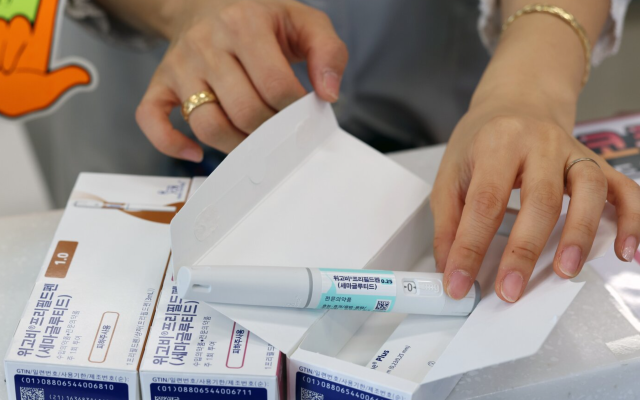




![[전문가 칼럼] 산업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shp_17525398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