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선포했다. 2차원(2D) 스크린 속 알고리즘에 머물던 AI가 로봇의 팔과 자율주행차의 바퀴가 돼 3D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혁명의 서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AI에 3D를 이해하는 눈, 라이다를 달아주는 필자에게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이미 시작된 현실이었다. 마치 달리기 경주의 출발 총성과 같았다.
바로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정부도 이에 맞춰 스타트를 잘 끊었다. 광주, 대구, 전북, 경남의 특화 AI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생략을 넘어 AI 주권 경쟁에서 본격적으로 달려보자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적극적 격려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 어떤 나라보다 자발적으로 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이 있다. 정해진 문제를 풀고 1등을 따라잡는 것 또한 한두 번 해본 나라가 아니다.
AI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명확하다. 엔비디아와 TSMC를 주축으로 한 대만 데이터센터 생태계, 그리고 오픈AI,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AI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각 분야 최적의 솔루션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배정해 예산을 지원하며 우리에게 승리할 '명분'과 '트랙'을 마련해줬다. 광주의 'AI 전환(AX) 실증 밸리 조성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대구의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보건복지부), 경남의 '인간-AI 협업형 대형 액션 모델(LAM) 개발·글로벌 실증사업'(과기정통부), 전북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과기정통부)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AI 경쟁은 단순히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장 빠르게 달리는 경기가 아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타깃을 기민하게 추적해서 다음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격추해야 하는 '게임'과 같은 영역이 더 많다. 사업을 기획한 당시의 세계 최고 수준 경쟁자를 벤치마킹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 특성과 목표 사업 분야에 맞는 살아있는 목표를 정해서 달릴 '특공대'를 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로봇택시 분야의 경우 구글 웨이모를 살아있는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대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지자체가 함께하며 법률, 규제, 보험 등 연관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모든 여정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끌어갈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정부와 대통령실의 역할이다.
각 지자체와 산학연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기업은 축적된 기술력과 자본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타트업은 기민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소는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연구를 병행하며, 각 지역 지자체는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간의 사소한 경쟁을 넘어, 서로의 지식과 성과를 공유하는 공명(共鳴)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팀 코리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뭉쳐야 할 때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AI 3대 강국이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동메달이 목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해왔던 분야에서 AI 기술로 벨류업해 금메달을 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유도를 시작으로 펜싱, 양궁, 배드민턴에서 날마다 메달 소식으로 우리가 설렜던 것처럼, 각 지자체와 부처, 산학연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별로 특화된 AI 종목에서 기필코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할 것이다.
정지성 AI산학연협회 회장·에스오에스랩 대표 stopstar@soslab.co
![[ET시론] '모두의 AI' 문제는 How to](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5/news-p.v1.20250325.30e43afe3d3940918e75be056bed0bd4_P3.png)
![AI 경쟁 밀린 메타, 홀로서기 접고 미드저니 손 잡았다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b799efc7-6198-45bf-b4a9-b5ffbc8354bc.jpg)

!["파운드리 도전은 필연, 이재용 회장은 포기 않을 것" [월간중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e7de6efd-d2b8-49d0-b118-b0bbfe2e6a7d.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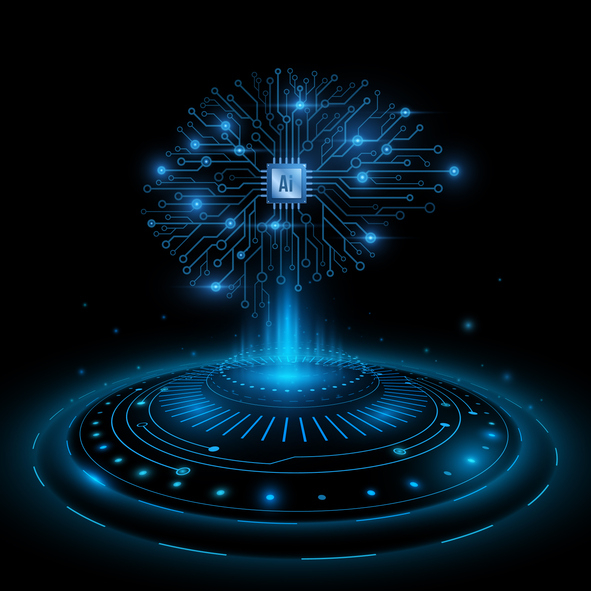
![[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포럼]글로벌 의료AI 경쟁력, 신속 시장 진입·연구 생태계 조성 시급](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5/news-p.v1.20250825.85471eb8f2154ebfa67a2cfe6f420149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