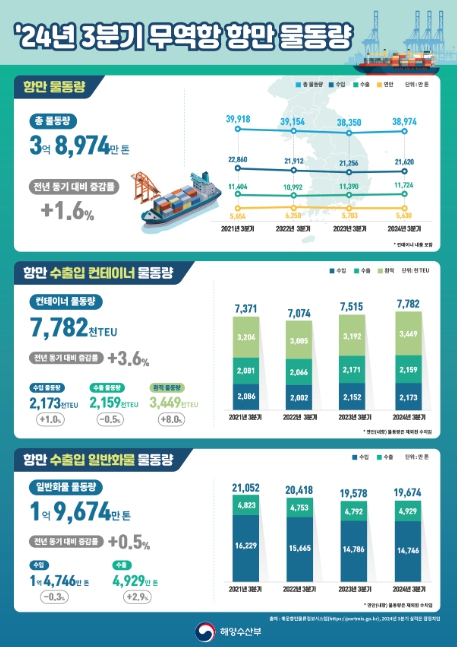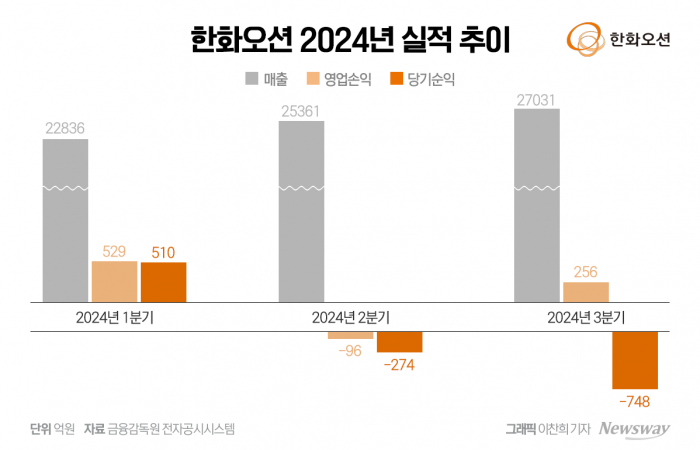지난해 조선소 르포 현장에서 보았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다. 약 반나절을 조선소에서 보냈지만,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는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언제부터 조선소 현장에 외국인들이 자리 잡았을까. 조선업계가 '르네상스' 시절로 불렸던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당시 조선업계는 연간 수주 실적이 300억 달러에 가까울 정도로 역대급 호황기였다. 실제 전 세계 상위 5위권까지 국내 조선업체들이 차지했고, 주가 역시 폭등세였다.
밝은 호황에 당시 고용 인력 규모도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호기로운 기세를 보였다. 조선업계 빅3(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당시 고용인원은 무려 20만명에 육박했다. 실제 A업체는 넘쳐나는 인력 수요에 직원 1000여 명을 수용할 대규모 기숙사를 신축했고, B업체는 2000여 명에 가까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이듬해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국내 조선업계도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일부 업체들은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그 많던 인력들도 하나둘씩 뒤안길로 사라졌다. 게다가 당시 대형 조선사들은 경기침체로 수주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소 조선사들은 수주가 거의 끊길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뼈 아픈 시간을 보낸 후 조선사들은 2014년 또 한 번 '제2의 황금기'를 맞았다. 대규모 발주가 시작되고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늘면서 3사 모두 부활의 기지개를 켠 것이다. 당시 조선사들의 인력은 약 20만3000명 수준이었다.
다만 이러한 시간은 얼마 가지 못했다. 조선사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한파와 저유가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하락, 수주 절벽 등으로 침체기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현장을 지키던 인력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약 10년이 지났다. 조선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업황이 개선돼 현재는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인력은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기준 국내 조선업계 인력은 9만3000명대로 집계됐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최근 한 조선소가 낸 인사발령 공문에도 한국인 이름 석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부서는 조립부터 탑재까지 다양했고, 숙련도가 요구되는 용접 부문에도 전부 외국인들이 빈자리를 채웠다. 게다가 일부 팀장급도 외국인이 채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2010년대 당시 이뤄진 구조조정의 영향도 있으나,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인력난을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대비 저임금 구조를 갖춘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 타 업종보다 작업 공간이 밀폐되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국내 청년층도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자 정부와 업계는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나섰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비자 배정을 3000명가량 늘렸고, 외국인력 허용 비율도 대폭 완화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목소리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급급하게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국내 현장에도 한국인 청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조선업은 국내 대표 산업이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어찌 기업의 존속을 논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내년 현장에는 외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많이 볼 수 있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