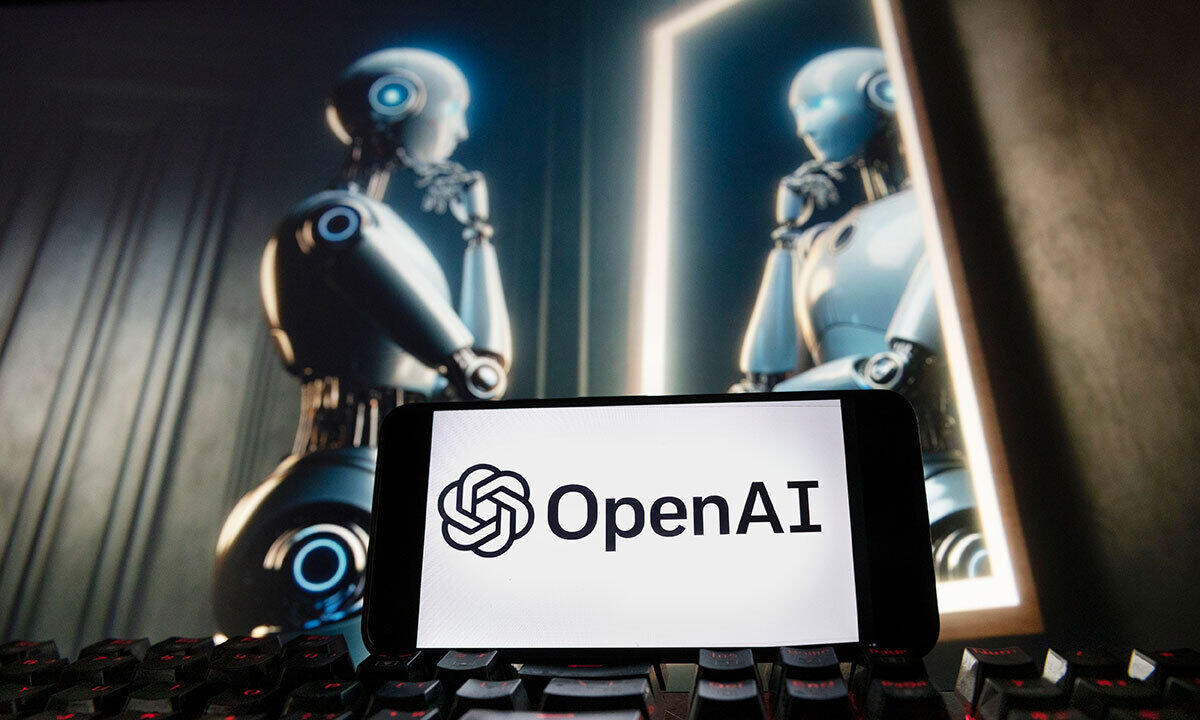중국의 인공지능(AI) 전략이 기술 개발 경쟁에서 실생활에서 얼마나 폭넓게 적용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딥시크 열풍 이후 AI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최신 기술 개발보다 실생활에서 응용 가능성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올해 초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놓아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코노미스트는 “딥시크를 둘러싼 초기의 열광은 다소 가라앉았다”면서도 중국의 AI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 AI 산업이 지난해 32억 달러(약4조4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1400억 달러(약194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 부품 산업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1조4000억(약1945조3000억원) 달러에 이른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액센추어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46%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나 수익 증가를 본 곳은 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산업 전반, 공공 부문 등에 걸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중국 AI 전략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
AI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중국의 각 지방정부다. 이들은 AI 스타트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앞다퉈 투입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항저우의 AI 안경 스타트업 로키드를 예로 들어 “이들이 지방정부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지 8분 만에 300만 위안(약5억7000만원)이 입금됐다”고 소개했다.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공공 차원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영 전력회사 직원들이 송전선 결함을 찾기 위해 로키드의 AI 안경을 활용하는 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AI 분야에 국가적 역량과 자본이 집중되는 데 우려도 뒤따른다고 전했다.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를 ‘거품’이라고 진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로봇들이 상용화돼서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 분야에서 성급한 AI 활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4월 칭화대 연구진은 “300개 이상의 병원이 딥시크를 너무 빠르게 도입했다”며 오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도 지난달 “모두가 AI와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지방정부 당국자들을 질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써는 중국의 국가와 지방 모두가 AI에 전력 질주 중”이라고 전했다.

![엔비디아 中시장 돌아왔지만 점유율 지키기 난관 예고, 왜?[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BDNW57_1.jpg)
![[단독]민간 AI기술, 정부가 '퍼스트 바이어'로](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B9Z4IE_2.jpg)
![[로터리] 정부 R&D, 실패를 허락하라](https://newsimg.sedaily.com/2025/08/06/2GWIPZJHMI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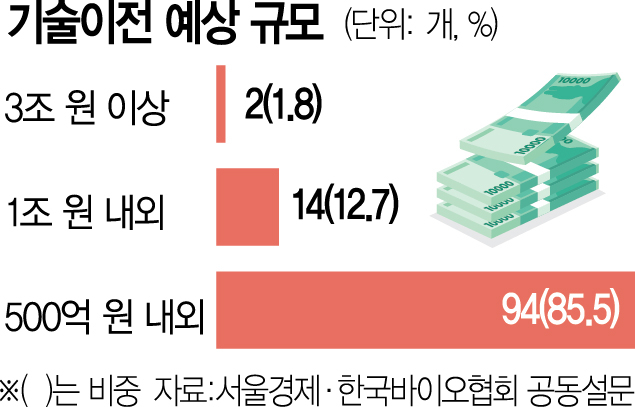
![[현장에서] 국가대표 AI 모델 구축 넘어 생태계 조성 '절실'](https://img.newspim.com/news/2022/07/18/2207181720496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