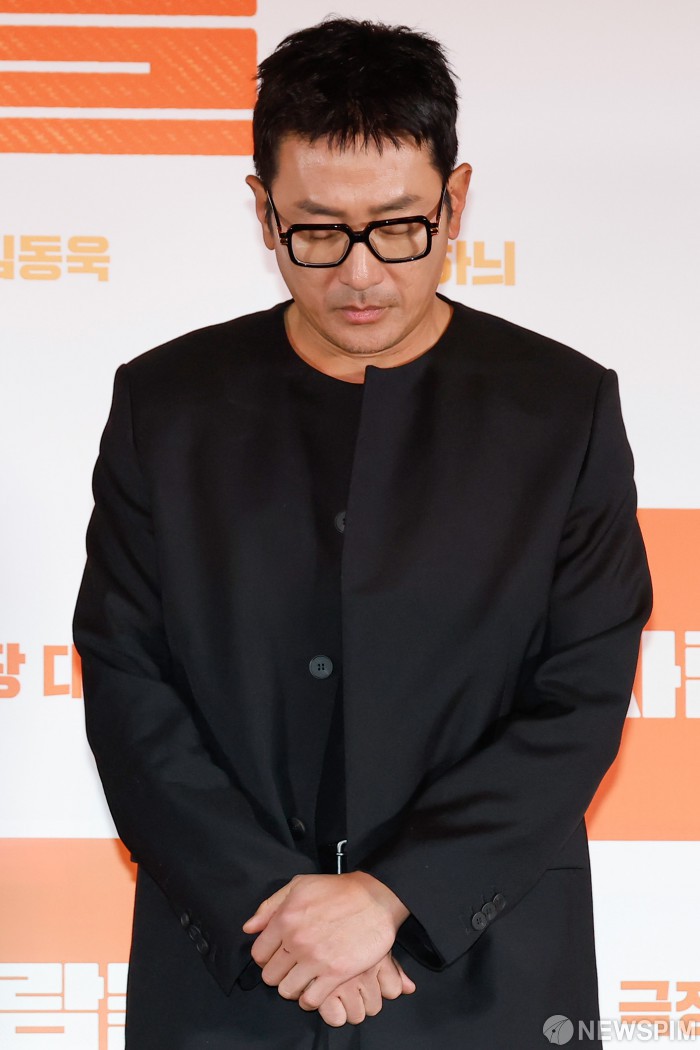이 기막헌 일을, 니영 나영 잊어불며는 누게가 알아주까? (이 기막힌 일을 너랑 내가 잊어버리면 누가 알아줄까?)
제주 4·3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란>이 26일 개봉했다. 영화는 1948년 제주, 남한 단독 정권 수립에 반대하는 서북청년회의 ‘산부대’와 이를 잡으려는 군경 ‘토벌대’의 갈등 사이에서 생존위협을 겪는 제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6살 아이를 둔 26살의 어머니 ‘고아진’역을 배우 김향기(25)가 맡으며 화제를 모았다.
영화의 중심에는 6살 난 딸 ‘해생’(김민채)과 그의 엄마 ‘아진’이 있다. 해녀였던 아진은 토벌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산으로 올라간 남편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피난길에 오른다. 군인들이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에 딸과 시어머니를 남겨둔 채 떠났지만 곧 마을이 불타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다행히도 해생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살해당한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아진은 해생이 살아있다는 무당(아기심방)의 말을 듣고 딸을 찾으러 마을로 향한다.

영화는 모녀와 마을 사람들의 군상을 담으면서 참담했던 시절을 보여준다. 토벌대와 산부대의 인간군상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토벌대 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죽인 중사와 도저히 시민을 죽일 수 없었던 하사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식이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김향기는 “모녀의 이야기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추는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며 “(한란은) 힘든과정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제주도민들의 이야기가 잘 담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어머니 역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나이가 1940년대 당시에는 어머니였던 것이 맞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아진이가 해생이만 보고 초인적인 힘을 내는 것을 보고 모성애란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다. 동물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동물들이 보인 모성의 눈빛이나 행동이 인간과 비슷한 구석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란>의 대사 대부분은 1940년대 제주어로 쓰였다. ‘삼춘’ ‘무사’ ‘폭삭 속았수다’ 등 널리 알려진 단어도 있지만, 고증이 잘 된 만큼 대부분은 표준어 발화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영화 내내 표준어 자막이 함께 송출된다.
김향기도 연기를 하면서 ‘제주어’ 구사를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 3개월 전부터 1대1 과외 형식으로 제주어를 배웠다”며 “사투리로 접근했을 때 입에 잘 붙지 않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배우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허명미 감독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출신 조연배우분들의 도움으로 자연스러운 제주어 대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광활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담은 화면도 영화의 매력이다. 제주의 숲, 동굴, 바다 등의 자연경관은 슬픈 역사와 대비되며 더 아름답게 다가온다. 김향기는 “촬영 전 감독님과 함께 4.3사건에 관한 ‘다크투어’를 했다. 제주 숲과 바다를 돌아다니며 촬영지를 확인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숲들이었다”며 “숲속 촬영이 힘들기보다 자연에 힐링 받는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다크투어’는 재해, 참사, 전쟁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교훈을 얻는 여행을 뜻한다.
김향기는 영화를 보러오는 관객들에 대해 “(관객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있는 그대로의 영화를 느껴주셨으면 한다. 영화를 계기로 4.3에 대해 궁금해지고 찾아봐 주신다면 가장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