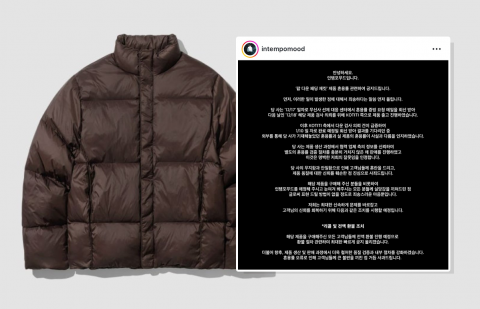
겨울이 다가오면서 패딩 충전재 허위표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구스다운(거위털)'으로 광고된 제품에 오리털이나 솜이 섞여 있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요 패션 플랫폼들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의 불씨는 지난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브랜드가 제품 라벨의 혼용률을 부풀려 표기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겉으로는 '거위털 80%', '솜털 90%'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오리털과 깃털, 심지어 솜이 섞여 있었다.
무신사는 올해 입점 브랜드의 다운·캐시미어 상품 7968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5%에서 혼용률 오기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표기된 다운 함량이 80%였지만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업계가 충전재를 속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패딩 충전재는 제품 원가의 30~40%를 차지하며, 구스다운은 kg당 13만원, 덕다운은 8만원 안팎으로 1kg당 5만원의 차이가 난다. 패딩 한 벌에는 평균 300g의 다운이 들어가므로, 거위털 대신 오리털을 섞으면 한 벌당 약 1만5000원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스다운'이라는 단어 하나로 소비자 판매가를 20만~30만원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원가를 낮추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면 제품당 최대 15만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한다. OEM 방식으로 수천 장을 생산하는 브랜드의 경우 단 한 시즌에 수억원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익 구조는 이렇게 뚜렷하지만, 검증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소비자는 '거위털=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 충전재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검증 역시 브랜드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 업체는 동일한 성적서를 여러 제품에 돌려 쓰거나 아예 첨부하지 않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적발 가능성은 10% 미만인데, 한 벌당 수십 배의 이익이 가능하다면 조작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패션 플랫폼들이 뒤늦게나마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무신사는 패딩·캐시미어 상품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무작위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 중이다. 신세계 W컨셉은 제조사 시험성적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는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해 허위 기재가 적발되면 판매 중단, 소비자 배상, 퇴점 등 단계별 페널티를 부과한다. 에이블리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면 거래 취소와 퇴점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충전재 허위표기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규제 강화로 인해 적발 시 손실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량 회수·환불·물류비 등을 포함하면 5000벌 기준 약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브랜드 신뢰도 하락까지 겹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게다가 품질 논란이 발생한 브랜드의 재구매율은 평균 47% 감소하고, 리뷰 평점이 0.3점만 하락해도 매출이 8~12% 줄어든다(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다만 규제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 경쟁 심화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구조 속에서 원가 절감 압박이 지속되는 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급 소재를 섞는 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뿌리를 가격 구조와 검증 부재에서 찾는다. 중소 브랜드들이 플랫폼 입점을 위해 판매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이 불가피해지고, 하청 제조 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느슨해지기 쉽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플랫폼이 품질 보증의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충전재 표기 의무화와 공인 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