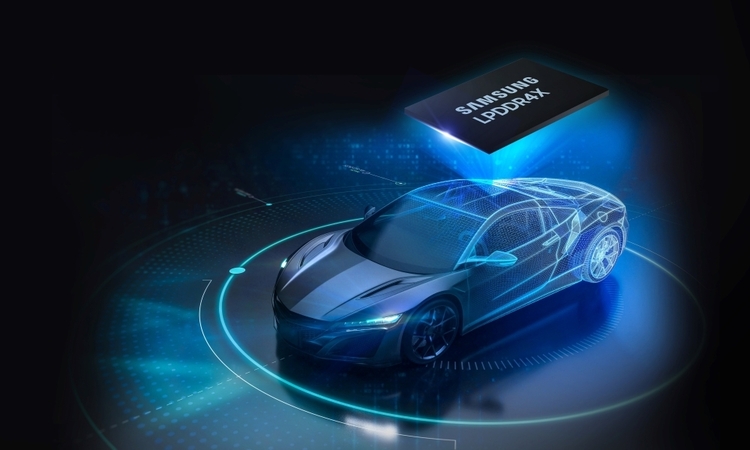커넥티드 카 기술 고도화
완전한 자율주행 구현 기대
차량과 차량·인프라·보행자
빠르고 기민한 정보 교류
안전·정확한 주행 뒷받침
모빌리티 사용 경험 관심↑
차량에 AI 가전 융합 ‘가속’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집·일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이 화두인 요즘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눈부신 발전을 기반 삼아 공상과학으로만 여기던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구현돼 가는 가운데, 초연결·초저지연 통신을 토대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고도화하며 도로 위를 온전히 스스로 누비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

차량-사물 통신, 미래차 ‘화룡점정’
스스로 주행 가능한 미래차는 사람의 눈과 머리를 대신해 도로 위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 카메라 같은 센서들을 갖춘다. 그러나 센서만으로는 악천후나 돌발 상황에 놓인 자율주행 차량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거리, 장애물 뒤, 눈·비·안개 너머 대상 식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차량이나 도로 인프라와 통신하며 폭넓은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더 안전하게 주행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다. 미래차에 적용되는 이 통신 기술을 ‘차량-사물 간 통신(Vehicle-to-X, V2X)’이라고 하며, V2X가 적용된 자동차를 ‘커넥티드 카’라고 부른다.
V2X는 차량을 만물과 연결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다른 차량(Vehicle), 인프라(Infrastructure), 보행자(Pedestrians)가 포함된다. 따라서 V2X는 차량-차량 간 통신(V2V), 차량-인프라 간 통신(V2I), 차량-보행자 간 통신(V2P)을 아우른다.
V2V는 일정 범위 내 차량 다수가 각자의 위치와 주행 정보, 주변 교통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선행 차량의 사고, 도로 위 장애물 여부 등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관련한 정보들을 후행 차량에 전달함으로써 연쇄 추돌을 방지하는 개념은 V2V에 기반한다.
V2I는 차량 내 단말기와 도로상 노변 기지국 간 통신을 거쳐 차량의 주행 정보를 중앙 서버로 전송,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V2I를 통해 차량은 원거리의 교통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정체 회피를 유연하게 수행하도록 뒷받침한다.
V2P는 모바일 기기 등 단말을 갖춘 보행자나 자전거, 이륜차와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각지대를 통행하는 사람과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이처럼 차량이 다양한 객체와 적극적으로 통신하며 주변 상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정확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현재 상용화된 차량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같은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V2V, V2I, V2P는 필수 기술로 여겨진다.

150Mbps·10㎳ 고품질 통신 ‘관건’
자율주행은 자동화 수준에 따라 0~5단계까지 6개 계층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차량의 제어권을 운전자에게 전환하지 않는 4단계 이상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자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가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을 출범한 바 있다.

사업단은 2027년까지 4단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7년간 총 1조974억원을 투입하며 △ICT 융합 신기술 △차량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 8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ICT 융합 신기술에 관심이 모인다. V2X가 고도의 자율주행 능력을 겸비한 미래차의 핵심 요소 기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V2X를 위한 ICT는 차량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주행함을 고려해 찰나의 지연이나 손실, 왜곡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한다.
특히 주행협상과 고정밀측위는 4단계 이상 자율주행 구현에 필수로 요구된다. 주행협상은 도로 위 자율주행차, 운전자 운행 차량, 이륜차, 보행자 중에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통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운전자·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표지판, 신호등, 차선을 매개로 판단해 왔으나, 미래 교통체계에서는 V2X로 대상 간 정보 교환이 이뤄지면서 사전 입력된 프로그래밍 규칙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이 구현될 것으로 예견된다.
아울러 정확한 위치에 기반해 주행 인식과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에, V2X는 10센티미터(㎝) 이하의 측위 오차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고정밀 측위를 위해서는 차량 내 범지구위성항법체계(GNSS) 센서뿐만 아니라 △도로의 곡률·경사 △노면의 차선·표식 △도로상 신호등·표지판 등 교통 시설물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 정보가 3차원(3D)으로 면밀하게 반영된 정밀지도(High Definition Map)가 별도로 구축돼야 한다.
정밀지도 서버와 차량은 고속·저지연 통신으로 연결돼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되고 시시각각 서버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사업단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하에 개발 중인 ‘초고속 V2X 통신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은 원활한 자율협상주행과 고정밀 측위를 위해 초당 150메가비트(Mbps) 이상의 전송 속도, 10밀리초(㎳) 이하의 전송지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상용차에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는 20~30Mbps 속도와 100㎳ 지연에 그치는 성능으로 자율주행 4단계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부 공간도 디지털 전환 ‘속도’
“차량이 스스로 달린다면, 탑승자는 그저 가만히 앉아 목적지 도착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이 물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전자장치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발상이 나타났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함에 따라 차 안에서 사람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줄고, 승객들은 운전 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발상은 단순히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공조 장치 등을 고급화하는 수준이 아닌, 가전제품·엔터테인먼트 기기를 차량에 탑재한다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장차 완전한 자율주행이 구현되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에 그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집 또는 일터로 기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커넥티드 카로 대변되는 미래차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자의 탑승 경험을 높이는 ICT 융합 서비스를 탑재하는 방향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LG전자와 기아의 최근 협력은 이런 동향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은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모듈형 의류관리기(스타일러), 스마트미러, 커피머신, 냉장고, 오븐 등 AI 가전이 대거 적용된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이 차량에 내장된 가전기기들은 단편적인 사용을 넘어 승객과 차량, 가전기기 간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탑승객이 생성형 AI 비서를 통해 업무 일정을 말하면 스타일러는 목적지까지의 잔여 이동시간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의류 관리 코스를 설정한다.
양사는 향후 이동 중에도 AI 가전제품을 활용해 일하고 놀고 쉴 수 있도록 차량 내 공간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콘셉트카는 내년 하반기 시장 진출을 목표로 협력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력은 완전 자율주행 구현에 앞서 상용 차량과 AI 가전의 결합을 본격화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기아 관계자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화된 생활 및 업무 공간으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T시론]모빌리티 혁신의 주체, 플랫폼 책임과 역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4/news-p.v1.20250414.3dfc9f8da30444918d9f28fef55cadc1_P3.jpg)

![[통신칼럼] 디지털 심화시대, 에너지 전송은 전파가 맡는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4/news-p.v1.20250414.c4598d5d16cf40afa5d6dfcd11e61aba_P3.jpg)


![[남재작 칼럼] ‘디지털 혁명’ 파도 앞에 선 한국 농기계산업](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14/.cache/512/202504145007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