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당정 갈등으로 지루하게 끌어온 'AI 기본법'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급물살을 타며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숙의를 거쳐 AI 법을 도입한 유럽연합(EU)과 대비된다. 기본법은 정부의 산업 지원과 같은 활성화 정책이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틀을 마련했지만, 다듬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AI 규제 대상·강도도 그중 하나다.
애당초 시장에 맡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식과 사전에 규제하는 유럽식 방식이 대립해 왔다.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IT 기업에 시종일관 관대한 입장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상용화 이후 실리콘밸리의 풍부한 자금·인력을 기반으로 출범한 IT 기업은 세계 국가의 25%인 50여 주로 구성된 미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시장을 공략했다. 오래전 신대륙 개척의 선봉에 서는 모험심 가득했던 유럽이 미국에 수비로만 일관하는 모습은 안타깝기조차 하다.
AI 생태계도 별반 차이 없다. 오픈AI의 챗GPT 출시, 종합포털 빙·구글의 대형언어모델(LLM) 탑재 경쟁, 엔비디아 GPU 수요 증대와 같은 생태계 변화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EU는 2022년 플랫폼 규제법에 이어 2024년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 강도에 비례해 규제하는 AI 법을 제정해 대응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부재(막스 베버), 노동시간 제한(에드워드 프레스콧), 복지 과세에 따른 개척·혁신 동기 부재(대런 아세모글루) 같은 가치관·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말하자면 점심 2시간, 휴가 한 달 이상인 유럽과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휴가도 반납하는 미국과 차이다.
혁신의 성과만 보면 맞지만, 인간권리(인권)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유지하고 인격 계발을 위한 대상(물질·행동)에 누구나 접근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돼 있다. EU는 AI 법을 만들다 보니 인권 문제에 부닥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를 전제로 접근한 것이다.
EU의 AI 법은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이나 행동 예측으로 시민을 감시·통제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한다. 자유로운 의사 표명과 같은 '시민·정치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 진단, 성적 평가나 사원 채용·관리를 위한 AI는 다양한 요건(투명성, 데이터 품질, 문서화, 모니터링 및 안전)을 만족해야만 허용된다. '경제·사회·문화 권리'의 주요 법주인 건강·교육·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의 노동 수요 대체는 인간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갈 수 있어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류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전개 방향을 두고 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챗GPT만큼 답변·요약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인가를 생각해보면 답변은 자명하다. 국민총생산(GDP)은 물론, 인권도 고려하는 '국민총행산(GNHP, Gross National Happiness & Product)'의 개념이 주류화돼야 하는 이유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

![[ET 시선] ICT 새로운 설계도 필요하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12/news-p.v1.20240612.73af7b6f21f149599d1239c0e769dc10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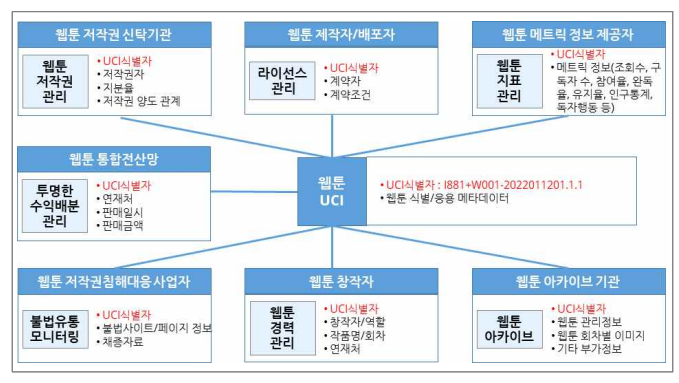





![[설왕설래] 반도체 보조금](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2/202412225102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