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자녀의 진로 문제다. 어떤 직업을 안내하고 도와야 하는지가 그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래 시대는 부모가 살아왔던 구시대와는 다르므로 아이의 진로 방향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AI 시대를 이미 맞이했다고까지 규정하는 진취적 부모에게도 미래시대를 향한 아이의 진로 문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애착이 강한 부모일수록 아이의 진로를 부모가 끌려는 성향이 강하다. 세상을 경험했으므로 오죽 잘 안내하겠냐는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기 어려우므로, 수십 년 전의 과거를 기반으로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허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놓고 부모와 아이의 판단에 갈등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자녀는 부모가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가상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미 디폴트로 가지고 있으나, 부모는 이 디폴트가 낯설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미래에는 시대의 커다란 갭(gap)만큼이나 직업군의 변화도 역동적일 것이다. 위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사라짐이 상상을 뛰어넘을 것 같다. 이런 시대 변화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AI의 진입 정도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AI 시대에 대하여 단순히 디지털 기계 시대의 돌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AI와 공존하는 시대’의 도래로 이해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AI 왓슨이 등장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다양한 분야의 슈퍼컴 등장은 미래시대의 향방을 확실하게 결정해 갈 것이다. 인간이 AI와 동일 선에서 능력을 경쟁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과의 공존을 위해 어떤 영역을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가 앞으로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에 적성과 흥미 검사가 있다. 적성 결과는 직업 선택에서 꽤 유의미해 왔다. 그러면서‘흥미는 취미, 적성은 직업’이라는 등식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성은 학습의 결과를, 흥미는 기질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또 적성은 주어진 과업에 대한 뛰어난 성취를 추구하는 반면, 흥미는 탐구적 창조와 새로움의 발굴을 지향한다. 그래서 AI 이전에는 인간의 적성 능력에 가치를 두었지만, AI와의 공존 시대는 자유로운 몰입과 새로운 발굴을 가능케 하는 흥미 역량에 관심을 둘 수 있다. 앞으로 AI는 인간의 적성 능력을 완벽하게 대체해 갈 것이니, 이제는 AI의 적성 능력을 보완하고 창조하는 흥미 역량의 조화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시대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미래에는 아이의 ‘적성’보다는 ‘흥미’에 무게를 둔 관찰과 지원이 부모의 진로교육 해법이 될 만하다.
부모에게 놀라운 변화로 다가온 현재의 이 시대를 이미 기본 값으로 세팅한 아이들은 이제 새 시대의 주인공이다. 새 시대를 살아갈 아이를 과거에 뿌리를 둔 부모가 고집스럽게 끌어당길 일은 아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소중함의 가치로, 아이를 지켜보면서 ‘적성’을 살피되‘흥미’를 잘 챙겨주어야 한다. 인간의 삶에 군림하지도, 배타적 존재로 맞서지도 않는 AI, 그리고 AI와 인간의 공존, 이렇게 인간과 AI는 상호작용하고 보완하며 미래 시대를 도도히 흘러갈 것이다. 이제 부모는 자녀의 흥미를 알고 그것을 장려함으로써 적성과 흥미가 조화를 이루는 AI와의 공존 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송영주 전 군산동고등학교 교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와의 공존 #흥미 #직업의 중심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에듀플러스]이영호 제11회 SWTO 출제위원장, “SW·AI 관련 시사 내용 포함할 것…평소 신문·책 많이 읽어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7/news-p.v1.20250427.5dce412554b747d8961d1bd325813d45_P3.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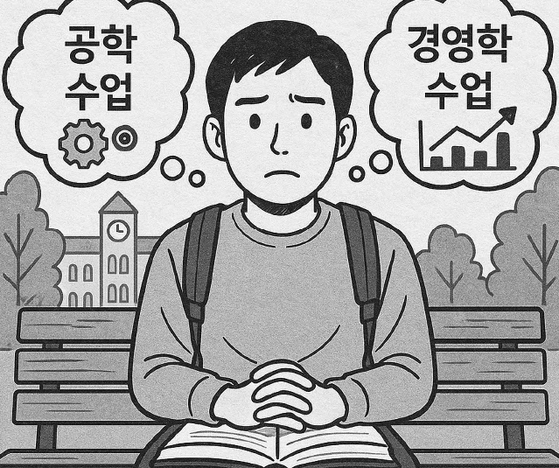

![AI 기본권 없이 AI 성장은 없다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OA15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