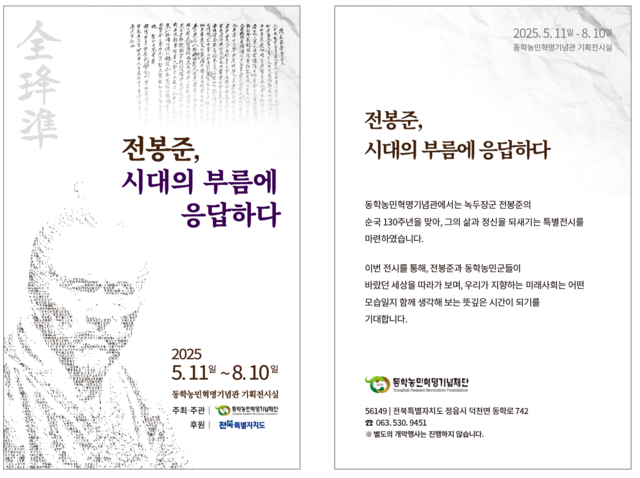1960년대 초엽, 그 대학 강의실은 늘 엄숙했다. 학과목의 강독 원서는 카(E. H. Carr)의 『The Twenty Years’ Crisis(20년의 위기)』였다. 강의는 동서고금을 오르내렸으며, 학생들은 그 황홀한 강의에 매료되어 넋을 잃었다. 저 교수님은 똥도 누지 않는 분인 줄 알았다. 그분의 나이가 31세였다.
연희대학 3학년 때 외무고시에 합격했으나 벼슬길로 나가지 않았다. 공부할 때 졸음이 오면 잠을 쫓으려고 면도날로 손가락을 베었고, 상처가 덧날까 봐 촛불로 다시 지졌다.

그분은 군사 정부의 유혹도 뿌리치고 50달러를 쥐고 버클리로 유학을 떠났다. 학비를 아끼려고 삭발을 했다. ‘공산주의의 간부 제도 연구’(1967)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학생들은 첫 수업에 꽃다발을 안겨 드렸다. 강의실 앞 첫 줄 왼쪽 자리에는 물들인 야전 잠바를 입은 수척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남들보다 조금은 영어를 잘한 탓에 교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학기에는 서대문 봉은사 밑의 영단주택으로 소년을 불러 원고를 정리하게 했다. 쉬는 시간에 교수님은 장롱에서 모조지 반절 크기의 족자를 꺼내셨다. 글씨가 검붉었다.
혈서였다. 글씨는 ‘太平洋(태평양)의 燈臺(등대)’였다. 소년은 전율했다. 그리고 공부란 얼마나 지독하게 해야 하는지, 인생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연세 51세에 암이 찾아왔다. “주님, 저를 대신 데려가소서.” 울며 기도하는 노(老) 권사님들의 애원도 보람없이 그해 향년 51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여한이 많았을 것이다. 교수님은 임종에 앞서 대강당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강의를 했다. 그분은 “여기 조약돌로 진주를 빚으려 애쓰며 살다 간 천석(天石) 조재관 잠들다”라는 묘비명을 소년에게 불러 주셨다. 오늘 스승의 날, 지금 그 소년이 울먹이며 이 글을 쓴다.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