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깍깍 깍 미루나무 우둠지 까치네요. 포르릉, 놀란 참새가 날아갑니다. 개개비는 마른 갈 숲에 내려 팥알보다 작은 심장을 할딱거립니다. 징검돌 틈을 빠져나가는 냇물, 있으나 없었습니다. 가끔 물멍이나 하던 삼천 변에 앉습니다. 한나절 눈을 막고 귀를 뜹니다. 여태 못 본 안 보이던 게 들립니다. 자꾸만 목청을 돋우는 까치에 놀란 왜가리가 행여 제 숨 새어 나갈세라 입을 틀어막습니다. 버들치에게 들켰을세라 먼산바라기 딴청입니다. 건너편 친구네 마당엔 벌떼 붕붕거리던 모과나무 분홍 꽃잎이 하롱하롱 내렸겠지요. 꽃진 자리에 딱지 앉았겠지요. 문풍지 바르는 가을이 오면 세상은 노랗게 모과 빛으로 밝겠지요.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구급차가 바쁠 것 하나 없는 봄날을 재촉합니다. 구구거리는 재 너머 멧비둘기 세레나데도 어제보다 한 뼘은 더 깊어졌고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나 놓친 것 많았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만 보이던 유년의 관성이겠지요. 이제 어떤 시인처럼 “비 가는 소리”도 챙겨야겠습니다. 새 만년필에 초록 잉크 가득 넣은 갈대처럼 또박또박 개개비 노래 받아적겠습니다. 꾀꼬리 날아든 오동나무는 분명 거문고 가락 들려줄 겁니다.
#눈 #귀 #안성덕 #시인 #풍경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송선헌의 시와 그림] 5월의 흰 꽃잔치](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5/44423_75364_2658.jpg)
![[포토에세이] ‘악마구름’ 드리운 국회](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8/2025050852031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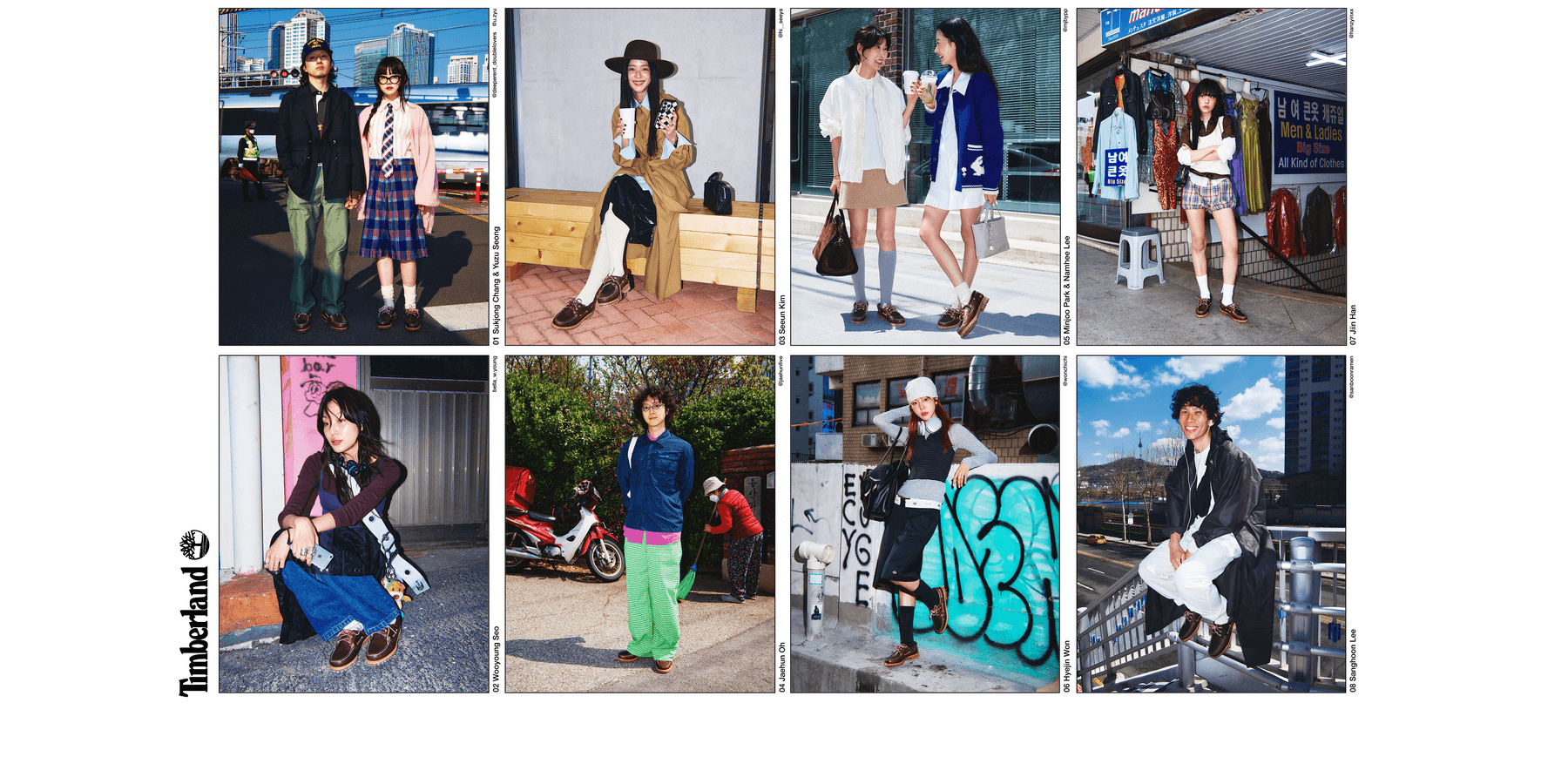
![[사진 한 잔] 스테이지 트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10/389f9355-6bf8-45f9-9a61-b7678c7cfcb8.jpg)

![[아이랑GO] 갯벌·국립공원·옐로스톤…놀러 가기 전 알아야 할 것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9/924bf971-14fd-497a-955f-93c9493f99b3.jpg)
![[빌리 장의 색(色) 다른 사진 여행] 얼음과 모험의 땅…꿈의 여행지 그린란드로](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09/dd975dd2-2779-475c-921f-eb87d7d684d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