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서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 10대 그룹 주력 기업 10곳 중 7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일보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주요 대기업 10곳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했더니,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넘긴 기업은 SK텔레콤·포스코·GS리테일 등 3곳뿐이었다.
롯데쇼핑(2.6%), 현대자동차(2.5%), LG전자(2.5%) 등은 2%대, 삼성전자(1.8%)와 HD현대중공업(1.7%), ㈜한화(1.7%)는 1%대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 근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 숙련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부담금보다) 직접 고용에 대한 심리적·실무적 장벽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5%에도 미치지 못한 곳은 298곳에 달했다.
재계 10대 그룹 중에선 6곳이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업은 삼성으로 462억600만원을 냈다. 이어 현대차(210억5300만원), LG(119억700만원), 한화(76억8400만원), HD현대(62억8700만원), GS(52억5600만원) 순으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만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2년 622곳에서 2023년 694곳, 지난해 797곳으로 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도 중요하지만, 고용 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애인·비장애인 직원이 자연스럽게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 배치와 근속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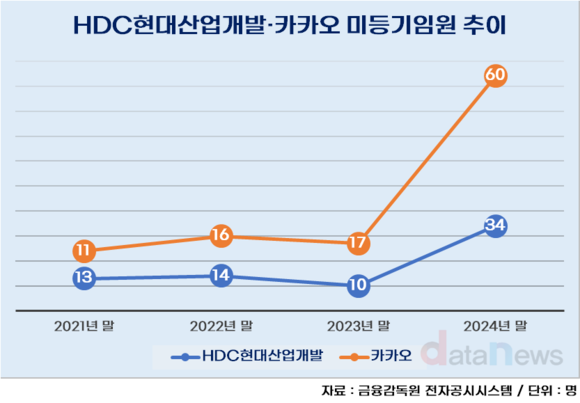

![[청년발언대] 정신건강 위기 속 청년들…정부의 정책 변화로 치료의 기회 확대될까?](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422737736_5990a9.jpg)
![[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 예산 늘어도 체감도 낮아…대상자 제한·인력 부족 한계](https://img.newspim.com/news/2024/08/26/2408261357465050.jpg)
![[금융권 1분기 실적(下)] 주요 생·손보사 1분기 실적 저조…전년 동기 대비 '급감' 우울](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50537147877_8d816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