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 중에서 노무현이 비교적 온전하게 추진해 달성한 정책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세종시 건설이다. 따라서 노무현의 성공과 실패를 논함에 있어 행정수도 이전을 빼놓을 수 없다. 오늘의 세종시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20년이 지난 지금, 그 과정을 돌이켜 따져보자.
서울을 옮기려는 첫 구상은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가 접었던 것이다. 이를 노무현이 되살린 셈인데, 그는 어떻게 그럴 엄두를 냈던 것일까. 박정희 시대의 천도(遷都, 수도 이전) 구상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안보 때문이었다면, 노무현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가 명분이었다. 공식 기록도 그렇고, 명분을 따져봐도 그럴듯한 분석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과 내막은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노무현으로서는 한번 질러 본 선거용 카드에 불과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케이스다. 그러고 보면 역사라는 것이 꼭 ‘필연’의 연속은 아닌 모양이다. 요컨대 수도 이전 정책은 애당초 선거용이었음에도 거창한 국정 과제로 포장돼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제1막
2003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 말이다. 세종시의 출생 비밀을 스스로 폭로한 것. 격의 없는 노무현식 화법이 낳은 실언이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들먹이며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부르짖었던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게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당초 천도 아이디어에 불을 댕겼던 것은 누구였나. 언론인 출신으로 선거캠프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던 이병완(후일 대통령비서실장)이 장본인이다.

2002년 9월 말, 당시 노무현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12% 선을 맴돌았다. 1등 이회창, 2등 정몽준에 이어 3등이었다.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을 하루 앞두고 임채정(후에 인수위원장 거쳐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 확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초안은 이병완이 서둘러 만들었는데, 7개 항목 중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세 번째에 올라가 있었다.
임채정: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뺍시다. 지지율 12%짜리 후보가 수도 이전을 거론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찬: “차라리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옮기는 걸 (공약에) 넣읍시다.”
결론 없이 공식 회의를 끝내고 임채정과 이병완이 후보와 따로 만났다. 후보는 잠자코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임채정: “(수도 이전은) 박정희도 못 했어요. 엉망이 될 거요. 뺍시다.”
이병완: “넣어야 합니다. 후보가 대전에서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지에는 1면에 안 나오겠지만, 지방 신문에는 분명히 톱으로 대서특필할 겁니다.”
![[기자가만난세상] ‘호랑이’에서 내려오지 않는 자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1/06/07/2021060751684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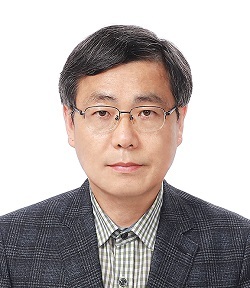


![[전북만평-정윤성] 尹"연설때 박수 한번 안 쳐주더라..."..계엄선포 이유](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11/.cache/512/2025021158029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