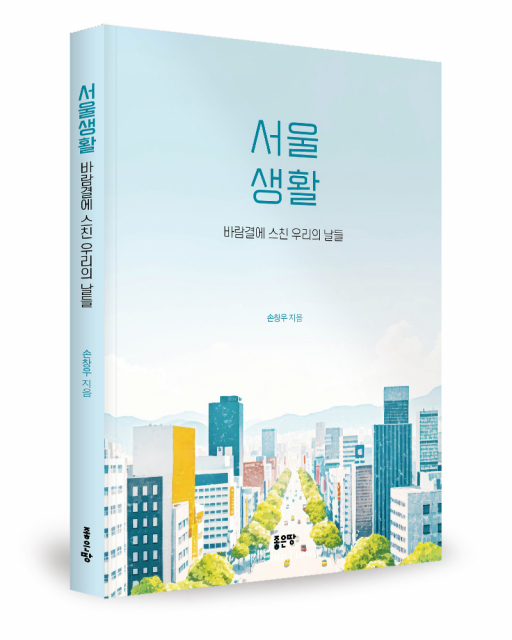어렸을 적,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 큰 길가에 있던 커다란 2층짜리 A책방이 내 삶의 첫 동네 책방이었다. 책방은 ‘문제지 파는 책방’, ‘문제지 말고도 파는 책방’ 정도로 인식했는데 A책방은 후자였다. 당시 집 근처에는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이 없었다. 부모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와 동생을 데리고 A책방에 가서 마음에 든 ‘한 권’을 고르게 했다. A책장은 부모님의 서가 대신 내가 접할 수 있었던 바깥 세계의 첫 서가였다. 초등학생 시절 어슐러 K. 르 귄과 오에 겐자부로, 한비야를 만난 곳도 A책방이었다. 뭣도 모르면서 왠지 표지가 멋지게 생겼다는 이유로, 제목이 신기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읽을 책을 차곡차곡 사 모았다.
이번에 동네 책방들을 취재하면서 ‘장소’와 ‘물성’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하게 됐다. 공개된 서가에 꽂힌 책들은 훔쳐볼 수 있다. 마치 빵집서 풍기는 고소한 빵 냄새를 마음껏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책을 공짜로 들고 갈 수는 없지만, 책들이 꽂힌 서가를 쳐다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책과 마주할 수 있다. 장소가 존재하고 거기에 책과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좁은 세계’에 갇혀 있던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조우하게 한다. 이런 종류의 조우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마주하기 힘든 것이다.
나는 도서관을 사랑하지만, 동네 책방은 오늘날 도서관이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 동네 책방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 없는 수많은 공간엔 책방지기의 개성과 동네 주민들의 안목이 녹아든 서가가 존재한다. 그곳에서라면 비독자라도 누구나 책을 쉽게 추천받을 수 있다. 자신이 평소 읽지 않는 종류의 책방이라고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 없다. 책은 원래 또 다른 세계를 내 삶으로 불러오는 매개니까. 내가 평소 읽지 않는 종류의 책들로 서가를 채운 동네 책방에 가게 되는 건 오히려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에 비해서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살 땐 훨씬 더 내가 평소에 읽지 않을 법한 엉뚱한 책을 집어 들곤 했다. 그렇게 산 책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각별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취재가 끝날 즈음 집어 든 신간의 제목은 <내가 사랑한 서점>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이 제목은 ‘내가 사랑했던 서점’이어야 했다. 책방 주인들이 직접 꼽은, 한때 나의 삶의 순간을 함께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했던 A책방도 문을 닫은 지 오래다. 하지만 이 책을 쓴 이들이 새로운 ‘책방 주인’들이라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그렇게 기억 속 만남과 장소들은 사라지고, 또다시 생겨난다. 책방이라는 장소에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간절히 끄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