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얘기가 잦다. AI 진흥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주류지만 일부에선 AI의 민주적 통제도 거론된다.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난 대선의 ‘AI 아바타’와 비교하면 지금의 공론장은 훨씬 성숙해졌다. 아쉬운 건 AI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기술 분야의 분절된 논의에만 그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보편적 사용은 필연적으로 일자리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러니 자연스레 교육 영역도 AI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교육 부분의 AI 영향은 단순히 교과서를 AI로 대체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존의 강의기반학습(lecture based learning)은 죽은 지식을 머릿속에 계층적으로 쌓는 데 특화되어 있었지만, AI 시대에는 단순 암기력 자체의 효용이 현저히 줄었다. 암기보단 활용이 중요한 시대에 실제로 학생들이 익혀야 하는 건 사용 가능한 지식(usable knowledge)이다. 정형화된 시험 상황이 아닌 실제 문제 속에서 개념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적 교육 방법론이 바로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걸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정비로 설명한다. 단편적 지식으로 학습이 종결된다. 그런데 이를 “과거 한양 천도에서 조선이 추구한 왕권 강화 시도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시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이는 사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기득권이 응집된 옛 수도를 버리고 새 통치 이념을 공유할 세력을 신도시에 모으려는 빈 살만의 구상은 태조나 정도전의 고민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 지식의 유기적 활용에 중점을 둔 PBL 수업에서는 죽은 정도전이 살아있는 빈 살만을 만난다. AI 시대에도 통하는 인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만 들으면 몽상적인 대안교육 같지만 실제 성과는 꽤 뚜렷하다.
미국의 대표적 교육 연구기관인 미국 교육연구소(AIR)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자. 미국의 고등학생 2만명 중 PBL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22%로, 전통적 학습법을 택한 학교보다 4%포인트 더 높았다. 소위 명문대로 초점을 좁혀도 PBL 중심 고등학교들이 명문대 진학률이 2%포인트 높다. 구름 위 이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는 학습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도 PBL이 들어올 기반은 마련됐다. 그렇지만 강의 기반 학습의 타성에 젖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새로운 교육관을 내세워야 할 정치권에선 ‘서울대 늘리기’ 같은 해묵은 공약만 되풀이된다. 어쩌면 우리 교육도 ‘천도’가 필요한 걸까.
박한슬 약사·작가
![[기고] 연세대, 양자 컴퓨팅 상용화 박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3ee07fac-e2b0-49d3-8343-9c6868a2c4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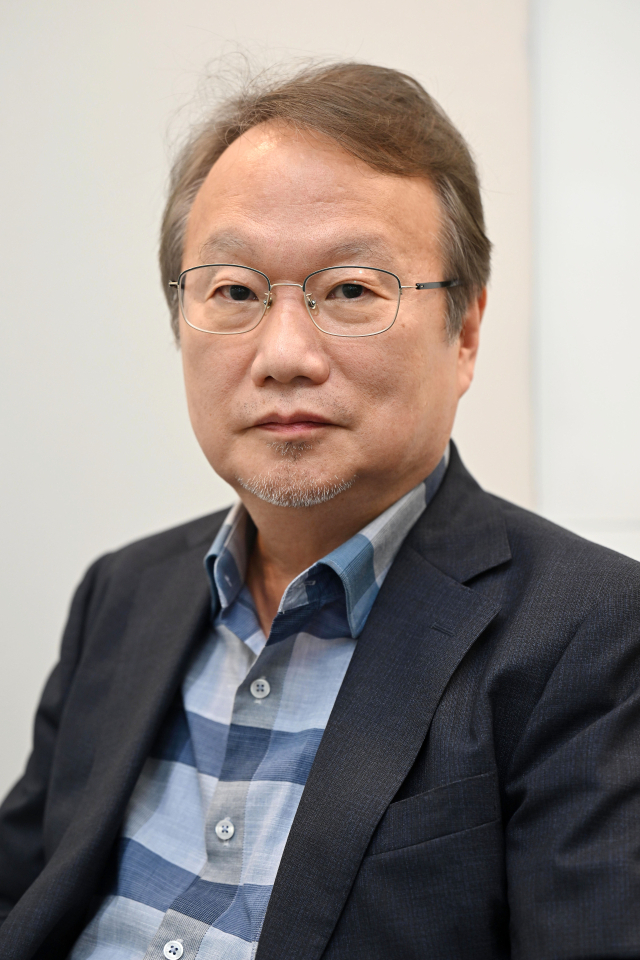

![[ET단상]기술 패권 시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4/news-p.v1.20250514.dcd86371b252488d82ca42e64a4aa7d1_P3.png)
![[우리말 바루기] 지향해야 할까, 지양해야 할까](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비즈 칼럼] 21세기 보안 전쟁, 이론과 경험 갖춘 인재 키워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097f7dd0-d377-4491-9a5e-dedde799fd72.jpg)